등록 : 2011.12.18 19:50
수정 : 2011.12.18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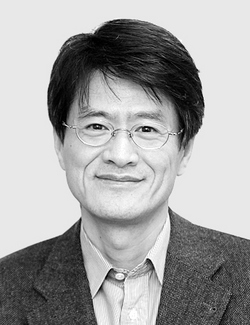 |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
아파트에서 몸 던진
14살 소년에게…
네 유서는 너무
아프고 원통하구나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원망했니. 얼마나 무서웠니. 꽃 같은 열네 살, 중학교 2학년 어린 소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짙은 먹구름이 몰려왔건만, 우리는 네게 드리운 그 어두운 그늘을 거둬 낼 엄두조차 못 냈구나. 도와 달라 힘겹게 내미는 네 손을 누구도 마주 잡아 주질 못했구나. 누구 하나 살갑게 어루만져 주지도, 나누지도 못했구나. 연약한 네 어깨를 떠밀며 이겨내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그저 다그치기만 했구나. 그래서 청청한 겨울하늘을 향해 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갔구나. 아파트 20층에서 몸을 던진 열네 살 소년.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제 무덤에 아이팟과 곰 인형을 함께 묻어 주세요. 마지막 부탁이에요.”(<경향신문> 12월15일치 1면 ‘10대가 아프다’ 중에서) 네 유서는 너무 아프고 원통하구나. 시험도 없고, 입시도 없고, 경쟁도 없고, 더 이상 줄세우기도 없는 세상을 향한 소박한 꿈을 품고 너는 그렇게 스러졌구나. 사람의 가치가 고작 고깃간의 근수 따지듯 성적으로 재단되고 마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향해 너는 “악!” 하는 외마디 비명조차 제대로 질러보지도 못한 채 황망히 떠났구나. 가는 길 외로울까 겨우 아이팟 하나를 동무 삼아 홀연히 떠났구나. 뜨는 해와 부는 바람에도 까닭 없이 가슴 설레고 터져 나오는 함빡 웃음을 주체할 수 없는 나이. 그 푸르른 생명의 눈부신 나이에 가진 것이라곤 단지 생명밖에 없어서, 그 마지막 생명마저 던져 너는 온몸으로 우리 어른들을 무참하게 고발하는구나. 죽음의 세상을 향해,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광폭한 세상을 속속들이 발가벗기는구나. 꽃 같은 네 생명을 번제물로 바쳤구나. 정작 너를 버린 건 세상이건만, 사람들은 네가 세상을 버렸다고 하는구나.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삼당오락, 오늘 자는 만큼 미래는 멀어진다”, “남을 제치지 못하면 네가 제쳐진다”, “한 번 처지면 영원히 낙오자가 된다” 그 숱한 욕망과 공포의 말들, 필경은 열패자로 전락한 우리 어른들의 넋두리였을 것이야. 그런데 채찍과도 같은 그 아픈 언어들이 나를 뚫고 애꿎은 너에게 온전히 투사되었구나. 어른들의 욕망과 공포가 만들어 놓은 죽음의 그물에 날갯짓조차도 힘겨운 열넷 나이의 네가 갇히고 말았구나. 아수라를 방불케 하는 구조를 깨부술 용기가 없어 어른들은 얍삽하게 눈치보고, 비굴하게 타협하고, 노예처럼 순응하느라 전전긍긍하면서 정작 네 고통스런 신음소리에는 무심했구나. 그토록 사무치게 아우성을 쳤는데도 귀를 틀어막고 듣질 않았구나. 단 1%를 위해, 그 나머지 모두가 잉여와 열등으로 분류되어야만 하는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로잡지 못한 탓에 가여운 너를 떠나보내야만 했구나. 대가리부터 꼬리까지 행세 좀 합네 하는 놈들이 온갖 파렴치한 패악질을 일삼아도 나 몰라라, 나만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탐욕의 질서를 어린 너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구나. 네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았구나. 언젠가 네 또래의 친구가 그랬었지. 바리깡에 짤려 나간 것은 머리털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다고. 죽고 싶었다고. 우리가 개, 돼지냐고. 그래, 어른들은 모른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수치심과 모욕감 속에 사는 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비루한 삶을 구걸하며 하루하루 죽어갈 때 너는 거꾸로 천둥같이 죽음으로 살림을 외치는구나.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죽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악착같이 살아서 함께 싸워 바꾸자.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에 1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한 해 평균 200명 남짓한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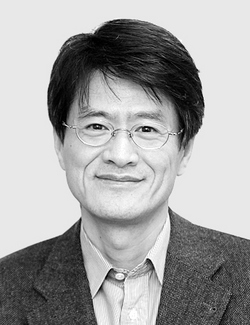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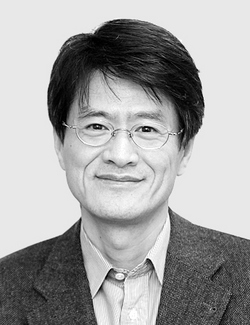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