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06.25 19:09
수정 : 2010.06.25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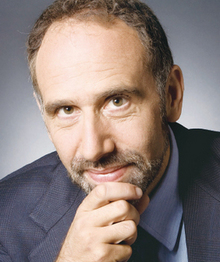 |
|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
세계 각국 정부들이 작심하고 재정적자 감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정부가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금융시장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시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 있는 정부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강박관념이 너무 크다. 현 상황에서 재정적자 감축 효과는 경제 현실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대규모 적자예산에 대한 경제학적 주장은 정부가 더 생산적인 경제영역에서 자원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공적 영역에서 돈을 꿔옴으로써 발생한다는 논리이다. 그 맥락에서 보면 재정적자는 고금리로 이어진다. 재정적자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부채에서 비롯한다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이다.
둘 가운데 어느 쪽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타당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전세계 대다수 정부들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민간부문의 수요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들은 민간수요의 급락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극책을 올바르게 밟아가고 있다. 총대출규모는 여전히 정상치보다도 낮다. 공공부문 대출은 아직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단지 구멍을 메우고 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곳에서 현재와 예측가능한 미래의 최대 문제는 물가상승이 아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나 물가하락의 위험이다. 세계경제 전체를 보면 현재는 엄청난 과잉설비 상태다.
이런 점을 보면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 상태에 이를 것이란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주택부문에서만 자산가치가 무려 6조달러 가까이 증발했다. 주식부문에서는 자산손실 규모가 그보다도 더 크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이와 비슷한 자산손실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2조~3조달러의 유동성을 창출한다고 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간략히 말해, 대규모 재정적자가 단기 내지 중기적으로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 정부들은 적극적으로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의제를 좇고 있다.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하다는 게 나름의 근거다. 재정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사례가 모두에게 경고로 예시됐다.
금융시장은 그리스 재정적자 급증에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제 재정적자라는 괴물은 다른 나라들도 협박하고 있다. 당장 재정적자 감축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리스와 비슷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그리스는 실제로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스는 자국의 부채 및 재정적자 규모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까지 동원했다. 그리스는 세금 징수에서도 문제가 있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리스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런 요인들이 그리스를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사례에서조차도, 이 나라를 금융시장의 처분에 내맡기도록 한 결정은 정치적이었다. 경제적 펀더멘털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은 하려고만 한다면 그리스의 부채를 지원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스 경제가 유럽연합 전체에 견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리스 부채 지원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 불량한 나라들이 이웃 나라들에 무임승차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엄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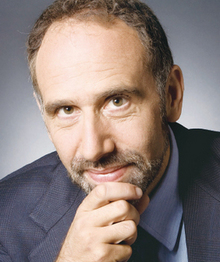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