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10.20 19:19
수정 : 2013.10.20 1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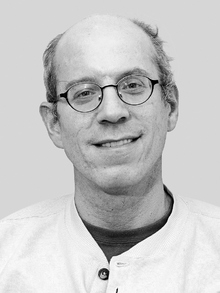 |
|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
햇볕정책의 전제는 남북한 간의 점진적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리라는 것이었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전, 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타결했던 합의에 열광하지 않았다. 그들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고, 햇볕정책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고 믿었다. 햇볕정책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함께 묻혔다. 그러나 북한은 생존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끈질긴 기대도 특히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기대의 최신판은 브루스 베넷이 쓴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이라는 제목의 랜드연구소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한·미 정부가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 붕괴될지에 대한 예측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몇가지 매우 대담한 권고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미가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불안정의 첫 신호가 있을 때 지상군을 투입하고, 대량파괴무기를 확보하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주민들이) 국경선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고, 군사적 저항을 진압한다는 것이다.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이 군대를 보낼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이상한 것은 이 보고서가 북한 내 변화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다루지 않은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정치적 위기 때 군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북한 군부는 이 나라에서 최대 세력인 만큼, 이 부분을 생략한 것은 이상하다. 아마도 이것이 곤란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 군부가 이집트처럼 스스로 권력 장악을 선언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면, 한·미는 군사 개입을 해야 할 것인가? 군부가 어떻게 행동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 혹은 시리아에서처럼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조차 외부에서 군대를 투입하는 것은 갈등 완화를 위한 좋은 처방으로 들리지 않는다. 또한 군사력과 조기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상하다. 미국 군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안정적 질서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리비아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한·미 군대만 행동하는 게 아닐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관심을 돌리고자 남한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거나, 북한 군부 일부가 현 체제 유지를 위해 싸우거나, 중국 군대와 마주치게 되는 시나리오도 평가한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내전에 빠져들거나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잠재력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확대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정책결정자들과 정보당국에 북한 내 불안정 신호를 찾을 것을 권고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 신호를 부추길 것을 권고한다. 브루스 베넷은 “붕괴가 미래 어떤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비한 행동들은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인 함의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붕괴와 개입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시사함으로써 스스로를 한반도의 점진적 관계 개선(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결과”)을 이끄는 포용정책의 대척점에 위치시킨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외교적 방향 가운데 가장 멀리 나간 것은 붕괴의 경우에 책임 분담 협의를 위해 한·미가 중국과 마주 앉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제안한 점이다.
우리는 21세기를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전망과 함께 시작했다. 지금 워싱턴의 많은 한국 전문가들은 두 손을 들어버리고,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오래된 예상에 기대고 있다. 랜드연구소 보고서는 미군이 남한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국의 지원과 함께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덧붙이고 있다.
분명히, 한·미는 비상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북한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중국과의 삼각 공조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패한 국가의 가능성에 대비하기보다는 외교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게 현명하다. 남북한 간의 정치·경제적 차이를 좁히고 핵 문제에서 북한과 미국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이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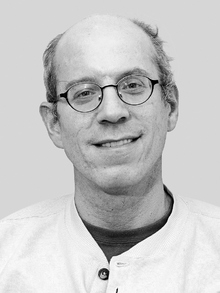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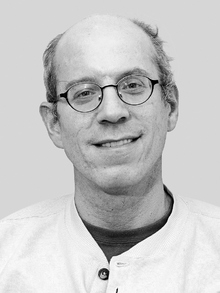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