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6.18 19:12
수정 : 2014.06.19 23:59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매거진 esc] 성석제의 사이(間) 이야기
빈대떡에 미동도 없다가
물냉면을 먹어보고는
“으응?” 눈을 부릅뜬 노신사
비밀메뉴를 알려주기로 했다
돼지코 수육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울에서만 내리 12대를 살아온 집안의 후손이 있다. 그는 예닐곱 개가 넘는 이런저런 모임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신처럼 친가와 외가, 처가가 모두 서울 사람인 진짜배기 서울 토박이들끼리의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 모임의 장소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개성과 특색이 있는 집이기 때문이다. 대개는 음식점인데 모임 전에 회원 중 어느 사람이 해당 음식점을 추천하고 간사 두세 명이 미리 가봐서 개성과 특별함을 인정했을 경우에 모든 회원들이 거기서 만나게 된다. 그 음식점에는 개성과 특징 말고도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 숨겨진 식단이 있다. 그 모임에는 자신들이 가본 어떤 음식점에 대해 (좋든 말든) 회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발설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결의가 있는 모양이다. 그게 그들의 모임을 더욱 가치있고 훌륭한 것으로 만든다는 믿음도.
나는 그들이 이따금 가는 식당을 몇 군데 알고 있다. 그들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식안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리기 위해 예를 들어보고 싶다. 하지만 그들의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어느 식당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눈이 밝은 이들이라면 쉽게 찾아내리라 믿는다.
그 식당은 서울의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 20세기 이후 크게 모습이 바뀌지 않은 오래된 동네에 있다. 그 식당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든 주인은 몇 해 전 타계했다. 주인의 모습은 커다란 사진액자에 담겨 식당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걸려 있다. 특이한 것은 그 사진의 주인공의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가 월남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또 기골이 장대하며 신경줄이 굵은 대륙적인 풍모를 보고 혹시 6·25나 월남전에서 전공이라도 세워서 훈장을 받은 건 아닐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훈장은 무공훈장이 아닌 국민훈장이다. 평범한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들을 위해 뭔가를 했고 그것이 사표가 될 만해서 받은 훈장이라는 뜻이다.
훈장을 받은 사람인 만큼 식당 주인에게는 합당한 전설이 있다. 월남을 한 그가 처음 허름한 대로 음식점을 열었을 무렵, 그 지역을 주름잡던 사람은 일제 때부터 명성을 날렸던 ‘장군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장군의 아들은 일대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보호해준다면서 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식당 주인은 ‘나는 맨주먹 붉은 피로도 내 한 몸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 보호가 필요 없고 따라서 보호비 나부랭이는 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어떤 곡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군의 아들은 예외적으로 그에게만 보호비를 면제해 주었다고 한다. 어차피 전설이니까 조금 더 덧붙여서 장군의 아들과 일대일로 붙어서 사흘 밤낮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그에 따라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 상납 따위는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식당 주인의 대범한 품성을 말해준다. 혹은 그 지역에 사는 호메로스나 셰익스피어 같은 이들의 기질, 풍토를 말해준다고나 할까.
월남한 사람이 운영하던 식당답게 그곳의 메뉴는 냉면이 유명하다. 가격도 요즘 좀 한다 하는 냉면의 가격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맛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내가 처음 그곳에 데려간 60살 남자의 경우, 내부가 좁아서 비닐 포장을 입구에 둘러치고 그 안에서 번철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 내온 빈대떡(녹두부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막걸리 잔을 비우면서도 식당과 전혀 상관없는 화제에 집중했다. 그러다가 밤 9시가 주문 마감이라는 물냉면을 먹어보고는 “으응?” 하고 눈을 부릅뜨더니 “이 집 냉면 정말 맛있네. 빈말이 아니라 요즘 먹어본 냉면 중에는 최고인걸” 했다. 내가 “어설픈 줄 알았는데 포장마차 비슷한 데치고는 잘한다고요?” 하며 떠보자 그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정말 괜찮아. 오랜만에 내가 자발적으로 계산을 할 마음이 들게 만드네” 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그 식당의 드러나지 않은 메뉴, 아는 사람만 알고 그래서 그곳에 가게 만드는 식단을 알려주기로 했다. 그건 돼지 코 수육이었다.
멧돼지과에 속하는 돼지는 조상 때부터 후각이 포유류 중에서도 남달리 발달했다. 이를테면 돼지의 후각수용체 유전자 수는 1300여개로 1100개 정도인 개보다 많고 직립보행 이후 후각이 급속도로 퇴화 중인 인간의 400여개를 세 배 이상 압도한다. 개보다 돼지가 더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프랑스 농부들은 돼지를 훈련시켜 야생 송로버섯을 찾고 있다.
후각은 냄새를 통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인지해서 자연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 결정적으로는 유전자를 가진 생명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 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인간의 연애 감정, 돼지의 짝짓기에 후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전설에 의하면 돼지는 후각으로 짝을 찾고 심지어 서로 코를 비벼대고 냄새를 맡는 것만 가지고도 짝짓기에 버금가는 쾌감을 맛볼 수가 있다고도 한다. 아쉽게도 돼지에게 코는 하나뿐이고 그 코에서 나오는 고기의 양도 매우 적다.
내가 처음 돼지 코 수육, 정확하게는 ‘돼지 코 수육 슬라이스’라는 음식에 대해 들었을 때는 ‘콜럼버스의 달걀프라이 서니사이드업’처럼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처음 돼지 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토박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생전의 식당 주인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서울내기에게 들은 이야기다.
“돼지 코가 연골이 있고 콜라겐이 많아서 말랑말랑 부드럽지만 돼지가 코를 워낙 여러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 어떤 부분은 근육이 발달해서 살짝 질기거든. 이걸 썰 때 힘만으로는 절대 안 돼.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 숙달된 기술에 잘 드는 칼로 맛이 나고 먹기 좋은 두께로 얇게 썰어야 한단 말이야. 지금 조선에서 돼지 코를 제일 잘 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신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두번째로 잘 써는 사람은 식당 주인장 아들이고. 저기 서 있구먼그래.”
가리키는 대로 바라보니 기골이 장대하고 검은 테 안경을 쓴 남자가 오래된 공원 담벼락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대를 물려 식당을 운영할 사람이라기보다는 순박하고 수줍은 총각 장사처럼 보였다. 그는 진중하면서도 부지런해서 손님들의 주문이며 단골들의 인사에 일일이 응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 천지에서 돼지 코 썰기 일인자 말이, 이인자는 자기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걱정을 하더라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지. 지금은 저 사람이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받아서 대한민국 일인자가 됐지만.”
조선과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에는 세대와 시대의 감각이 녹아들어 있다. 식단과 메뉴, 얇게 썬다는 것과 슬라이스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세월은 흐르고 전설은 남는다. 여러 가지 전설을 품고 있는 식당 또한 마찬가지다.
작고한 식당 주인이 국민훈장을 받은 이유는 탑골공원에 자주 출입하는 수십년 단골손님이며 나이 든 이들의 가벼운 주머니를 생각해 국밥을 원가 이하의 가격이 되더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팔아왔기 때문이다. 이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성석제 소설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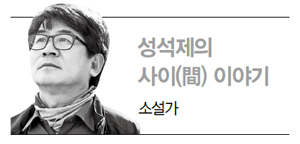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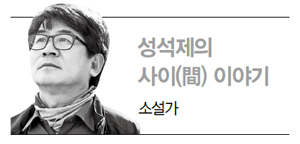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