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esc] 성석제의 사이(間) 이야기
메뉴에는 안나오는 별미 2탄-메인메뉴보다 맛있는 홍어집과 고깃집의 김치찌개들
식당 식구들이 먹으려던
김치찌개 냄비에 쏟은 막걸리
버리려다 다시 끓이니
그 맛이 대단히 강력했다
서울에는 어느 고을, 어느 지방 출신들끼리 만나는 향우회가 많다. 서울 토박이들끼리 서울에서 만든 모임 역시 향우회라 할 수 있다. 향우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게 다른 지방 출신자 향우회와 다르긴 하다. 또 지방 향우회가 고향 음식을 잘하는 음식점이나 고향과 상관있는 명칭을 가진 음식점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내기 향우회는 그런 걸 별반 가리지 않는다. 어떤 지방 음식이든 제대로, 잘하는 음식점을 찾는다.
그들이 이따금 가는 곳 가운데 하나는 서울의 한복판 종묘 근처에 있는, 홍어를 취급하는 식당이다. 홍어처럼 전문성이 높고 취향이 갈리는 음식도 드물다. 홍어는 찜, 탕, 회무침, 삼합과 홍탁의 형태로 조리되어 나오는데 대체로 독특한 냄새와 자극이 있다. 아무리 개방적인 서울내기 손님이라도 모두가 홍어를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식당의 주인 또한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어서 홍어를 재료로 한 주요리 외에 서울 사람들도 즐겨 먹는 보편성 높은 부요리도 내놓는다. 그건 낙지볶음과 굴비다.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굴비 하면 ‘영광 법성포 굴비’인데 식당 주인아주머니(처음 갔을 때는 아주머니로 보였는데 지금은 할머니로 칭한다) 말씀에 따르면 그 집에서 나오는 굴비는 강원도 치악산 산중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만든다.
“조기를 말릴 적에는 온몸에 소금기가 골고루 배어야 돼야. 조기에 덮어놓고 소금을 뿌려대도 소금이 잘 붙지 않고 처발라도 못 써. 조기 한 마리 한 마리의 입을 벌리고 그 안에다가 소복하게끔 간수를 뺀 천일염을 집어넣어. 그다음에 조기를 새끼에다 꿰가지고 입이 하늘로 향하게끔 해서 말려. 겨울에 비와 눈이 내리면 조기의 벌린 입으로 들어가서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소금을 녹여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소금물이 조기 몸통 전체에 짭조름하니 잘 배게 되는 것이오.”
내가 그 식당에 처음 갔을 때 주인아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천일염의 명산지 전남 신안의 사투리로 풀어놓는 차지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음식 맛을 돋우는 건 분명했다.
그곳에서 내주는 막걸리 역시 치악산의 농장에서 직접 담그는 것이라 했는데 여느 막걸리에 비해 진한 느낌이 났다. 누룩은 고향의 시누이가 직접 발로 디뎌 가지고 만들어 보내오는 것을 쓴다고 했다. 삼합에 들어가는 묵은 김치 또한 직접 담그는 것은 물론이었다. 식당에 나오는 채소 또한 직접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했다. 반찬으로 나오는 간장게장, 된장, 젓갈, 두부, 콩나물 등을 가지고 백반을 만든다 해도 웬만한 식당의 주 식단으로 부족할 게 없을 듯했다.
홍어는 국내산이 칠레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씹을 때 차진 맛도 큰 차이가 나지만 무차별적으로 홍어를 대량 어획하는 기업형 방식과 어부가 힘겹게 몇 마리씩 잡는 방식에서 오는 가격 차이일 것이다.
이 음식점의 메뉴판에 없는 식단은 김치찌개다. 직장인의 점심 식사로 가장 인기가 있고 외국의 한국 음식점에서 선호도 3위 이내에 늘 들어가는 바로 그것. 그 식당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주문하면 나오는 김치찌개에는 특이하게도 막걸리를 넣는다고 했다. 자신들이 먹으려던 김치찌개 냄비에 실수로 ‘애기’(며느리인지 아들인지는 모르지만)가 막걸리를 쏟아서 버리려다가 다시 끓여서 먹어보니 잡맛이 없고 맛이 ‘괜찬해’ 개발했다는 것이었다. 실상 먹어보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강력했다.
양념이 진한 전라도식 김치는 그냥 먹기에는 짠 느낌이지만 찌개로 희석하면 짠맛이 완화되고 농축되었던 양념이 뜨거운 물에 풀리면서 맛이 살아난다. 김치 자체가 워낙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맛있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서울 향우회’ 사람들이 모이면 주요리인 홍어는 놔두고 부요리인 굴비와 낚지볶음, 막걸리를 주문해서 먹고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는 막걸리 안주로도 그만이어서 추가 주문을 할 때 홍어에 비해 절대적으로 싼 김치찌개만 시켰다는 것이다. 서울 깍쟁이들이 저렴한 식단을 상 위에 그득하게 늘어놓고 저녁 내내 넓지 않은 이층 자리를 온통 차지하고 있는 풍경이 눈에 선했다.
숨겨진 식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외의 식단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중독성 강한 김치찌개가 멀지 않은 식당에 또 있었다. 이 역시 서울 토박이들이 개발한 장소이며 내가 그 모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맨 처음 찾아갔던 음식점이기도 하다. 그 식당은 조선시대에 ‘향굣말’이라고 불렸던 동네에 있다. 그 동네에는 종로의 옛 이름인 운종가(雲從街: 사람이 구름처럼 많이 모여들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에서 장사를 하던 부상들이며 가게에 물건을 대주는 장인들, 그리고 하급 관리와 중인들이 살던 동네 느낌이 나는 골목이 남아 있었다. 낮은 처마와 들창, 바람벽으로 이루어진 좁고 긴 골목이 실타래처럼 이어져 있는 것이 경이로웠다. 머리끝을 쭈뼛거리게 하는 기시감이 들었다. 전생의 내가 거기에 살았던 느낌이라고나 할까.
거기에는 모텔이나 호텔보다 훨씬 많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었고 젊은 외국 여행자들이 기억할 만한 서울의 여행지로 선택한 듯 환전업소가 여러 곳 있는 게 특이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멋진 골목을 우주를 유영하듯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섬뜩하고 익숙한 단어가 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 ‘마포’라는, 종로에서 뺨을 맞고 화를 내러 찾아가기에는 꽤나 떨어진 동네의 이름을 딴 육고기 전문 음식점이 있었다. 이층에 있으므로 삐걱대는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 연탄화덕을 하나씩 가슴에 품은 둥근 탁자가 있고 손님들은 화덕 위에 얹힌 고기 굽는 판에 갈비나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다.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동그란 간이의자였다. 오래 눌러앉아 있지 말고 빨리빨리 먹고 나가라는 의사를 그렇게 표현했지 싶었다. 주인이 서울 사람인 게 분명했다.
낮시간인데도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10여명 탁자에 둘러앉아 소주와 막걸리를 곁들여 고기를 구워 먹고 계셨다. 그 또한 그 동네 그 골목처럼 감동적이었다. 낮이나 밤이나 원한다면 언제나 도취할 수 있는 이 백성에게 축복이 있을진저! 그런데 그분들이 술과 고기를 먹고 난 뒤 마무리로 꼭 주문하는 음식이 있었다. 난데없는 김치찌개였다.
고깃집이므로 돼지고기를 냄비 바닥에 쫙 깔고, 잘 익고 튼실한 배추김치를 아낌없이 넣고 두부와 대파를 숭숭 썰어넣고 불기가 남아 있는 연탄에 부글부글, 자글자글 끓여서 뜨거운 밥과 함께 먹는 것이었다. 푸짐하다는 게 다른 곳과 달랐다. 고기에서 우러난 기름이 기분 좋게 흘러다니고 있는 것도 좋았다. 배가 부른데도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다. 맛있으니까.
탄수화물이니 칼로리니 농구공처럼 튀어나오는 배에 관한 생각 따위는 발로 차버려도 좋았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자잘하게 살았다고. 호쾌한 건배를 끝으로 이차로 향했다. 서울내기가 다 된 기분이었다.
성석제 소설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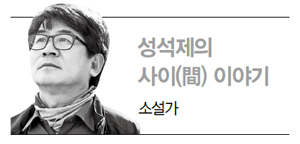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