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매거진 esc] 성석제의 사이(間) 이야기
캐나다 토론토에서 본 NBA 농구 경기의 기억과 자본주의적 오락에 대한 단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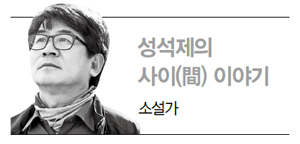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
온몸이 안마라도 받은 듯 개운했다
5달러짜리 랩터스 티셔츠를 샀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서
오락을 제공하고
돈을 울궈내는 방식이구나
싶으면서도 어쩐지 돈값 한다 싶었다 그러고 나서 입장권 부족과 무질서로 한 장에 몇백만원 한다는 체육관 유리문이 깨졌고 관중은 난입했고 경기는 졌다. 내가 일생 동안 농구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않게 된 이유를 그날의 그 경기가 충분히 제공했다. 어쨌든 나는 그날 27년 만에, 캐나다하고도 토론토의 프로농구팀인 토론토 랩터스 전용구장에, 농구 경기를 보러 갔다. 50달러쯤 되는 좌석표를 샀음에도 내 자리는 경기가 벌어지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이었다. 선수들이 개미만 하게 보여서 전광판으로 경기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바에야 집에서 맥주나 마시며 편하게 앉아 보는 게 백번은 나으리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했다. 그 바람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경기장 매점에서 파는 생맥주를 사러 가야 했는데 생맥주 사는 줄은 백미터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길었고 값은 또 예상의 두 배는 되게 비쌌다. 종이 잔이어서 시간이 경과하며 잔이 곧 물러터질 듯 물렁물렁해지는 바람에 맥주 맛이고 뭐고 느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삼켜야 했다. 어쨌든 귀를 찢을 듯 시끄러운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로 난생처음 듣는 이름의 선수들이 등장하고 나서 경기는 시작되었다. 엘에이(LA) 레이커스, 마이애미 히트, 뉴욕 닉스 등 미국 주요 도시의 강팀을 포함한 엔비에이(NBA)리그에 끼어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토론토 랩터스의 상대는 당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디트로이트 피스턴스였다. 랩터(맹금류)라는 어정쩡한 이름에 비해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의 ‘피스톤’은 이름부터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강인한 느낌을 줬다. 특히 피스턴스의 두 흑인 공격수는 자동차 공장의 로봇 같은 득점기계였다. 랩터스의 센터 겸 득점원은 리투아니아인지 크로아티아인지에서 온 용병이었고 키는 컸지만 느렸고 쉽게 지쳤으며 득점력이 부족했다. 그런데 피스턴스에서 몇 번의 공격 기회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덩치가 산만 한 랩터스 용병이 삼점 슛을 연속 성공시키면서 초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이상하다는 건 평소의 랩터스답지 않게, 속어로 ‘개 발에 땀이 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5분쯤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 스코어가 12 대 0이었다. 저러다가 디트로이트 피스턴스가 세계 최초로 농구 시합에서 영패를 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디트로이트로 돌아갔을 때 성난 시민들이 몰려나와서 버스를 둘러싸고 팀을 해체하라고 요구하며 피스톤과 배터리 같은 자동차 부품을 집어던지는 광경이 떠올랐다. ‘아, 수리인지 말똥가리인지 황조롱이인지 솔개인지 매인지 모를 토론토의 새들아, 좀 살살 좀 하지 그러냐. 저 아이들이 힘들게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안 열어줘서 얼어 죽지 않도록.’ 나의 상상과는 상관없이 장내의 분위기는 용광로처럼 달아올랐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이 일어서는 바람에 전광판을 보려면 나 또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선수들이 득점을 하거나 묘기를 선보일 때 아나운서가 외쳐대는 대로 “랩터스!” 혹은 선수 이름을 따라 하면서 손을 쳐들거나 몸을 흔들어대는 바람에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 거의 모든 관중이 마찬가지였다. 휴식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경기장에 응원단이 뛰어나왔고 음악과 춤으로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생맥주 때문에 화장실에 갔다 와야 했고 오가면서 경기장에 바짝 붙은 특석을 볼 수 있었다. 일년 동안 지정석에서 보는 비싼 표를 구입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자리가 절반 넘게 비어 있었고 표정 또한 그리 흥분된 것 같지 않았다. 다시 시합이 재개되었다. 사람들의 광란과 고함으로 골이 들어간 것을 알았고 탄식으로 피스턴스가 고향에 돌아가 맞아 죽는 일을 간신히 모면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경기장과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관중들의 응원은 더 거세지는 듯했다. 한 번도 앉지 못한 채 다시 휴식시간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어린이 관중이 나와서 깜찍한 춤을 추고 슛을 성공시키고 선물을 받아갔다. 관중에게 한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율동과 노래를 따라 하느라 온몸에서 땀이 났다. 마침내 경기가 끝났을 때 내 목에서는 쉰 소리가 났다. 온몸이 제대로 된 안마라도 받은 듯 개운했다. 5달러짜리 랩터스 티셔츠를 하나 샀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사람들에게서 오락을 제공하고 돈을 울궈내는 방식이구나 싶으면서도 어쩐지 돈값 한다 싶었다. 부족간의 전쟁을 연상시키고 삶에 보탬이 안 되는 소비를 부추기며 드라마를 주고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싶으면서도 재미있었다. 그 뒤로 어떤 나라에 갈 때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성행하는 프로 스포츠 시합을 눈여겨본다. 저녁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해설을 한 시간 이상씩 텔레비전으로 본다. 가령 미국의 미식축구, 영국의 크리켓과 럭비, 프랑스의 자전거 경기 같은 것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경기 규칙이나 선수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 그래도 상관없다. 그냥 본다. 그게 뭔지 알 만하게 되었을 무렵, 여행은 끝이 난다. 그 또한 여행이다. 그렇게 사는 거도 있는 거다. 성석제 소설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