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매거진 esc] 성석제의 사이(間) 이야기
맑은 도시 청주에서 찾아간 카페, 그 카페에서 들은 작가 사칭 술값 사기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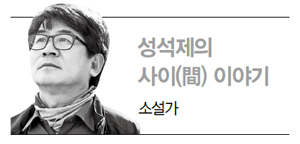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
여주인이 물었다. “이분이 맞죠?”
“다른 사람 사진을 왜 쓰겠습니까”
“이분이 가게에서 양주 세병 마시고
외상하고 가서는 안 나타나요.
그것도 비싼 싱글몰트 위스키로요” 강연은 그럭저럭 무사히 끝났다. 문학이란, 특히 소설이란 어차피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창작을 하려면 자기만의 발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책임을 문학도들에게 돌리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나를 강연에 초청한 K교수는 멀리까지 왔는데 강연료가 적어서 미안하다고, 대신 자신이 단골인 카페로 가서 한잔 살 테니까 청주의 아름다운 가을밤 정취를 만끽해 보자고 했다. 가족을 서울에 두고 혼자 청주에서 기거하는 대학교수의 생활이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석유램프와 황촉대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 장식에 카라바조 같은 화가의 그림 복제품이 걸려 있는 단골 카페라는 곳의 분위기도 괜찮았다. 술값도 상대적으로 싸고 마른안주는 무한공급되었으며 기품이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여주인은 상냥했다. 그녀가 교수도 아닌 나를 자꾸 ‘교수님, 교수님’ 하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긴 했으나 한 시간쯤 지나고 국산 위스키가 반병쯤 비자 바로 적응이 되었다. 갑자기 여주인이 내가 존경해 마지않는 작가 L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잘 아느냐고 물었다. “작품은 많이 읽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분은 아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위지만 데뷔는 십 년도 더 일찍 하신 분이고.” 그녀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다. 바로 L의 소설집이었다. 책날개에는 그의 약력과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이분이 맞죠?” “그렇겠죠. 그분 책에 다른 사람 이름하고 사진을 왜 쓰겠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소설가나 동명이인인 소설가가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적으로, 문학사적으로 소설가에는 쌍둥이나 동명이인이 없는데요. 시인 중에는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름은 같아도 생긴 것까지 비슷한 경우는 절대 없어요.” “이분이 우리 가게에 와서 양주 세 병 마시고 외상하고 가서는 안 나타나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싱글 몰트위스키만 드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분은 소설처럼 아주 성격이 맑고 깔끔하고 심지어 위생적이기까지 하십니다. 주변마저 맑고 깨끗하게 만드시니까. 저처럼 흐리멍덩하게 외상 같은 걸 하실 분이 절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신다면서요? 외상값이 백만원도 넘어요.” 듣고만 있던 K교수가 끼어들었다. “그럼 누가 그 양반 이름을 도용한 거군요. 지금 주인께서는 그 양반 흉내를 내는 사람하고 싱글 몰트위스키를 세 병이나 꾸준히 마셨다는 거네요? 나한테는 맥주 한 병 외상도 안 된다더니.” 그녀는 아름다운 입술을 깨물어가면서 힘주어 말했다. “이 사람이 백퍼센트 맞아요. 그 양주, 그 사람이 주문하는 바람에 수입양주 파는 데 가서 내 돈 주고 사왔다고요. 피해도 크지만 자존심 때문에라도 꼭 받아야겠어요. 좀 한가해지면 날 잡아서 찾아가려고요.” 나는 이름을 사칭당한 소설가들을 대변해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꼈다. “이분은 대단히 훌륭한 소설가지만 작품성에 비해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내가 사기꾼이라면 이분보다는 더 유명한 사람을 팔 거예요. 또 양주 몇 병이 아니라 가게 하나는 들어먹고 관두겠죠.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참으시죠.” 나중에 L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는 청주의 이러이러한 이름의 카페에 가서 싱글 몰트위스키를 마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청주에 가본 적이 없고 싱글 몰트위스키 또한 마신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그 카페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누가 나를 사칭해서 공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참 소설적이지 않으냐, 기분이 좋았을 거라고 말했다. 맑은 눈을 한 그는 내 이야기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다. 성석제 소설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