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매거진 esc] 성석제의 사이(間) 이야기
고향 저수지 같은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호수 여행…그 많은 까마귀는 왜 땅으로 추락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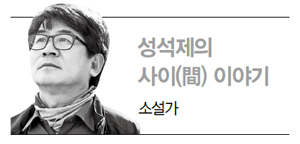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
세 걸음 이상 거리는 말을 탔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차를 가진
사람이 주변국보다 많아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왼손에 북치, 오른손에 발티카를 든 채 밖으로 나갔다. 보이느니 코발트빛 호수이고 새하얀 구름이었다. 때로 만년설 쌓인 톈산(천산)산맥이 이식쿨 호수에 비쳐 땅과 하늘이 데칼코마니를 이루는 장관도 공짜로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라면 이미 근처에 있는 땅을 대도시의 부자들이 다 사들여가지고 별장 짓고 빌라 지어서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고 있었을 텐데… 동행인 C선생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호숫가 긴 의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다. 그러던 중에 웬 금발의 백인 남자가 다가오더니 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대뜸 말을 붙였다. “두 분, 여행 중이신가 봐요.” “예, 그렇게 묻는 분은요?” 남자는 자신이 스웨덴에서 철학 관련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러 키르기스스탄에 왔으며 세미나가 끝나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 이식쿨 호수를 보러 온 길이라고 했다. “학술 세미나 하러 스웨덴에서 여기까지 오세요? 직항 항공편도 없을 텐데. 주최 측이 돈이 넘쳐나는 학회인가 보다. 아님 마지막 세미나든가.” 왜 남의 걱정이나 해주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상대는 내게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요새는 학술 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금방 돌아가야 해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못 먹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샤실리크라는 양꼬치와 볶음밥, 라그만 등의 전통국수, 말젖 요구르트, 북치, 사과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는 맥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권하지 않자 저녁 먹으러 간다면서 가버렸다. 다음날 아침 일찍, 촐폰아타를 출발해서 이식쿨 호수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길은 양방향으로 오가는 차가 충분히 교행할 정도로 넓었지만 포장이 거의 안 돼 있었다. 길 양옆에 인가는 거의 보이지 않고 드넓은 숲과 밭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의외로 다니는 차가 적지 않았다. “키르기스 사람들은 타고난 유목민이라서 세 걸음 이상 거리는 말을 타고 다니던 전통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구당 차량 보유 비율이 최고로 높아요.” 한국에서 유학한 적이 있다는 가이드가 설명했다. 키르기스 사람들의 말을 대신하게 된 차들은 차령이 보통 삼십년 이상은 되어야 제대로 된 차 대접을 받는 듯했다. 우리가 탄 승용차가 너무 빨리 가는 듯해서 좀 천천히 가자고 했더니 곧바로 승합차 한 대가 우리 차를 추월해 갔다. 그때 우리가 탄 차의 속도계는 시속 90㎞를 가리키고 있었다. “버스가 아무리 벤츠 마크를 달았기로서니 저래도 돼?” 내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버스가 우리 차를 또 추월했다. 뒤를 보니 70년대에 생산된 러시아산 구형 트럭이 우리를 곧 잡아먹기라도 할 듯 연기를 뿜으며 쫓아오고 있었다. “이 사람들 왜 이래? 오늘 자동차 경주 하는 날인가?” 우리가 탄 차의 운전자 역시 키르기스스탄 민족의 일원이었으므로 연속으로 추월을 당하자 집안 망신을 당한 것처럼 흥분해 콧김을 뿜어댔다. 남들처럼 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불안을 잊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식쿨 호수가 14세기에 중세 유럽을 박살낸 선페스트 발상지의 하나였대요. 여기서 잠들어 있던 선페스트균이 쥐벼룩을 숙주로 대상들에게 따라붙어서 유럽까지 간 거죠. 치사율이 75에서 백퍼센트 사이였대요. 지금 우리한텐 항체가 있을까나?”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보고, 왜 알고 온 거야?” “미리 책 사가지고 찾아보고 온 거지, 뭐. 시간 많고 심심해서.” 가이드가 외쳤다. “저 까마귀들 좀 보세요. 저기도. 저기에 또 죽었네.” 까마귀 떼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게 보였다. 수백 마리는 길바닥이나 밭에 떨어져 죽어 있거나 날개를 푸드덕거리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앉은 까마귀들은 그들을 애도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듯 귀 따가운 울음소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누가 농사에 방해된다고 농약 항공방제라도 했나? 무슨 일이죠?” “저렇게 많은 까마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농약을 뿌려서 죽일 만한 이유나 돈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이드가 대답했다. 십여 킬로미터에 걸쳐 까마귀의 사체와 울부짖음, 하늘을 선회하는 까마귀로 세상이 종말을 맞은 듯했다. 차를 세우고 땅에 내려서서 까마귀들을 보자 머리카락이 올올이 곤두섰다. “와, 고흐 그림(<까마귀가 날고 있는 밀밭>)보다 훨씬 더 낫네. 이런 그림을 여기 아니면 어디서 보겠어. 정말 오기를 잘했다. 요 몇 년간 본 것 중에 지금이 최고예요.” 카라콜에 어둑해질 무렵 도착했다. 숙소에 들어가니 와이파이 표시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까지 와서 아무런 대화 없이 스마트폰만 죽어라 들여다보고 있는 연인들이 두름으로 보였다. “와이파이가 있으면 세상이 어디나 똑같은 거 같아.” 나는 스마트폰을 껐다. 그날만. 성석제 소설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