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매거진 esc] 성석제의 사이(間) 이야기
카자흐스탄 에시크박물관에서 만난 ‘황금인간’과 2015년의 ‘나’,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았던 한 사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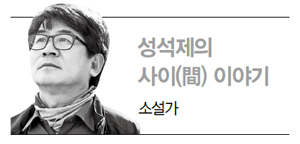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
배신과 음모, 짧은 영광과 긴 굴욕
겪으며 살았던 이슈바라
죽어가며 지긋지긋한 원수들에게
욕설을 퍼부어대지 않았을까 박물관 뒤에는 높이 십여미터쯤 되는 흙무덤이 있었고 꼭대기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 독야청청 서 있었다. 잎이 촘촘하게 달리고 뽕나무처럼 키가 크지 않은 나무에서 금방이라도 우주의 신성한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단군을 상징하는 나무가 박달나무(檀木)라면 무덤 주인의 나무가 그게 아니었을까. 내가 밟고 선 무덤의 양식이 내가 어린 시절(1970년대) 국사 과목에서 배운 신라의 고분 양식과 거의 흡사하다는 데 놀랐다.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적석목곽분)으로 불리는 이 무덤이 신라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건 기원후 4, 5세기부터다. 하지만 천년의 시차가 있는 두 무덤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화려한 황금 유물이 출토되는 것, 사슴뿔, 나무, 새를 닮은 장식을 쓰는 것까지. 도대체 신라 또는 고대의 우리 문화와 에시크의 스키타이족 무덤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얼마만한 교류가 있었던 것일까. 남의 나라(주로 중국) 역사서에 남의 문자로 소략하게 기록된 건 실제의 백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게 분명하다. 한번 머릿속에서 시작된 의문은 머릿속에서 비문증(飛蚊症)처럼 떠나지 않았다. 아직 충분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에시크의 ‘황금인간’과 2015년 현재 ‘나’ 사이의 거대한 시공간을 휘젓고 다녔을 법한 사나이를 하나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이슈바라(Ishbara, 한자로는 沙鉢略)이다. 이시크 칸(可汗, 지배자)의 맏아들이고 부민 칸의 손자이며 돌궐제국의 다섯번째 칸이다. 6세기 중반에 돌궐족은 동북아시아로부터 페르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웠다. 중국에서는 이른바 남북조시대의 혼란과 분열이 이어지던 중이었다. 581년 중국 북주(北周)의 외척 양견이 왕권을 찬탈해 수나라를 세우자 돌궐제국은 이를 침공의 명분으로 삼아 40만 대군을 끌고 수의 영토로 밀려들어갔다. 선두에 서 있던 다섯 칸 가운데 최강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던 인물이 북주의 공주와 결혼한 바 있던 이슈바라였다. 이슈바라의 정예 기병들은 중국의 서북지역 도시 곳곳을 함락하고 수나라의 수도권까지 위협했다. 그런데 갑자기 타르두가 지휘하는 서돌궐의 핵심 전력이 배후에 있는 사산조 페르시아와 에프탈 유목민들에 대응해야 한다며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슈바라 역시 본거지가 위험하다는 급보를 받아 철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구려가 대싱안링(대흥안령)산맥을 넘어서 동돌궐의 기병을 격파했고 산악 지역의 키르기스 부족이 내습해왔던 것이다. 583년에 초원에 대기근이 일어났고 이를 틈타 수 문제는 돌궐 정벌을 시작했다. 그사이 타르두가 스스로 칸을 칭하며 이슈바라에게 결별을 선언했다. 이로부터 돌궐제국은 동서로 완전히 분열됐다. 이슈바라는 사촌과 몽골고원을 두고 전쟁을 벌여야 했고 가까스로 승리해 한숨을 돌리는가 했으나 곧바로 서돌궐과 거란족의 협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 한때 이슈바라와 원수지간이었던 수나라는 북방 여러 나라 사이의 분란을 지속하게 하기 위해 이슈바라에게 지원을 보냈다. 이에 이슈바라는 수나라에 매년 공물을 바치고 신하의 예를 갖추기로 했다. 이슈바라는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 죽은 것 같다. 한평생을 전투와 전쟁, 골육상쟁, 배신과 음모, 짧은 영광과 기나긴 굴욕을 겪으며 살았던 이슈바라, 죽어가며 지긋지긋한 원수들에게 가슴에 쌓인 욕설을 시원하게 퍼부어대지는 않았을까. 609년, 동돌궐의 계민(啓民) 칸이 죽고 그의 아들 시필(始畢)이 그를 계승해 즉위하자 수 양제는 정략결혼을 할 공주를 선물과 함께 보냈다. 눈엣가시였던 고구려를 침공하려면 막강한 전투력과 기동력을 갖춘 돌궐의 기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구려는 돌궐제국과 외교관계와 교역을 지속함으로써 돌궐 기병이 수나라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결국 수 양제는 고구려를 침공할 때 자국의 농민들을 병사로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훈련이 불충분하고 두고 온 농사일에 걱정이 많은 오합지졸 때문에 수 양제의 고구려 정벌은 수포로 돌아갔다. 조선 중기의 인물 이시발(李時發. 1569~ 1626)은 이슈바라의 존재를 알았을까. 그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괄의 난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문신으로서는 드물게 전장에서 많은 공로를 세워 감사와 판서를 두루 역임했고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성석제 소설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