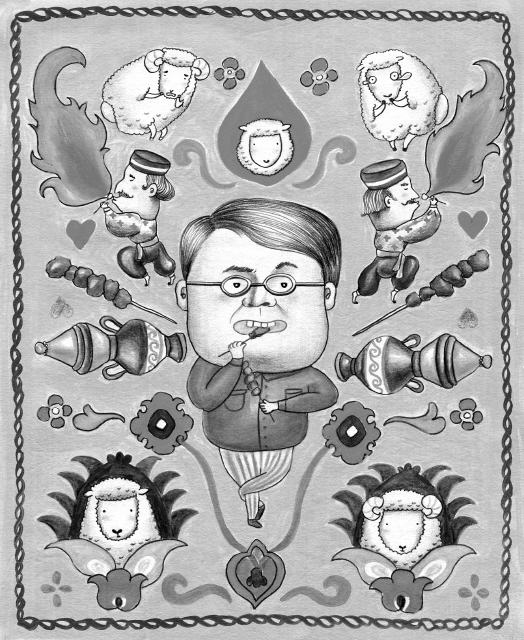 |
|
일러스트레이션 이민혜
|
[매거진 esc] 성석제의 사이(間) 이야기
인도 남부에서 먹은 탄두리 양꼬치의 감동…염소꼬치, 염소케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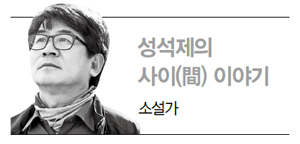 |
소와 돼지의 중간쯤 되는
식감이었다
왜 누린내가 나지 않나 물었더니
그게 염소와 양의 차이라고 했다 가축화가 되면서 양의 품종 대다수에서 뿔이 나지 않게 된 반면 염소 품종 대다수는 여전히 뿔이 난다. 양은 풀을 뜯어먹고 염소는 나뭇잎을 따먹는 걸 즐긴다. 양과 염소 모두 고기, 젖, 가죽, 털을 얻을 목적으로 사육한다. 앙고라나 캐시미어 같은 고급 양모는 사실 양털이 아니라 염소털이라고 한다. 인도에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탄두리 양꼬치구이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는 양꼬치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고 탄두르는 더더욱 귀했다. 어찌어찌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맛이 인도에서 먹던 것과 달리 양념이 지나치게 강했다. 이미 한번 탄두리 양꼬치구이 맛을 보고 난 나는 그 전의 나와는 다른 경험과 감각을 가진 존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반응은 비가역적이라는 걸 배웠다. 탄두리 양꼬치구이 덕분에. 꿩 대신 닭이라고 양꼬치 대신 염소꼬치는 없나 했으나 냄새가 많이 나는 염소는 꼬치로 하기는 힘든 모양이었다. 유럽에 여행을 하거나 잠깐씩 머물게 되면서 양고기로 만든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다. 일반 식당에는 양고기 스테이크가 소고기 스테이크만큼이나 흔했다. 슈퍼마켓의 냉장육류 칸에도 양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와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양고기를 사다가 꼬치로 만들어 구워서 먹을 엄두는 내지 못했다. 제대로 된 양꼬치를 만날 기회를 얻은 게 2007년 중국에서였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들어온 양꼬치 식문화가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었지만 그새 또 내게 무슨 ‘비가역성의 법칙’(쉽게 말해 변덕)이 작용했는지 입맛에 잘 맞지 않았다. 2010년 터키의 수도 앙카라(Ankara의 옛 이름이 Angora이며 앙고라토끼, 염소, 고양이의 원산지다)에서 사나흘간의 다큐멘터리 촬영 일정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함께 간 스태프들이 박물관 내부의 유물들을 촬영하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커피자판기에서 터키식 커피를 뽑아서 국립박물관 학예사와 마셨다. “여기 앙카라 사람들, 아니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유명한 음식점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터키의 서민들이 즐기는 맛을 볼 수 있게.” 내가 부탁하자 학예사는 앙카라 북쪽 외곽에 있는 어떤 식당을 소개해 주었다. 허름한 시가지, 시장 한 귀퉁이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는 엉성하고 낡은 식당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식단이 그리스 음식이었다. 그 직전에 두어달 동안 독일 베를린에서 머무는 동안 집 앞 그리스 식당의 단골이 되었던 나는 은근히 좋아했지만 이스탄불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안내인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터키 음식을 잘하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좋다는데, 싸고 맛있다는데, 그냥 가줍시다. 한국에서 유명한 중국음식점에서 짜장면 짬뽕 파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내가 앞장서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서둘러 뷔페식으로 차려진 무사카, 수블라키 같은 음식을 접시에 담아다 먹었다. 그리스 음식점이었지만 한구석에서 눈 따갑게 연기를 피워 올리며 터키의 자존심인 케밥을 만들어 팔고 있었다. 되네르(도네르) 케밥의 재료인 고기반죽은 양고기로 만들고, 돌려가며 구워 익은 부분을 자른 뒤에 화덕에서 구운 얇은 빵 피데에 싸서 먹었다. 양꼬치와 당근, 감자 등을 피데로 싸먹는 시시 케밥도 있었다. 즉석에서 굽고 먹으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13년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 유학생인 안내인에게 비슷한 부탁을 했다. 싸고 맛있고 유명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당을 소개해 달라고. 그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은 터키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었다. 백사십년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아테네에서 가본 어떤 그리스 식당보다 맛이 있었다. 물론 그곳의 케밥은 염소가 아닌 양고기로 만든 것이었다. 성석제 소설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