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박미향 기자 mh@hani.co.kr
|
[매거진 esc] 이우성의 좋아서 하는 인터뷰
<두 번 사는 사람들>로 우울의 기원 찾는 젊은 소설가 황현진의 자책감과 연대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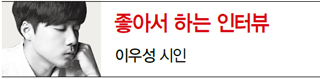 |
그때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살 거면
왜 많은 것을 포기했을까
내가 포기한 존재들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어” “<두 번 사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시간대는 1979년이야. 내가 태어난 해지. 나는 소설을 통해 내가 살아온 시간을 확인하고 증명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내게 찾아온 궁금증은, ‘나는 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전후의 세계를 지도로 그려볼 필요를 느꼈어. 영향권이란 어떤 의미에서 내 가족이지.” 소설이 그저 한 편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내가 아는 훌륭한 소설가들은 소설로써 삶을 살았다. 소설은 예술이 아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가가 이야기로 삶을 개척하고, 동시에 삶의 본질을 찾아나갈 때 소설이 예술이 될 수 있다. 예외적이다. 그런 소설가에게 표절은 불가능하다. 남에게서 얻은 문장과 이야기는 자신의 삶과 맞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느닷없이 표절에 대해 언급하게 됐는데, 표절한 작가는 결코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 사는 사람들>은 연재 중이지만 그녀는 올봄에 이미 모든 작업을 끝냈다. 한창 소설을 쓸 때 말했다. “대작이야. 대한민국 소설사에 한 획을 긋는 작품이 될 거야.” 거짓말이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과장하고 희화화한다. 그것이 말을 믿지 않는, 그녀의 윤리다. 자신에 대해, 소설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과장 역시 거대해진다. 그래서 <두 번 사는 사람들>을 나는 한 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고뇌한 궤적이며, 본질에 다가가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족을 단다. “오랫동안 나를 붙든 죽음의 장면이 있어. 분노와 아픔, 상실감, 의심과 의혹, 복수심, 원망, 후회 등을 비롯해 왜 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나, 왜 사람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도망쳤나, 라는 질문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세월호는 그걸 가장 폭력적으로 내게 일깨웠어.” 그녀는 큰 사건을 개인사로 축소시켜서 미안하다고도 적었다. “다시 한번 통감한 무엇이 있다면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죽고 난 후에도 서로 계속 소통한다는 거야.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거지. 내가 슬퍼하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게 그 증거야.” 그녀가 적어 보낸 소통과 연대에 대해 이 글을 쓰며 줄곧 생각했다. 무력감은 그 사건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준 최대의 상처일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적어 보낸 답변을 읽으며 그저 공허한 분노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무리는 이 싸움이 끝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황현진은 기꺼이 물속에 있다, 라고 나는 굳이 적고 싶다. 이런 문장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물속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황현진에게 아주 중요하다. 어쩌면 그녀의 삶 전체를 담보하는 믿음일 수도 있다. “나는 아직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 포기할 게 남아 있는 것 같아.” 삶과 소설이 그녀에겐 같은 단어다. 그러지 말라고, 포기해야 소설을 쓸 수 있다면, 그깟 거 버리라고 말해주는 게 친구의 도리일까? 그러나 나는 못내, 우리 시대가 한 명의 정직한(이 이상의 수사를 찾기 어렵다) 소설가를 얻는 기쁨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녀가 울면서 걸어갈 세계를 고대하고 있다. 그녀에게 잉태되어 있는 세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아프고 미안하다. 이우성 시인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