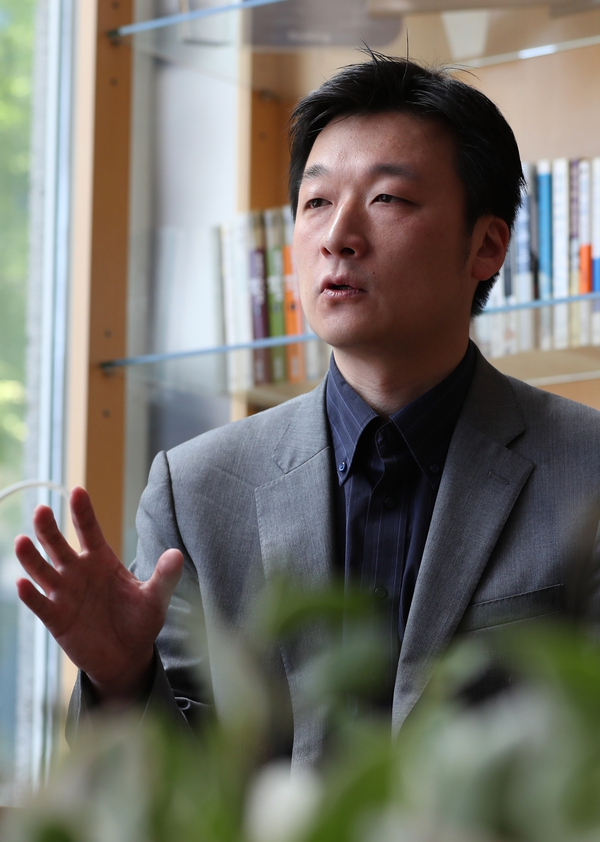 |
|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부터 입국이 거부됐던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 위안부 문제, 재일동포 문제에 대해 강연 등을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
2009년 ‘거부 부당’ 행정소송도 패소
지난달 27일 12년 만에 고국 재방문
“4·27 정상회담 서울서 맞아 기뻤다” 조선적 정체성·위안부 문제 ‘전문’
“재일동포는 식민·분단사 피해자” 정 교수는 2006년에 이어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그가 한국 땅 밟는 것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2016년 6월 정 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 강연을 위해 귀국하려 했지만 입국이 막혔다. 이 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해 논란을 빚은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그의 입국길이 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재일동포는 국적을 불문하고 고향 방문을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예고했었다. 오랜 시간 한국에서 만날 수 없었던 정 교수의 강연 일정은 빡빡했다. 입국 이튿날부터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이 주최한 6차례 강연을 일주일 만에 소화했다. 강연 주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자 전공이기도 한 조선적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였다. 1980년 일본 지바현에서 조선적 3세로 태어난 정 교수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조선학교에 다녔다. 일본은 1947년 재일조선인의 국적란에 ‘조선’으로 적도록 지시했는데, 그 뒤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동포들은 ‘조선적’으로 남게 됐다. 그 수는 3만명이 넘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국적과 한국 여권이 없는 외국 거주 동포가 입국하려면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정 교수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아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한국을 찾았지만, 2009년 갑자기 발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그는 “저는 그때까지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한국에 간다는 건 ‘전향’처럼 여겨져 가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못 가게 되니 이제는 가야 할 나라가 됐다”고 했다. 정부는 정 교수의 조선학교 졸업, 99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산하 조선청년동맹 대표단으로 방북, 총련 산하 청년조직 간부 활동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그는 2009년 8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조선적은 남도 북도 일본도 선택하지 않은 무국적자’로, 그들의 선택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교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방북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 교수는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조선적 중에는 무국적자라는 의식을 갖는 분도 있지만, 저는 ‘남이냐 북이냐’라고 묻는다면 ‘북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한국의 틀에서는 ‘그래서 결국 북한을 택했단 말이지’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제가 민족을 상상하거나 조선반도에 가고 싶다거나 친근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민족이라는 감각을 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조선학교를 통해 얻었는데 남쪽에 가기 위해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 고국을 방문할 권리는 남북한에 대한 지지와 관계없는, 민족이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조선적’이 생기고 남북 분단으로 고국을 찾지 못하게 된 만큼, 그 책임은 식민지 피해자 자손인 제가 아니라 남북 분단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이 기준이 되면 남과 북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70년 넘게 ‘남과 북’이라는 틀 밖에서 살아온 조선적의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남이냐 북이냐’라는 질문은 협소하다. 정 교수의 할아버지는 조선적을 택했지만 고향을 방문하고 싶어 2000년대 들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다른 가족들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다음 입국’을 장담할 수 없는 정 교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제가 원하는 건 한국의 관점에서 조선적 이미지를 그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식민지 역사, 남북 관계, 해외 동포를 전제로 조선적의 삶을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남이냐 북이냐’를 넘어선 질문을 다시 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