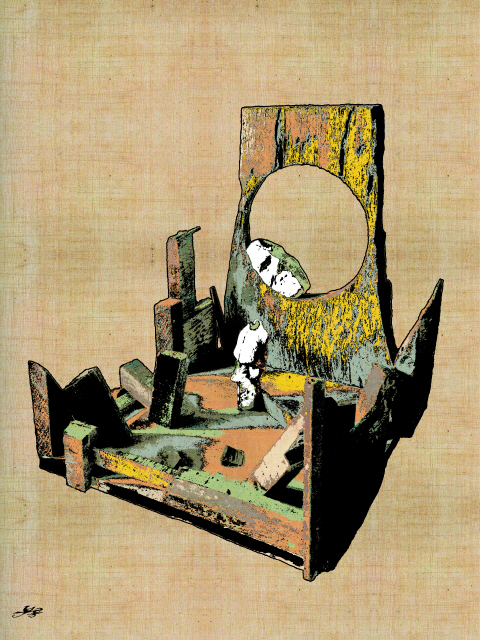 |
|
그림 이부록 작가
|
[매거진 esc] 김연수의 ‘소년이로다’
조악한 재현, 측은한 현실…소년들을 사로잡은 <전설의 고향>에서 <13일의 금요일>까지
‘이제, 여름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소리로 느닷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만큼 기분 좋은 게 있을까? 도심의 점심시간, 음식점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남자들이나 한손으로 머리 끝을 가린 채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골목을 달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현대의 풍속화처럼 보인다. 이 풍속화에 제목을 붙인다면, ‘대도시의 깐깐오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지 지나 사나흘 지나면 대개 장마가 시작되니, 그 이전은 건기의 초여름이다. 마른 낮이 계속되는 나날이므로 하루 지나는 게 여간 깐깐하지 않아서 선조들은 음력 오월을 그렇게 불렀다. 그 깐깐오월에 차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곧 하지가, 그리고 장마가 다가온다는 뜻이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지금이 언제인지를 스스로 알아냈다. 일본의 고전 수필인 <도연초>를 쓴 요시다 겐코는 ‘세속적인 일에는 아무 미련이 없으나 그날그날 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감명 깊었던 순간들만은 마음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쓴 적이 있다.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감동은 바로 거기, 고개만 들면 보이는 그날그날의 하늘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늘만 올려다보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시대는 행복했으리라. 루카치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들의 지도인 시대, 별빛이 그 길들을 훤히 밝혀주는 시대는 복되도다’라고, 또 ‘세계는 넓지만 마치 자기 집과 같은데’라고 쓴 까닭도 그 때문이다.
그 옛날에는 인간과 세계가 서로 낯설지 않았던 모양인데, 내가 태어난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내게는 별이 총총한 하늘보다 먼저 지직거리는 흑백화면이 있었다. 처음에는 티브이 화면이었고, 영화관의 스크린과 컴퓨터의 모니터가 그 뒤를 잇다가 핸드폰의 액정 화면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이 화면들을 통해서 자연을 접했다. 화면 속의 자연은 집중호우, 홍수, 가뭄 등이었고, 그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인간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었다. 일부러 그런 자연만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실제 자연의 모습을 재현할 수 없는 화면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었으리라. 제아무리 고화질의 입체 모니터가 있다고 한들 끝 간 데 없이 푸르른 유월 저녁 하늘의 청량감을 그대로 느끼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슬래셔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경찰차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조금은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킹카 중의 킹카가
살인마를 죽이면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화면들은 자연을 재현할 때 더 자극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 해상도가 낮을수록 더욱 그렇다. 누군가의 집 화단에 핀 맨드라미의 아름다움보다는 세렝게티 초원에 사는 사자의 포악함이 시청자들에게는 더 잘 전달됐다. 여름 오후의 한가로움보다는 집중호우로 떠내려가는 자동차나 가뭄에 타들어가는 논바닥이 더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공포영화는 1970년 후반에 시청한 <전설의 고향>인데, 그건 그 드라마를 흑백 브라운관 티브이로 봤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티브이에 비치는 달이나 형편없는 스피커로 듣는 부엉이 소리는 집에서 조금만 걸어나가면 접할 수 있는 실제의 달과 새 소리에 비해 조악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 세대에게 공포의 실체란 그 조악함이었다. 조악한 재현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비틀면서 공포를 만들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조악하게 왜곡된 대상은 바로 여자 귀신이었다. 조선시대가 배경이라면, 아무래도 남성 쪽이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했을 테고, 따라서 타인에게 원한을 품고 죽을 확률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티브이에서 여자 귀신이 더 많이 등장한 까닭은 1970년대 후반의 시청자들이 보인 심리학적 투사 때문이리라. 말하자면 당시 한국인들은 자기 안에서 고통받는 여성의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이를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얼굴은 티브이가 조악하게 재현한 공포의 얼굴이 됐다. 세계를 조악하게 인식할수록 더 크고 실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공포가 생겨난다. 이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옛사람들처럼 세계를 직접 대면하면 될 것이다. 즉 미디어를 거치지 않은 맨눈으로 세계를 보면 된다.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조악하게 재현된 공포는 정치적으로 매우 쓸모있으므로 이를 권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막연한 공포에는 얼굴이 없으니까.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얼굴이라도 여기에 갖다붙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학습을 통해 권력이 제시하는 얼굴을 공포의 얼굴로 상상한다. 어린 시절, 여름밤이면 나는 화장실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소복을 입은 채 목을 매단 여자의 얼굴을 상상했다. 내게 그 끔찍한 얼굴을 가르쳐준 건 당연히 <전설의 고향>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만 되어도 이런 기획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된다. 고등학교 때, 동시상영관에서 <월하의 사미인곡>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다.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국문학적인 공포영화랄까. 아무튼 첫 장면부터 무덤이 반으로 쪼개지는데, 마치 흥부가 시렁시렁 박 타는 장면을 보는 듯했다. 소복녀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와이어가 너무 잘 보였다. 대신 그 시절의 진정한 공포영화는 <나이트메어>, <13일의 금요일>, <할로윈> 등 슬래셔영화들이었다. 이 영화들은 ‘열일곱 살에 나는 진실을 배웠다네. 사랑은 킹카들에게나 필요한 말이라는 걸’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재니스 이언의 ‘앳 세븐틴’(At Seventeen)의 남학생 잔혹 버전이랄 수 있었다. 그 영화들은 인생 잘못 살면 남들은 몰래 재미보는 밤에도 톱질하면서 일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내게 안겨줬다고나 할까. 슬래셔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나는 조금은 애잔한 마음을 느끼곤 했다. 왜냐하면 그 영화들은 대개 킹카 중의 킹카가 살인마를 죽이면서 끝났으니까. 살인마로서도 잘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원래 인생은 그런 것이니까. 가면을 쓰고 나오는 제이슨은 왠지 수줍음이 많게 느껴진다. 잘해보고 싶었으나 그 따위 결과를 빚은 그에게 어쩐지 마음이 갔다. 그러면서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내 안의 어딘가에도 제이슨과 같은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역시 미디어로 조악하게 재현된 얼굴이 실제로는 자신의 얼굴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전보다는 좀더 살 만한 사회로 바뀌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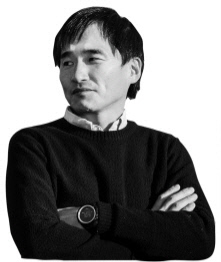 |
|
김연수 소설가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