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11 20:32
수정 : 2015.03.13 14:16
 |
|
사진 안현민 제공
|
[매거진 esc] 안현민 셰프의 베이징 밥상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년 넘겨야 할 가장 큰 관문은 춘절이다. 빠르면 한달 전부터 직원들의 이탈이 시작된다. 춘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가는 거다. 매니저까지 연휴 시작 일주일 전에 고향 가겠다고 하면 힘이 빠진다. 고향 갔던 직원들이 돌아올 확률은 30% 정도다. 춘절은 중국 최대의 명절이자 이직 기회다. 정식 연휴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춘절 이후 한달 만에 복귀하는 직원도 있다. 돌아온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식사업 분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중국의 춘절 준비 풍속은 엄청나다. 라바제(납팔절·臘八節·음력 12월8일을 ‘납팔’이라고 하는데 중국음으로 ‘라바’다)에 라바저우(납팔죽·8가지 곡식이 들어간 죽)를 먹고, 라바쏸(납팔산)이라는 마늘장아찌를 담그는 것으로 시작한다. 음력 12월23일은 탕과잔(糖瓜粘)이라는 엿을 먹는데 산신이 내려오는 춘절을 앞두고 끈적거리는 엿을 먹고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4일은 싸오팡쯔(掃房子)라고 해서 집안 구석구석 창틀의 먼지까지 청소하는 날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들이 이어진다. 25일은 자더우푸(炸豆腐)로 두부 튀기는 날, 26일은 둔양러우로 양고기를 조림하는 날, 27일은 사궁지(殺公鷄)로 수탉을 잡는 날, 28일은 바몐파(把面發)로 만두 만들 반죽을 발효시키는 날, 29일은 정만터우(蒸饅頭)로 전날 만들어 놓은 반죽으로 만두를 찌는 날이다.
춘절인 음력 1월1일부터 보름까지 먹는 음식도 구분이 되어 있다. 음력 1월1일은 재물을 상징하는 자오쯔(餃子·교자만두), 2일은 장수의 상징인 면식, 3일은 호떡과 비슷한 음식인 허쯔왕자좐(合子往家轉·고기나 부추와 달걀이 들어간 음식), 4일은 라오빙차오지단(烙餠炒鷄蛋·밀전병에 볶은 달걀을 싸 먹는 음식), 5일은 재물신의 생일이라고 해서 교자만두, 6일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면이나 교자만두, 음력 7~8일은 기름에 지진 떡을 먹는다. 9~10일은 흰쌀밥, 11~12일은 바바오저우(八寶粥·곡류와 너트류가 8가지 들어간 죽), 13~14일은 촨탕완(竄湯丸·손으로 빚은 완자탕), 정월대보름인 15일은 원소절(元宵節)로 새알같이 생긴 원소(元宵) 또는 탕원(湯圓)이라 불리는 음식을 먹는다.
중국에서 춘절을 여러 번 보내면서 한국의 설날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명절의 무게중심이 음력 12월30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식사가 퇀위안녠야판(團員年夜飯)이라고 불리는 30일 그믐날 저녁식사다. 그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30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 복을 기원하는 식사를 한다. 이 식사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음식들이 있다. 첫째가 생선요리인데 ‘녠녠유위’(年年有余)라고 부른다. ‘余’의 중국어 발음이 ‘魚’와 같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음식이다. 둘째는 떡이다. 떡은 중국어 발음으로 ‘녠가오’라 하는데, ‘★米+羔★’와 중국어의 ‘高’가 발음이 같다. 매년 높아진다는 ‘年年高’라는 의미를 담는다. 셋째는 푸주(腐竹·말린 두부 종류의 하나로 안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모양이 대나무처럼 생겼고 데쳐서 셀러리와 함께 볶아서 먹는다)로 ‘富足’(푸쭈)과 발음이 비슷해서 ‘재산이 충분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는다. 넷째는 가장 중요한 교자(餃子)로 새해와 구년이 겹치는 교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밤 12시에 삶아서 먹는다. 옛날의 중국 돈인 은자와 비슷하게 생겨서 재물을 상징하고 발음이 ‘交子’(아들을 낳는다)와 같아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
춘절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춘절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20일이 넘는다. 참 길다. 낯선 문화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처음에 춘절이라는 이름도 이해가 안 됐다. 춘절(春節). 봄의 명절인데 눈 내리고 얼음 어는데 무슨 봄이란 말인가? 입춘도 마찬가지다 입춘에는 춘병(春餠·봄에 나는 채소들이나 고기, 새우 등을 밀전병 등에 싸먹는 중국 음식)을 먹는데 엄동설한에 봄채소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오래전 중국의 중심지는 지금의 베이징이 아닌 장안, 즉 지금의 시안(서안)이다. 시안은 부산보다도 조금 더 아래에 있으니 봄의 기운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 봄채소의 싹을 재료로 만든 밀전병 쌈이 가능했던 것이다.
안현민(‘원포트 바이 쌈’ 대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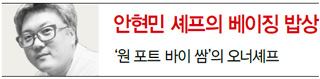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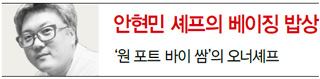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