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18 20:36
수정 : 2015.03.19 13:20
 |
|
사진 홍윤주 제공
|
[매거진 esc] 홍윤주의 네 방을 보여줘
이태원동 주씨(36·건축가)가 사는 양옥집: 방2, 거실, 주방, 샤워실, 옥외 화장실, 마당(월세 30만원, 보증금 1500만원)
건축가들이 사는 집은 좀 다른가? 부자 건축가와 가난한 건축가, 직접 만들기를 좋아하는 현장형 건축가와 책상형 건축가 따라 다르다. 남의 집 만들어주기에 바빠 매일 야근을 일삼다 보니 내가 아는 한국의 유명 건축가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산다.
주씨는 가난하면서 현장형에 가까운 건축가다. 주씨는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세들어 산다. 방 3개짜리 주택을 개조해서 방 한칸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거실을 포함해 방 2개와 마당을 주씨가 사용하고 있다. 다락이 있고 높낮이가 모두 다른 이상한 공간, 몇개의 출입문은 무척 낮아서 툭하면 이마를 부딪히곤 했지만 곧 적응이 됐고, 옆집과 같이 쓰는 화장실이 밖에 있다는 것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 산사처럼 고요하고 풀벌레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남산을 바라보며 조용하게 차를 마시는 여유로움에 행복했다. 이 집 주변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사는 고급 빌라이고 심지어 200m만 가면 대기업의 회장 집들이 즐비한데 이곳 5채만이 좁은 골목을 가진 달동네처럼 남아 있다.
주씨는 얼마 전 건축사무소를 그만두고 자진 백수가 됐고, 옆집 단칸방에 사는 세입자는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꾸린다. 이것저것 조금씩은 다 해봤다지만 어느 것 하나 전문적이지 못한 옆방 세입자는 집주인의 가벼운 예산과 어깨너머로 배운 얄팍한 기술만으로 이 집을 수선한 듯했다. 욕실, 창고 등 샌드위치패널로 증축한 부분의 이음새는 틈이 그대로 보였다. 어떤 창문은 안과 밖을 거꾸로 달아서 방충망이 실내에 달려 있고, 기울기를 맞추지 못한 욕실 바닥엔 항상 물이 고였다. 화장실에서 정화조까지 가는 배관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깨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싼맛의 달콤함은 금방 잊혀지나 저질의 쓴맛은 오래 남습니다.” 어느 자재회사의 광고 문구가 꼭 들어맞는 이 집은 겨울이 되면서 허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일러 성능은 좋아서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바닥은 뜨끈한데 실내에서 입김이 나왔다. 모든 문과 창문은 심각하게 틈이 벌어져 창틀과 벽 사이의 틈으로 넝쿨식물이 들어와 자라고 있었다. 창문을 교체하려고 오래된 알루미늄 창을 뜯어냈는데 벽 속 단열재가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다. 자세히 살펴보니 1㎝ 두께의 스티로폼이 벽지에 붙어 있었다. 하루는 ‘틱틱’ 소리가 나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는데 차단기에서 전선이 타고 있었다. 마당 위로 얼기설기 지나가는 누추한 전선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건축가인 주씨의 시선에선 어처구니없는 것투성이였지만 괴상하고 어설픈 집을 고치는 재미에 빠지게 한 계기가 됐다. 주씨는 마당에 간이 목공소를 차려 한두달 쉬엄쉬엄 놀듯이 공사를 했다.
수십년간 그때그때 급한 불만 끄면서 수선된 집. 동네 설비 가게에는 장인 같은 기술자도 있지만, 싼맛으로 뭉친 ‘야매’ 기술자들이 만진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이런 집이 아직 많은데 직접 살면서 경험한 것이 건축가로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 같은 사람들이 당장 너무 불편하진 않도록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중이다.
면적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므로 건물의 질보다는 규모를 확보하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주택들이 생산되고, 한번 짓고 난 건물은 지속적인 관리 없이 고장난 것만 그때그때 고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건물이 부실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과 가스비 등은 세입자의 몫이 된다. 집은 모두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애프터서비스를 받듯이 임대주택도 그랬으면 좋겠다. 현실에선 뭔가 고장이 났다는 확실한 문제가 아닌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대충 맞춰 사는 경우가 대다수다. 집주인 맘대로인 임대료 때문인가,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인가? 사실 집주인은 본인이 직접 살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는 사람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집이라는 하드웨어를 너무 일찍 포기하고 산다.
홍윤주 건축가·생활건축연구소 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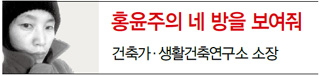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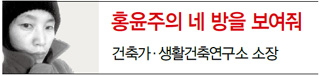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