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4.08 20:54
수정 : 2015.04.09 10:53
 |
|
사진 홍윤주 제공
|
[매거진 esc] 홍윤주의 네 방을 보여줘
연남동 이씨(40대·문화기획자)가 사는 다세대주택: 방3,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월세 40만원, 보증금 6000만원)
우리집은 작다. 작업실도 작다. 나의 로망은 침대를 벽에 붙이지 않고 방 한가운데 두고 사는 거다. 그리고 커다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는 것이 아니라 털썩 거칠게 앉아봤음 하는 거다. 요즘 협소주택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서울에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소의 공간’이라는 말이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내게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산뜻하지 않다.
연남동 이씨의 집은 다세대건물의 전형적인 가정집 구조를 가지고 있다. 1인이 살기에 무척 여유있는 규모의 집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넓은 공간감이 기분 좋았다. 걸어다닐 때도 방해물이 없어서 행동이 자유롭고 집 안에서 살랑살랑 걸어다니는 기분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얼마 만인지.
안방이랄 수 있는 큰방이 1개이고, 작은방 2개는 옷방과 책방으로 쓰고 있다. 안방에는 침대가 벽에 붙어 있고, 나머지 두 벽은 책장이 차지하고 있다. 책장 바로 앞 바닥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다. 제일 작고 어두컴컴한 방은 옷방, 밝고 작은 방은 책방이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거실 한 벽 가득 책장이 있고, 베란다에는 잘 보지 않는 책들이 또 쌓여 있다. 이사 오기 전만 해도 2명이 살 계획이었지만, 이 많은 책들이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책 없이 혼자 살게 되었다. 이 집은 햇빛이 잘 안 들어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그리고 이 일대에 오랫동안 살아서 ‘우리 동네’라는 느낌이 주는 안정감도 있다. 답답하면 밖에 나가 걸어도 낯선 느낌이 없고, 익숙한 공간들이 있어 햇빛에 대한 결핍은 없다. 이씨는 밀실공포증까진 아니어도 답답한 것을 되게 싫어한다. 일을 할 때 늘어놓고 할 수도 있고, 책을 펼쳐놨다 어쨌다…, 운동이 아니어도 그런 행위를 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최소면적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화면을 보고 집중하는 행위라면 카페에서도 할 수 있지만, 글을 쓰더라도 관련 서적을 꺼내 보고, 다시 올렸다가 펼쳐놨다가 하는 행위들이 사유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부담이 되더라도 넓은 집을 선택했다. 집을 구할 때 처음엔 반지하 전세를 봤다.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갔더라면 저축도 했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갇힌 느낌을 받긴 싫다.
이씨는 ‘개인이 사적 공간을 크게 하는 것은 공적 공간이 좁기 때문이고, 제2의 공간, 제3의 공간을 늘리면 사적 공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집에서 책이 차지하는 공간을 빼고 나면 정말 필요한 공간은 침실로 쓰는 안방 크기 정도다. 옷도 두고 기타 조건을 생각해도 이 집의 절반, 10평이면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아카이빙’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것이 2000년대 중반이었다. 문화공간을 설계할 때 아카이빙 공간을 꼭 만들었다. 도서관에 없는 그 많은 자료들은 각자의 공간에 분산돼 있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자료가 손에 들어오면 쥐고 있게 되는 경우랄까. 도서관이나 기타 공적 공간에서 해결해야 할 면적을 개인이 모두 해결하다 보니 공간이 넓어졌다.
집 밖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상업공간 외에 공적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집 앞 공원, 어린이 놀이기구와 운동기구 모아 놓은 곳. 공중도덕이라고 교육받은 대로 많은 금지항목들에 갇혀 벤치에 앉아 있는 것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생태하천과 성곽길, 자연과 역사 다 좋은데 개인이 운동 삼아 걷고 경치 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큰맘 먹고 괘불을 보겠다고 박물관을 찾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적어놓은 금지안내판이 그림 일부를 가리고 있어서 울고 싶었다.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도 조심스럽고 책장조차 못 넘기겠어서 도서대출만 이용한다. 나처럼 놀기 좋아하고 자기 시간을 맘대로 관리하는 사람도 큰맘 먹고 찾아가야 할 정도로 공적 공간은 부족하다. 그나마도 개인의 다양성을 품을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은 있나?
홍윤주 건축가·생활건축연구소 소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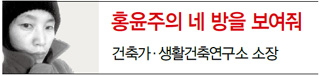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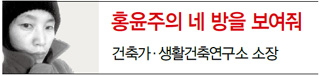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