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4.22 20:24
수정 : 2015.04.23 14:55
 |
|
사진 홍윤주 제공
|
[매거진 esc] 홍윤주의 네 방을 보여줘
요즘 방송되는 <룸메이트>는 ‘누구나 한번쯤 꿈꿔보는 하우스 판타지’를 그리기에 충분한 대저택이 배경이다. 그러나 첫 회에 나온 아이돌 스타의 현실 속 공간에선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비루해 보일 수 있는 일상이 그려진다. 한방에서 진짜 룸메이트 5명이 김밥처럼 일자로 누워 자고, 빨래건조대와 물건들로 어지러운 거실 바닥에 앉아 라면을 먹고 티브이를 본다.
소셜하우징 또는 셰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집을 나눠 쓰는 게 새로운 방식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로 집을 나눠 쓰는 일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하숙집부터 월세방을 함께 쓰거나 큰 집을 빌려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다만 요즘은 다양한 공유 방식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다르다.
안씨와 김씨는 집을 같이 쓰는 하우스메이트다. 안씨에게는 권리금이 있고, 김씨는 월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안씨는 수공예 작업 공간이, 김씨는 어항을 놓을 공간이 필요했다. 또 사람들과 놀 수 있는 옥상이 있었으면 했다. 양재동에 살 때 기타를 조금만 쳐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해방촌 친구 집에선 미친 듯이 놀아도 괜찮았다. 그래서 부근을 돌아다니며 찾은 게 보광동 집이다.
밖에 딸린 작은 창고는 안씨가 개인작업실로 쓴다. 거실에 물고기와 거북이가 살고 있는 어항들이 벽 쪽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쌓여’ 있어서 놀랐다. 잘 정돈돼 있는 안씨 방에는 직접 그린 그림들이 벽을 차지하고 있다. 김씨 방에는 작은 어항 대여섯 개와 함께 고양이 두 마리가 살고 있어 야생의 냄새가 진했다. 식물은 안씨, 동물은 김씨가 관리하고, 요리는 안씨, 설거지와 커피 내리기는 김씨가 주로 한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사소한 습관이 부딪치는 생활이다. 모든 걸 규칙으로 정할 수 없기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다. 청결 기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존재하는 쓰레기가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반면 기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별게 다 쓰레기로 보인다. 김씨에게 익숙한 야생의 냄새와 고양이 털은 안씨에게 스트레스인 것 같다. 거실로 나온 털들이 바람을 타고 안씨 방으로 들어가고, 냄새도 편치 않다. 다행히 10년지기 두 친구는 뒤끝이 없다.
안씨는 작정하고 백수가 된 뒤로 커뮤니티에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을 초대했다. 김씨는 얼결에 백수가 됐고 커뮤니티에 관심은 없는데 안씨보다 더 ‘미친 듯이’ 즐기고 있다. 시작은 사흘간의 집들이였다. 집들이를 위해 옥상에 오두막을 만들었는데 무척 맘에 든다. 그물침대를 달고 그네 의자도 만들었다. 함께 간 지인은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남자가 건축하는 이였는데, 이 옥상을 보니 건축하는 남자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들은 건축하는 남자가 아니라 건축하다 때려치운 남자들이다. 게다가 건축하는 남자와 직접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남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옥상을 개방하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친구의 친구가 찾아왔다. 동네 사람들과도 커뮤니티가 형성됐다. 열심히 만든 옥상을 사람들이 좋아해주니 뿌듯했고, 입장료처럼 의무적으로 찍힘을 당한 이들의 얼굴 사진은 표정이 참 아름다웠다. 개인 공간 침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시작했지만, 일주일에 3~4번 찾아오는 사람들 모두가 적정선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점점 피로도를 느꼈던 안씨는 집에 딸린 작업실을 놔두고 별도의 작업실이 필요하게 됐다. 혼자 있을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다.
우리에겐 타인과 함께하는 공적인 ‘나’와 그로부터 단절된 사적인 ‘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결핍되면 안정이 깨지고 피로가 쌓인다. 얼마 전 설계한 소셜하우징에서 ‘입주자 개인공간-입주자 공용공간-동네 커뮤니티 공간’의 3단계 공간을 작은 건물 안에서 배려해야 했는데, 단순히 물리적 선을 긋는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 달라 어려운 문제였다. 오랜 논의와 탐색이 필요하다. 공사가 끝난 지금도 입주자들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고 있는 것 같다.
홍윤주 건축가·생활건축연구소 소장, 사진 홍윤주 제공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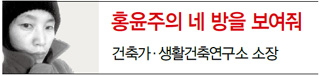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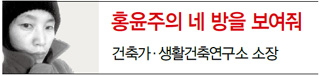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