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9.17 18:58
수정 : 2015.09.17 18:58
박승현의 MLB 리포트
지난 15일(한국시각) 재활중인 류현진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다저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기자실 한쪽에서 다저스 경기 스페인어 방송 중계 해설을 맡고 있는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다저스의 전설적인 투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한국 기자”라고 소개했더니 아주 반가워하더군요. 그에게 한국에서 다시 감독으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이스터는 주저 없이 답했습니다. 롯데뿐 아니라 다른 구단과도 얘기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그는 “가능성이 있다”를 넘어서 “내가 한국에서 감독을 맡는 것이 유일한 직업이 될 것”이라거나 “미국에서도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는 등의 말로 한국 복귀에 대한 강한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느낀 것은 ‘한국에서 감독 자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
|
제리 로이스터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
로이스터 얘기를 기사화하면서 시즌 막바지에 피 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는 국내 프로야구 감독들이 로이스터 거취 문제 때문에 공연히 마음고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려한 대로 ‘로이스터가 선을 넘는 발언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흔들고 있다’는 비난이 한국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스터는 현재 구직자입니다. 지난해 멕시칸 리그의 티그레스 데 킨타나 로의 감독을 맡았지만 현재는 무직입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프로야구를 취재하던 당시 일본에는 두 외국인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바 롯데의 보비 밸런타인,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의 트레이 힐먼 감독입니다. 밸런타인은 2005년, 힐먼은 2006년 일본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감독은 일본인 감독들과 달리 팬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일본에서 프로야구 감독은 팬들과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두 외국인 감독은 이런 편견을 깨고 팬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지냈습니다. 덕분에 만년 하위권이던 두 팀은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쿄돔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지냈던 닛폰햄이 홋카이도로 연고지를 옮겨 빠르게 정착한 데는 힐먼 감독의 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감독에 대해 일본야구를 흔든다는 비난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감독한테서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면 고용관계를 끝내면 됩니다. 로이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단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평가하면 됩니다. 그의 말에 한국프로야구가 흔들린다고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닙니다.
박승현 로스앤젤레스/자유기고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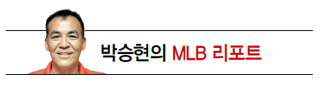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