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드니 폴럭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사진 정준화 제공
|
[매거진 esc] 정준화의 다시보기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무렵이었을 것이다. 하루는 친구가 꼭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서 함께 극장에 가자고 했다. “우리 삼촌이 그러는데 <인디아나 존스> 같은 내용이래.” <인디아나 존스 2>가 10년 남짓한 내 인생 최고의 영화였던 시절이라 대번에 솔깃해지고 말았다.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거금(대략 2500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을 투자해 티켓을 구입했다. 마침내 영화가 시작됐는데 음, 극 초반의 진행이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 다소 지루한 듯했지만 좀 더 참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러닝타임이 꽤 흘렀는데도 도통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것이다. 남자 주인공이라는 작자는 악당들에 맞서 액션을 펼칠 생각은 안 하고 그다지 예쁘지도 않은 여자 주인공 머리나 감겨주면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짜증이 슬슬 끓어오를 무렵, 남자가 드디어 어딘가로 떠날 결심을 했다. 드디어 본격적인 모험에 돌입하겠구나, 내팽개쳤던 기대를 주섬주섬 챙겼다. 하지만 10분쯤 뒤, 여자 주인공과 관객들은 남자의 허망하고 난데없는 죽음을 통보받게 된다. <인디아나 존스>와는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눈치챘겠지만 문제의 작품은 시드니 폴럭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였다. 열살 소년에게 처절한 실망을 안겨준 남자는 로버트 레드퍼드고, 그다지 ‘예쁘지 않다’는 괜한 비난을 들어야 했던 여자는 메릴 스트립이라는 뜻이다. 물론 제일 원망스러웠던 건 친구의 삼촌이었다. 몇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허황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유가 뭔지 따져 묻고 싶은 기분이다. 위와 같은 사연으로 인해 내게 <아웃 오브 아프리카>는 한동안 언짢은 추억의 영화였다. 우연히 재감상을 하게 된 건 약 20년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세월이 흘러 배신감이 누그러지고 나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였다. 일단 젊은 시절의 메릴 스트립이 기억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고전 회화를 연상시키는 섬세한 이목구비에는 1980년대의 책받침 여신들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한편 의상 감독 밀레나 카노네로는 빼앗아 입고 안산 갈대공원에라도 놀러 가고 싶을 만큼 근사한 사파리룩을 배우들에게 선물했다. 분명 모험 액션보다는 로맨스에 어울릴 스타일인데 열살 때는 미처 그 차이를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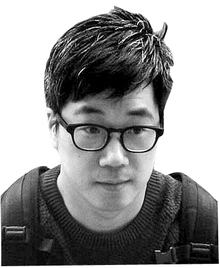 |
|
정준화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