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15 19:46
수정 : 2018.03.15 20:07
한승동의 독서무한
“우리에게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 6·25도 미국이 소련과 더불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놨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 오늘날 우리에겐 일제의 강점이 미제에 의한 분단을 낳고 분단이 동족상잔을 낳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지워져 있네.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원한을 갚음으로써 원한을 푸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네. 그렇다면 원한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묻지 마라 을해생>(푸른역사)의 저자 최이산(83·필명)이 70여년 전의 일제강점기 말, 그의 나이 열살 남짓 무렵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세월을 되짚어본 뒤에 적어 넣은 말이다. 때마침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접하고 보니 그 말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1935년 을해년에 광주에서 나고 자란 최씨는 작품에서 ‘화자’로 나온다. 학령기 이름은 가네야마 징키. 일본식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학교 입학을 허가하지 않자 광산 김씨 문중은 김인귀였던 그의 이름에서 성 밑에 관향의 지명에 들어 있는 ‘산’자를 붙여 김산(金山)을 만들고 가네야마로 읽었다. 징키는 인귀(人龜)의 일본식 음독. 일본인 교사는 “아카징키(빨간색 소독약)도 아닌데 징키가 뭐냐”고 핀잔했지만, 조선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해도 대부분 본색을 아주 잃어버리는 개명은 가능한 한 피했다. 예컨대 김씨 중엔 본관 김해를 성으로 쓰면서 가나우미로, 박(朴)씨는 그 뒤에 원(原)자를 붙여 보쿠하라로 하거나 아예 아라이라는 성을 만들었다. 아라이는 새 우물, 즉 신정(新井)의 일본식 훈독.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우물 탄생 설화를 활용해 흔적을 남긴 것. 최(崔)씨는 가산(佳山)으로 파자해 가야마로 읽었다.
저자는 이런 사연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자신이 직접 체험했거나 전해들은 구체적인 사람들과 그들의 각기 다른 사연들을 능숙하게 비벼 넣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열살 안팎 소년 시절의 이름과 사연 들을 70여년 뒤에도 그토록 생생하게 기억해내다니 경이롭다. 그 대상에는 일본인 교사, 동급생, 연정을 느꼈던 여교사, 그들의 집 등 지형지물도 포함된다.
이들 “기억 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은 내 나름의 사념과 사연들, 아내나 친구들에게도 내비치지 않았던 객쩍고 자질구레한 넋두리”의 추억은 근로동원, 사춘기의 이성, 해방전야의 상황, 전쟁으로 가는 골육상잔 속의 인물들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독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빨치산 비극의 역사를 십대 소년이 광주에서 마주친 일상사들, 그것을 달관의 경지에서 되새김질하는 80대 노인의 시선을 통해 애잔하게 때론 뭉클하게 추체험할 수 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면서 시(是)를 비(非)로, 비를 시로 분식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유력 신문사에 저항하다 쫓겨나 긴 세월 고초를 겪어야 했던 해직기자 출신의 저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핍박받아 온 피해자의 잣대로 그들(가해자)이 그동안 저질러 온 잘못을 따져, 그들로 하여금 승복케 하고 사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상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핵문제의 근본해결도 그런 과정을 거쳐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 주변국들의 교차승인 체제를 완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만남 자체를 좌파·종북의 투항, 매국으로 매도하며 반대하는 것은, 일본인 납치사건을 대하는 일본 우파의 접근방식과 닮았다. 왜 그들은 똑같이 실현 불가능한 방식에 집착할까? ‘미투(Metoo)’ 사태도 일부 정파세력은 그것이 마치 ‘좌파(진보)’만의 죄업인 양 선전하며 있지도 않은 좌파를 겨냥한다. 설사 좌파라는 그들의 수사를 수용하더라도, 위력적인 한국의 미투는 좌파가 집권했기에 비로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규제와 권위주의로 숨막히는 우파 집권 아래서 그게 가능했겠나? 남북관계 진전도 마찬가지 아닐까?
독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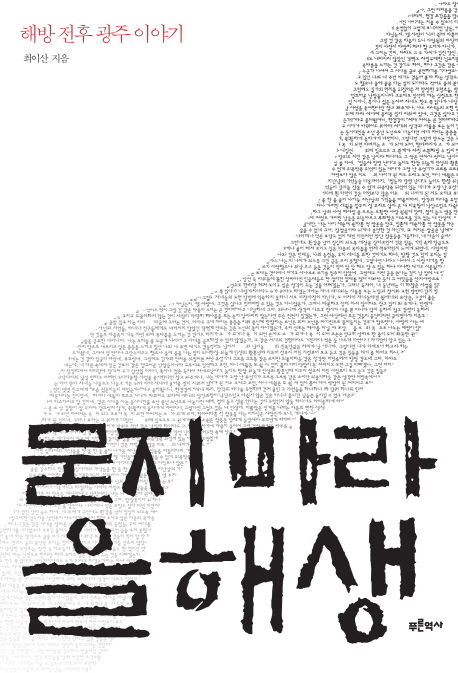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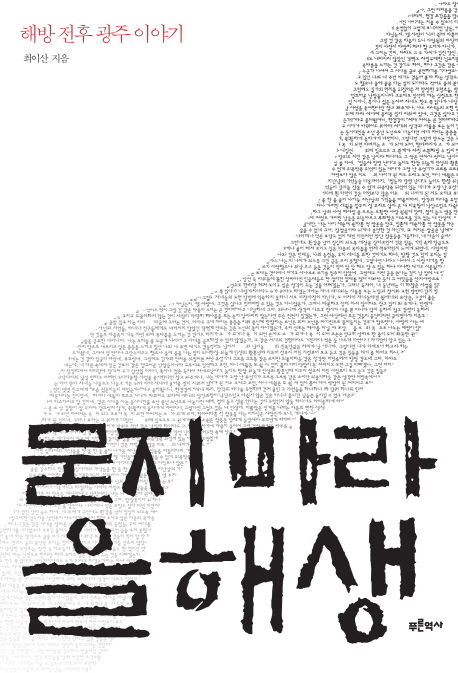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