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17 19:40
수정 : 2018.05.17 20:05
[책과 생각] 한승동의 독서무한
‘일본인 납치’ 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의 한반도·동북아 정세급변과 질서재편 논의에 일본도 참가 자격이 있다며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흔드는 카드다. 참 잘도 써먹는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평양을 전격 방문하고 북-일 국교정상화 논의에 합의한 파격 행보 때 아베는 관방부 부장관으로 동행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과 조명록 북 차수의 방미로 상징되는 빌 클린턴 정권 말기 북-미 화해·접근 연장선에 있던 북-일 화해는, 그러나 곧 돌출한 일본인 납치문제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특수기관 내 일부 인사들이 영웅주의에 빠져” 그 짓을 저질렀다며 “솔직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 고백은 분명 묵은 문제를 풀고 북-일 국교정상화로 가자는 강력한 신호였다. 북은 생존자 5명의 일본 방문도 허용했다.
일본은 그러나 그 5명을 북에 돌려보내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송환한 유골 ‘가짜 소동’까지 거치면서 북은 더욱 악당이 됐고 북일 화해는 물 건너 갔다. 그 괴이쩍은 방향 선회로 과거사의 반인륜적 ‘가해자’였던 일본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였던 북은 가해자가 되는 마술적 인식전환이 일어났다. 그 강경 대응의 중심에 아베가 있었고, 그 뒤 일본 총리가 된 그의 정치적 출세에 그 사건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해 8월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북 경수로 건설 첫 콘크리트 타설 행사가 열렸다. 그것은 6·15합의와 가속되던 북-미 화해·접근의 또 다른 징표였다.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일본인 납치문제로 멈칫했고, 그해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차관보의 방북과 고농축 우라늄 발언 소동 뒤 완전히 거꾸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건 그해 초에 출범한 조지 부시 정권의 클린턴 정권 정책 뒤집기인 ‘ABC'(Anything But Clinton)와 ‘악의 축’ 발언에서 보듯 이미 예고된 전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때 아베는 냉전 재강화 쪽으로 돌아서던 역사 수레바퀴의 역전을 재빨리 감지하고 거기에 올라탐으로써 출세 가도를 달렸다.
마치 동서 냉전 초기 ‘해방 정국’에서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노무현 정권 말기의 남북정상회담과 ‘10·4합의’는 그런 역전과 거기에 편승해 이익을 향유하며 대결을 부추기던 국내외 군·산·정·학·언 복합체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어렵사리 6·15선언 체제로 돌아가려 한 것이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그것을 다시 뒤집었다. 이후 한반도는 북의 핵 개발과 미·일 동맹의 전쟁위협에 이르기까지 대결적 퇴행으로 치달았다.
‘일본인 납치’는 북의 용서받지 못할 죄업이지만, 아베와 일본 기득권세력이 그것을 거론하는 건 그럼에도 불순하고 불길해 보인다. 그들은 지난 100년간 이웃나라들에 참화를 몰고 온 메이지 이후의 그 위험하고도 몽환적인 소아병적 자기중심 관념 속을 여전히 헤매고 있는 듯하다.
이삼성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한길사)는 청일전쟁 뒤 깨어지지 않고 있는 동북아의 ‘대분단 체제’, 즉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륙세력과 가츠라-태프트 밀약 이래의 미국·일본 동맹이 대표하는 해양세력 간의 대결구조가 남북분단이라는 소분단체제를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양분 삼아 연출해내고 있는 ‘악폐’ 때문에 근대 이후 한반도의 고난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문제는 북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륙지향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세력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로 ‘독서무한’을 여기서 끝내려 한다. 물론 그래도 독서는 계속될 것이다. <끝>
한승동 독서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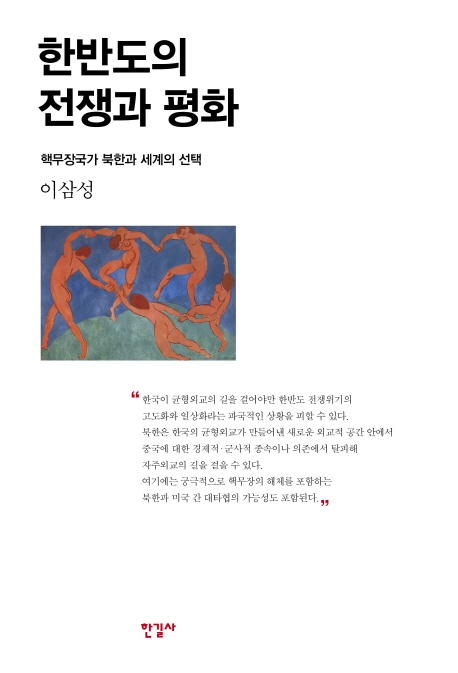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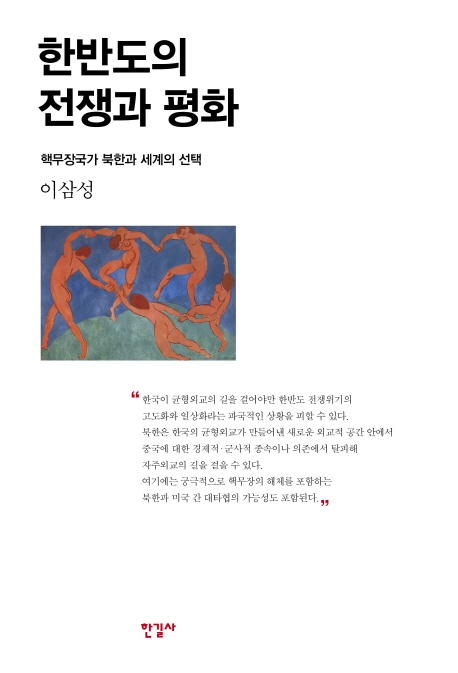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