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5.29 19:21
수정 : 2015.10.23 15:12
[토요판] 김도훈의 불편(불평)한 영화 ‘생로랑’
<생로랑>은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이 영화가 작년 칸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출품작(여기서부터 벌써 머리가 아프신 분?)이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자. 평범한 일대기를 평온하게 시간순으로 그려낸 영화는 아니라는 소리다. 그래도 이 글을 읽는 당신을 위해 평이하고 간단하게 시간순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스물한살의 나이로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수석 디자이너가 된 이브 생로랑은 본인의 이름을 딴 의상실을 파리에 연다. 사실 영화가 시작되면 이미 이브 생로랑은 대가의 위치에 올라 있고, 영화는 1967년부터 1976년까지 그의 전성기라 할 만한 시절을 주로 조명한다.
<생로랑>에는 당신이 지금껏 보아온 수많은 예술적 천재들의 일대기를 그린 수많은 영화가 그려내는 모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천재의 예술적 내면의 고통’이라는 주제 말이다. 우리는 이미 예술적 천재들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살인적인 고뇌 앞에서 울부짖으며 예술적 자아를 폭발시켰는가를 충분히 영화로 보아왔다. 그 고뇌에 ‘메소드 연기’의 고뇌를 덧붙여서 얼마나 많은 배우들이 오스카상을 받거나 오스카상 후보에 오르거나, ‘부당하게 오스카 후보에 오르지 못한 배우 리스트’에 올랐던가 말이다.
<생로랑>도 마찬가지다. 이 시간을 넘나드는 영화 속에서 생로랑은 디자인을 하고, 옷을 만들고, 마약을 하고, 명성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고, 파트너와 섹스하고, 파트너 몰래 방탕한 남자와 섹스하고, 그러다가 파트너가 알게 됐는데도 섹스하고, 섹스를 하면서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면서 섹스를 하고, 그러다가 또 옷을 만들고, 옷 만드는 짓을 때려치우겠다며 울부짖으며 마약을 하고 섹스를 하고, 하여간 그러다가 또 옷을 만든다. 그런데 이 예술적인 자아로 넘치는 대상을 예술적인 자아로 넘치는 감독이 그려낸 예술적인 자아로 넘치는 영화를 보다가 나는 갑자기 속이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특히 나는 가스파르 윌리엘이 연기하는 이브 생로랑이 더이상 옷 따위 만들지 않겠다고 신경질을 부리며 징징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다.
아, 물론 나는 이브 생로랑을 사랑한다. 이 브랜드를 사랑한 나머지 몇 벌의 꽤 비싼 옷도 구입했다. 너불버불한 티셔츠 쪼가리를 20여만원의 돈을 주고 살 만큼의 생로랑에 대한 애정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일단 말해두고 싶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말이다. 나는 생로랑의 그 예술적 고뇌와 고통에 도무지 감정을 이입할 수가 없었다. 고통? 나는 어제 극심한 감기몸살에 걸린 채 <허핑턴포스트>의 메인 기사에 쓸 카피를 한시간 넘게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속이 뒤틀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걸 예술의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을뿐더러, 이걸 영화화할 생각 따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 진짜 고통은 아니니까. 그런데 영화 <생로랑>은 심지어 그의 가장 화려한 시절마저 예술적 고독과 탐미적 분쟁 사이에서 고통받던 한 예술가의 가장 어둡고 위태로운 시절인 양 그려낸다. 아, 이거 어째 좀 부당하지 않은가 말이다.
고통받는 예술가에 대한 우리의 뒤틀린 애정은 언제나 확고하다. 우리는 어딘가 조금 불행하게 살다가 간 예술가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다 가야만 진정한 예술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인생의 굴곡이 없는 예술가들의 일대기라면 영화로 재생산할 가치는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살다 간 예술가들의 인생만 영화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걸 소비하고, 또다시 고통받는 진정한 예술가상이 견고하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생로랑이 무슨 고통을 받았는데? 그는 일찍 성공한 남자였고, 군대에서 조금 고초를 겪긴 했지만 성정체성을 공격하는 업계에서 일한 것도 아니었고, 일찍 돈을 벌어 백만장자가 됐으며, 평생 곁을 지킨 (그리고 다른 남자와 섹스하는 것도 모조리 다 봐준) 파트너와 살았다.
내가 영화감독이라면 생로랑이 아닌 위베르 드 지방시에 대한 전기영화를 만들겠다. 위베르 드 지방시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직물공장을 경영하던 외할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부를 물려받았고, 시작부터 발렌시아가 같은 당대의 패션 대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며, 오드리 헵번의 절친으로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브리나> 등 헵번의 영화 의상을 디자인하며 국제적인 유명세와 부를 거머쥐었다. 그에게는 인생의 굴곡이라곤 손톱 끝에 낀 때만큼도 없었다. 나는 오히려 지방시처럼 평화롭고 여유로운 인생을 마음껏 탈 없이 즐기면서도 무언가 대단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남긴 사람들의 인생이 궁금하다. 그들이 예술로 벌어들인 엄청난 부를 즐기면서 살았던 모습을 스크린에 재현한 뒤 솜사탕을 들이마시듯이 즐기고 싶다. ‘알고 보니 그에게도 예술적 내적 고통은 있었네’라는 구질구질한 대리 변명은 완전히 집어치우고 말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간지나 시사주간지의 카피는 ‘거기에도 사람이 있었네’다. 당연히 사람이 있었겠지. 지구는 인간으로 포화상태고, 사람은 지구 어디에나 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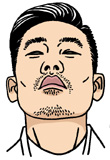 |
|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기 며칠 전 지금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음반을 파는 팝계의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말했다. “팝스타로 사는 건 솔직히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지. 물론 유명한 예술가와 스타들 역시 나름의 고충은 있을 테지만, 그 직업으로 수백만달러를 손에 쥘 수 있다면야 그건 솔직히 ‘고통’으로까지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사실 당신의 엄마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나.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일이 유명인 걱정이라고. 영화도 걱정이 너무 많다.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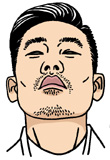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