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화 <쥬라기 월드>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공룡들은 컴퓨터그래픽(CG)으로 창조한 가상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보는 사람의 가슴을 친다. 영화 속 아파토사우루스를 특수효과 담당자들이 손보는 모습. 유피아이코리아 제공
|
[토요판] 김도훈의 불편(불평)한 영화
‘쥬라기 월드’
아직도 1993년의 극장에 앉아서 <쥬라기 공원>을 처음 봤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두 발로 일어서서 포효하는 장면을 기억하는가? 그 순간을 극장에서 봤다면 당신은 영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시지(CG·컴퓨터그래픽) 시대의 개막’을 목도한 것이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스톱모션, 고모션, 애니메트로닉스 등 전통적인 특수효과의 시대는 순식간에 저물었다. 모두가 컴퓨터를 붙잡고 시지라는 놀라운 발명품에 몰두했다. 나는 시지 회의주의자는 아니다. 시지는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많은 자유를 선사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시지가 그다지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영화는 오히려 상상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말이다.
며칠 전 <쥬라기 월드>를 봤다. 꽤 즐거운 영화였다. 왜냐면 이건 거의 완벽할 정도의 복고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복고를 좋아한다. 60이 된 당신에게 복고란 아마도 <대부>를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순간이겠지만, 나에게는 <쥬라기 공원>을 처음으로 봤던 순간이 바로 복고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복고가 있다는 소리다. 하여간 <쥬라기 월드>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쥬라기 공원>을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영화나 마찬가지였다. 대신 모든 것이 더 커졌고, 모든 것이 더 번드르르해졌다. <쥬라기 공원>과 <쥬라기 월드>의 차이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월드의 차이와 비슷하다. 두 놀이동산을 가보지 못했다고? 나도 못 가봤다. 한국식으로 바꾸자면 용인 자연농원과 에버랜드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하다.
여하튼 <쥬라기 월드>에서 가장 놀라운 건 공룡이었다. 20여년의 차이는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시지는 발전했다. 이제 거대한 아이맥스 화면으로도 공룡과 인간 캐릭터가 얽히는 장면에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다. 문제는 바로 그 ‘거의’다. ‘없다’와 ‘거의 없다’는 거의 차이가 없는 표현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완벽하게 다른 표현이다. ‘나는 돈이 없다’와 ‘나는 돈이 거의 없다’가 전혀 다른 표현인 것처럼 말이다. 나는 돈이 없다는 정말 돈이 없다는 소리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돈이 거의 없다’고 말할 때, 그에게 있는 돈은 백만원일 수도 있고 십억일 수도 있다. ‘거의’는 대단히 자의적인 표현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왜냐면, 내가 ‘원고 거의 다 썼어요’라고 말할 때 그건 ‘아직 하나도 안 썼지만 편집자를 분노하게 만들 순 없으니 이 순간이라도 모면해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시 ‘거의’의 문제로 돌아가자. 여전히 시지 공룡들은 거의 진짜 같다. 물리적인 현실감이 완벽하게 느껴지지는 않을뿐더러,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시지일 뿐이라는 정서적 이물감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한다. 다행히도 <쥬라기 월드>의 제작진은 스필버그가 만든 <쥬라기 공원>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쥬라기 공원>은 시지 시대의 개막을 알린 영화였음에도, 스필버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아날로그 특수효과를 활용했다. 배우들과의 근접촬영에서 사용된 공룡들은 거의 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접 만든 실제 크기 모형들이다. 심지어 티라노사우루스까지 말이다. 왜냐면 그게 더 자연스럽고, 그게 더 현실적이며, 그게 더 완벽에 가까우니까.
<쥬라기 월드>에서 내가 가장 좋아한 장면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특수효과를 사용한 장면이다. 주인공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공룡에게 학살당한 아파토사우루스들에게 다가가고, 고통으로 울부짖는 한 마리의 머리를 쓰다담으며 운다. 이 장면의 아파토사우루스는 시지가 아니다. <쥬라기 월드>의 특수효과 장인들은 3디 모델과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거대한 아파토사우루스를 실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시지로 창조한 공룡들이 등장하는 장면보다 훨씬 더 보는 사람의 가슴을 친다. 왜냐면, 그건 어떻게 보더라도 배우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공룡이었으니까. 그 로봇 아파토사우루스는 인간 배우와 눈을 마주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 로봇처럼 관습적인 연기를 하던 배우들 역시 이 장면에서는 현실적인 감정의 교류를 보여준다.
지금 할리우드에는 몇몇 고집스러운 ‘전통적인 특수효과의 신봉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간이 크리스토퍼 놀런이다. 그는 영화 속 스펙터클을 진짜 물리적인 특수효과로 창조한다. 그는 <다크 나이트>에서 실제로 트럭을 뒤집어엎었고, <다크 나이트 라이즈>에서는 배트맨이 타고 날아다니는 ‘배트윙’을 크레인에 매달고 실제로 찍은 다음 시지로는 와이어만 살짝 지워냈고, <인셉션>의 360도로 돌아가는 호텔 복도 액션 장면은 진짜 돌아가는 복도를 세트로 만들어서 찍었다. <인터스텔라>는 더 강박적이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 ‘타스’ 기억하시는가? 그거 특수효과 담당자가 실제 크기의 로봇 모형을 직접 조종하며 촬영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인터스텔라>를 보며 ‘시지가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의 생각은 옳다. 왜냐면 그건 시지가 아니라 진짜였으니까. 놀런은 아직까지 시지가 아날로그 특수효과만큼의 현실감을 관객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로는 지나친 똥고집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놀런의 시지에 대한 불신은 옳다. 다시 말하지만 ‘거의 완벽한 것’은 ‘완벽한 것’과는 다르다.
나는 시지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다. 시지는 근사한 선물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지가 ‘남용’할 만큼 근사한 선물은 아직 아니라는 거다. 영화잡지에서 일하던 시절, 괴물이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던 특수효과 담당자들을 만난 적 있다. 영화 속 괴물은 모형 없이 모두 시지로 만들 것이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현실적으로 창조할 자신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사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할리우드도 해내기가 거의 힘듭니다. 스필버그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클로즈업 장면 등에 사용할 실물 크기의 애니메트로닉스 모형은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는 이 질문을 당연히 물어보지 못했다.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내려 기를 쓰는 한국 특수효과 장인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그들의 자신감을 눈앞에서 깎아내릴 만큼 되바라진 인간은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개봉한 영화를 보고 탄식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건 탄식이 아니었다. 나는 배우들과의 클로즈업 샷에서 어떠한 공포도 위협도 느껴지지 않는 시지 괴물을 보며 실실 쪼개고 있었다. 나는 그게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일종의 조롱이라는 걸 깨달았고, 곧 슬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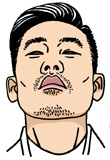 |
|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