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화 <투모로우랜드>는 브래드 버드 감독의 유년 시절 일기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왜 내가 그의 개인적인 꿈을 보기 위해 1만원을 결제해야 하냐는 비통함이 들고 말았다.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제공
|
[토요판] 김도훈의 불편(불평)한 영화
<투모로우랜드>
올해의 망작을 보았다.
나는 브래드 버드 감독의 <투모로우랜드>를 누구보다도 기대했다. 브래드 버드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장편 애니메이션 중 하나일 <아이언 자이언트>를 만든 뒤 픽사로 건너가 <인크레더블>을 내놓고, 실사 영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을 만든 남자다. 하지만 영화는 망했다. 1억8천만달러의 제작비와 1억5천만달러의 마케팅 비용을 들인 ‘투모로우랜드’는 제작사인 디즈니에 거의 1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남기고 망했다. 뒤늦게 영화를 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투모로우랜드’에는 브래드 버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다. 1950년대 잡지들에 실린 일러스트 같은 미래 도시의 풍광, 더없이 미국적인 낙천주의 등. 한 인터뷰에 따르면 브래드 버드는 이 영화를 ‘아주 개인적인 프로젝트’라고 표현했다.
그게 문제였다. 당신은 200달러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할리우드 1급 감독이라면 3천만~4천만달러짜리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2억달러의 예산으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다. 물론 저기서 ‘개인적인 프로젝트’라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젝트’라는 의미도 들어 있었겠지만, ‘투모로우랜드’를 보고 있으면 브래드 버드의 유년 시절 꿈을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놓은 일기장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왜 내가 그의 개인적인 꿈을 보기 위해 1만원을 결제했어야 하냐는 비통함이 들고야 마는 것이다.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은 예술적 자유와 지원을 보장받은 앞날이 창창하던 예술가들의 역사적인 망작 리스트가 있다. 그 기원은 아마도 마이클 치미노의 <천국의 문>일 것이다. 1980년으로서는 무시무시한 제작비인 4400만달러가 투입된 이 웨스턴 사극은 완전히 망했다. 많은 이유들이 제기됐는데 그중 하나는 감독의 독단적인 제작 행태였다. ‘디어 헌터’를 만든 치미노에게 지나친 예술적 자유를 주고 방기한 유나이티드 아티스츠사의 탓도 있을 것이다. 아, 이 영화가 망한 여파로 유나이티드 아티스츠는 엠지엠(MGM)에 합병되어 사라졌으니 죗값은 충분히 치렀다.
레니 할린의 <컷스로트 아일랜드>는 1억달러에 가까운 돈을 들인 해양 블록버스터였는데 겨우 1천만달러를 벌면서 망했다. 제작사인 캐롤코도 도산했다. <다이하드 2>와 <클리프 행어>로 기세등등하던 레니 할린의 경력 역시 추락했다. 1억달러나 들일 필요가 없는 영화였으나 제작사는 직접 배를 띄워서 로케이션으로 찍겠다는 레니 할린의 야심을 막아세우지 않았다. <매트릭스>로 승승장구했던 워쇼스키 남매는 <스피드 레이서>로 1억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남기고 침몰했다. 나는 이 영화를 꽤 좋아하지만, 내가 제작자라면 1억2천만달러를 쏟아부어서 일본 아니메에 바치는 실험영화를 만들 예술적 자유를 감독들에게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리스트는 계속된다. 폴 버호벤의 <스타쉽 트루퍼스>는 이를테면 ‘세상에서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 영화’ 중 하나인데, 이 영화의 실패는 폴 버호벤 경력을 거의 아작내버렸다. 2억달러짜리 블록버스터를 찍으면서 버호벤의 그 (미국 대중에게 이해받기에는 좀 지나치게 나아간 유럽식) 전체주의 풍자정신을 그냥 내버려둔 스튜디오의 책임이 크다. 물론 나로서야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좋아하니까 개인적인 손해는 전혀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존 박이 말한 바 있는데, 사실 세상에서 더 쓸데없는 짓은 할리우드 제작사 걱정일 것이다.
다만 마지막으로 1980년도의 스티븐 스필버그 이야기를 좀 해보자. <죠스>와 <미지와의 조우>로 승승장구하던 젊은 시절의 스필버그는 2차대전 코미디 <1941>을 만들었다. 스필버그의 불어나는 예술적 욕심을 누구도 통제하지 못한 탓에 제작비는 점점 불어났고, 결국 당대로서는 압도적인 예산이 투여됐고, 결국 장렬하게 박스오피스에서 전사했다. 여기서 교훈을 얻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이듬해 스필버그는 제작자 조지 루커스의 프로젝트였던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참여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가장 스필버그답지만 가장 조지 루커스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 ‘고용 감독’ 스필버그의 영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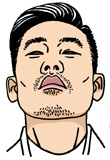 |
|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