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흑인 여성 뮤지션인 니나 시몬의 전기영화 <니나>에 조이 살다나가 주연을 맡으면서 미국에서는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인종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니나는 역사상 최고의 여성 재즈 뮤지션이자 최고의 흑인 인권운동의 아이콘이었다. 제작사가 공개한 <니나> 트레일러의 한 장면.
|
[토요판] 김도훈의 불편(불평)한 영화
니나
지금 할리우드를 가장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영화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다. 빌리 홀리데이, 줄리 런던, 엘라 피츠제럴드 등과 함께 역사상 최고의 여성 재즈 뮤지션 중 하나로 칭송받는 니나 시몬의 전기 영화 <니나>다. 문제는 캐스팅이다. 많은 흑인들이 니나 시몬을 연기한 여배우의 외모를 지적하며 이것이 할리우드의 인종주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 여배우는 <아바타>와 <스타 트렉>에 출연한 조이 살다나다.
당신이 만약 조이 살다나라는 배우를 이미 알고 있다면 지금쯤 많이 혼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다. 니나 시몬도 흑인이고, 조이 살다나도 흑인이잖아. 그런데 대체 왜 그녀를 니나 시몬 배역으로 캐스팅한 것이 인종주의라는 거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겠다. 미국 흑인들이 <니나> 예고편이 나오자마자 일제히 분노를 소셜미디어에서 터뜨리고 나온 건 조이 살다나가 충분히 검지 않아서다.
여기까지 글을 읽어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조이 살다나는 라틴 피가 조금 섞인 흑인 배우이고, 피부색은 조금 옅은 편이다. 코는 오뚝하다. 니나 시몬은 피부가 매우 검었다. 그리고 코가 뭉툭했다. 그래서 조이 살다나는 짙은 갈색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가짜 코를 붙인 뒤 니나 시몬을 연기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니나 시몬은 음악을 통해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던 인물이며, 검은 피부와 고슬고슬한 아프로 헤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흑인의 프라이드를 의미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조이 살다나는 어쩌면 지나치게 아름답거나, 덜 흑인적이다.
쏟아지는 공격에 대해 조이 살다나는 “내가 이 역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안다”고 말하며 “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클레오파트라 역에 잘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가에겐 색도 젠더도 없다. ‘피부색이 짙고 상징적인 흑인을 연기하도록 핼리 베리 닮은 사람을 골랐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한 문제다”라고 항변했다. 같은 흑인 여배우들도 조이 살다나의 변호를 시작했다. 퀸 라티파는 “조이 살다나 역시 아프리카계다. 그녀가 니나 시몬을 연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폴라 패튼은 “영화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판은 그만두고 살다나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했다. 제작자들은 “누군가가 ‘충분히 흑인인지’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것은 정치적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 논쟁의 새로운 가지다. 정치적 공정성과 다양성은 지난해와 올해 할리우드 영화계의 가장 거대한 이슈 중 하나였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슈고, 심지어 지나치게 늦은 문제제기다. 할리우드는 비백인 배우들에게 제 몫을 돌려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배우라는 창조적 예술가들의 몫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게이샤의 추억>에서 왜 중국인이 일본인을 연기하냐는 불평에 양자경(양쯔충)이 “나는 배우니까”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상기해보자. 니콜 키드먼이 가짜 코를 달고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했던 <디 아워스>와 조이 살다나가 가짜 코를 단 <니나>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가?
니나 시몬 영화가 유독 논쟁이 되는 이유는 그녀가 흑인 인권운동의 아이콘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니나 시몬은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비틀거리던 불안한 영혼이었다. 상승과 추락의 드라마로 가득한 자기파괴적인 디바였다. 그런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스타 파워를 지닌 흑인 여배우가 필요하다. 원톱으로 투자를 받고 흥행을 끌어낼 수 있는 대중적인 흑인 여배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여전히 드물다. 조이 살다나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정도 규모의 니나 시몬 전기 영화를 보기 위해 앞으로 몇십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차라리 몇십년을 기다렸어야 옳았던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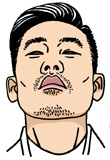 |
|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장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