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년들이 조국을 지옥이라 부르는 건 칭얼거림이 아니다. 청년세대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려 자기계발하고, 스펙을 쌓는 데 온갖 노력을 한다. 문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조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 1월14일 서울 동작구 한 취업준비 학원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
야당에 실망한 서민들 ‘강북 우파’로 자리잡아
긴 머리도 짧은 치마도 금지했던 ‘박정희 향수’에 빠져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3)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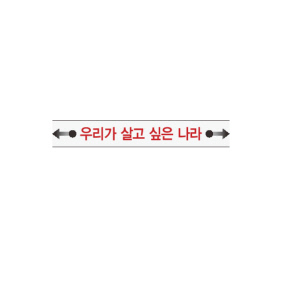 |
대기업만 부자 되는 ‘비정상 구조’ 누가 지금의 ‘헬 조선’ 만들었는가
정치인·관료·기성세대가 장본인 누가 불평등한 한국 바꿀 것인가
청년세대 중심 되면 세상 바뀐다 한국전쟁 이후의 발전과정이란 항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더 잘되었던 희망의 시간이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30, 40대 때부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왔고 아직도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보수화된 기성세대들은 경제가 어렵거나 사회갈등이 높아질 때마다 ‘그 좋았던 옛날’ 박정희 향수에 젖는다. 또한 진보를 자처하는 기성세대들도 세상을 아직도 민주와 반민주, 노동과 자본의 이념적 대결구도로 말한다. 보수 기성세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워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없었다. 그들은 국민소득 2천달러의 박정희 시대 방식으로 지금의 3만달러에 육박하는 시대를 절단하고 있다. 아직도 정부가 라면 값, 커피 값, 소주 값을 정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길거리에서 장발, 미니스커트 길이를 단속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계획과 규율의 덕목으로 자율과 창의를 끌어내려는 희극을 반복하고 있다. 보수의 이념이 재벌과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법 탈법과 갑질과 비정규직 양산을 지키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박정희 시대의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자가당착이다. 진보 기성세대도 ‘그 옛날의 향수’에 젖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독재에 억눌린 노동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웠고, 아이티(IT) 창업자로 신화를 만들었으며, 정치에 뛰어들어 정권까지 잡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잠깐의 신화에 그치고 말았다. 노동조합이란 억대 연봉에 육박하는 소수의 재벌기업, 은행, 공기업에서만 작동할 뿐이다.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노조결성률은 2%에 불과하다. 그런 중소기업에서 자본 대 노동의 이념 대립과 갈등을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생뚱맞은 것이다. 아이티 창업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 등극한 신기업들도 후배 창업자의 길라잡이가 되기는커녕 재벌 흉내 내기에 바쁘다. 민주화 투쟁 정신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싸가지 없는’ 언사로 자기과시에는 성공했을지언정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게을렀다. 만약 진보 정치인들이 억울하다면 성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들조차 보수세력을 자처하는 강북 우파가 된 모순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섭섭하겠지만 기성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와 별반 관계없이 그들의 자식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천지개벽했다. 기성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불평등한 한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해졌으며, 적어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기성세대는 아니다. 아직도 자신의 과거에 머물러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너무 영민해져 버린 기성세대는 자기 자식의 미래에는 노심초사할지언정 자식세대 전체의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보려 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이제 그만 청년세대들에게 공포 마케팅을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그들에게 되묻고 싶다. 마케팅을 그만두려면 공포가 먼저 없어져야 할 것 아닌가. 다시 청년세대들에게 ‘멘토질’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야 한다. 기성세대들도 젊었을 때에 한국의 변화를 주도했었다. 그 주도란 별 대단한 것이 아니며, 시작점은 그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보고자 맨땅에서 산업을 일으켰으며, 독재란 옳지도 않고 불편했기 때문에 저항했고, 배웠기 때문에 컴퓨터를 만졌다. 그런 것들이 시대를 주도한 것이다.
 |
|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