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8 14:47
수정 : 2016.09.28 15:00
정치BAR_보좌관 Z의 여의도 일기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머슴이 되고픈 의원의 손과 발과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보좌관입니다. 정치부터 정책까지 의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현장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익명의 여러 보좌관들이 보고 듣고 느낀 ‘정치의 속살’을 전합니다.
 |
|
2014년 6.4 지방선거 후보를 알리는 펼침막이 내걸린 서울 구의동 지하철 2호선 강변역앞 건널목에서 퇴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원들이 후보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고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다. 이러다 보좌관으로 장기근속하게 될까 두렵기도 하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20년 공무원 생활’을 목표로 하는 선후배 보좌관들을 가끔씩 봐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는 끝내 그런 ‘인내심’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런데 어느덧 10년하고도 한참이 더 흘렀다.
그동안, 동네 구의원 선거에서부터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통반장 선거 빼놓고 웬만한 선거는 다 치러봤다. 선거에 임하는 이상 그게 무슨 선거가 됐든 선거는 일단 이기고 볼 일이고, 그렇게 숱한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는 전적으로 테크닉으로 받아들여졌다. 선거법이 정하는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과태료 범위 내에서 비방과 선동, 마타도어는 오히려 ‘이기는 기술’로 받아들여졌다.
선거가 테크닉이 되어가는 동안 ‘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나조차 상대적으로 옅어졌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문득문득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은 마음 한 구석에 늘 남아있었다.
처음 치른 ‘내 선거’…공약도 정책도 헛것
직업적 차원의 정치 실무를 경험하면서 나는 같은 생각,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동지’가 늘 그리웠다. 한때 동지적 의리를 지킬 만한 누군가를 만났는가 싶었지만, 그도 몇 년이 지나 그 다음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낙향했다.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와는 처음부터 마음이 잘 맞지 않았다. 그렇게 어느덧 나도 ‘생계형 보좌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음 맞는 정치인이 있었다면, 굳이 ‘내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생각은 안했을지 모른다. 나는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후배 보좌진을 만날 때면 늘 같은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스스로를 진영에 가둬두지 마라.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부를 감싸고 돌 일도 없고, 야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행정부를 까고 볼 일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이다. 진영을 떠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다. 눈치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과 양심을 속이지 마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고, 의원들 대다수가 계파와 파당을 나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데 몰두하는 만큼, 보좌진들 스스로도 그러는 경우가 많았다.
긴 고민 끝에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 나는 바로 깨달았다. 이념과 가치는 말 그대로 뜬구름잡는 이상에 불과했고, 현실은 든든한 뒷배경과 소위 ‘라인’이 중요했다. 공천 경쟁에 임하는 동안 돈과 ‘빽’에 대한 이야기는 주변에서 넘쳐났다. 정책이나 공약 따위는 아예 필요하지도 않았다.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는 일보다 ‘윗분’들의 간택을 받는 게 중요했다. 나름대로 지역 정치판에서 좀 놀아봤다는 양반들은 하나같이 ‘누가 누구 라인인지’를 궁금해 했다. “누구는 누구 빽이라던데” 하면서 정작 후보로 나선 이들보다 그 ‘빽’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놓고 승패를 예견하곤 했다.
나도 전직 당 대표와 같이 사진을 찍고, 그 계파의 중간보스급 의원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날 때면 슬쩍슬쩍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들을 나눠주며 나름의 ‘빽’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의 여론을 움직인다는 이 닳고 닳은 양반들은 남다른 계산법으로 ‘빽줄’의 무게를 저울질하곤 했다. 평소 적당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닥 가까운 친분이 있지는 않았던 어떤 분이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서운하고 의아한 마음이 앞섰는데, 결국 그가 말하는 결론이 ‘누구 빽이 더 좋을 거다’라는 데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씁쓸해하기도 했다.
여의도로 다시 돌아왔지만 나는 ‘동지’가 그립다
사실 나도 알고는 있었다. 게임의 룰을 알고 있었기에 공정한 게임이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나도 연줄, ‘라인’을 잡는 데 더 주력했는지 모른다. 정치판이 들썩들썩 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의 조합과 그 틈새로 돌출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들, 그 계산을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도박같은 게임판에서 나도 나름대로 괜찮은 줄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확실한 줄을 잡은 이들이 있었다. 결국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 사실 그리 안타깝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다음에 더 튼튼하고 확실한 줄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너무도 쉽게 현실과 타협했다.
그렇게 한바탕 푸닥거리를 마치고, 나는 다시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복귀했다. 이제는 ‘줄’을 찾는 건지 ‘동지’를 찾는 건지, 나 스스로도 살짝 헷갈린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동지’를 그리워한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여전히 후배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마음 맞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내 선거가 아니더라도 그를 통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좋겠다.
돌고 돌아 여의도로 복귀한 한 보좌관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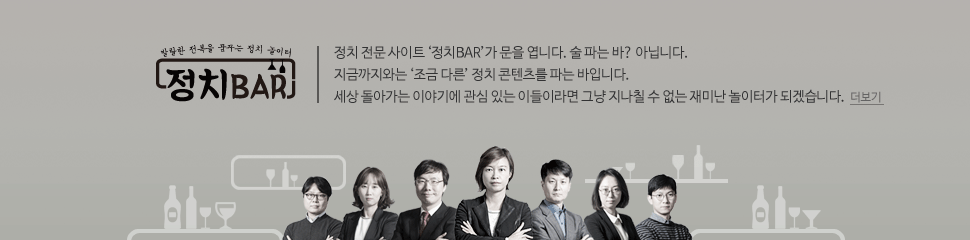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