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s ES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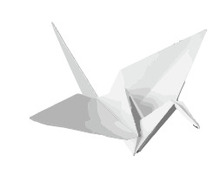 |
삼십대/심보선
나 다 자랐다, 삼십대, 청춘은 껌처럼 씹고 버렸다, 가끔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을 기적이라 믿지 않았다, 다만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전화질이나 해댈 뿐, 뭐 하고 사니, 산책은 나의 종교, 하품은 나의 기도문, 귀의할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공원에 나가 사진도 찍고 김밥도 먹었다, 평화로웠으나, 삼십대, 평화가 그리 믿을 만한 것이겠나, 비행운에 할퀴운 하늘이 순식간에 아무는 것을 잔디밭에 누워 바라보았다, 내 속 어딘가에 고여 있는 하얀 피, 꿈속에 니가 나타났다, 다음 날 꿈에도, 같은 자리에 니가 서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너랑 닮은 새였다(제발 날아가지 마), 삼십대, 다 자랐는데 왜 사나, 사랑은 여전히 오는가, 여전히 아픈가, 여전히 신열에 몸 들뜨나, 산책에서 돌아오면 이 텅 빈 방, 누군가 잠시 들러 침만 뱉고 떠나도, 한 계절 따뜻하리, 음악을 고르고, 차를 끓이고, 책장을 넘기고, 화분에 물을 주고, 이것을 아늑한 휴일이라 부른다면, 뭐, 그렇다 치자, 창밖, 가을비 내린다, 나 흐르는 빗물 오래오래 바라보며, 사는 둥, 마는 둥, 살아간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