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esc] 마포 김사장의 찌질한 사생활
아버지가 생일선물로 준 상품권을 쓰지 못한 엄마의 비밀
 |
|
한참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끝내 구두를 사지 않았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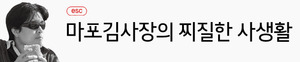 |
오래 구두를 바라보던 그녀가
그냥 빈손으로 가게를 나왔다
왜 안 샀냐 물어도 웃기만 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금도 그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종로2가에서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금강제화 매장이 하나 있었다. 삼층인가 사층짜리 건물 전체에 구두가 진열돼 있었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직원들이 손님만큼이나 많았던 곳이다. 엄마와 나는 추위에 곱은 손을 꼭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환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멀끔하게 생긴 청년 한 명이 살갑게 인사를 하더니 “뭐 찾으시는 거 있습니까, 손님” 하고 물었다. 나비넥타이를 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닐지도 모르겠다. “우리 엄마 신발 사러 왔어요”라고 내가 대뜸 말하자 그는 씩 웃으며 엄마를 소파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모양의 구두를 보여주었다. 구두를 구경하던 엄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돌리니 마침 창밖에는 슬슬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엄마 멀었어? 나 배가 몹시 고파.”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은데. 우동. 그래? 알았어.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말은 그랬지만 조금 기다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뜸 들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압력밥솥 같은 표정으로 구두 하나를 들고 아까부터 고심하는 기색이었거든. 나야 구두가 예쁜지 안 예쁜지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알 턱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었다. 그냥 사면 될걸 왜 망설이는 건지. 얼른 우동이나 먹으러 갔으면 좋겠구먼. 어라, 근데――, 한참을 망설이던 엄마가 “미안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하고 직원한테 인사를 하는 거다. “왜, 엄마?” 내가 물었지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고 빈손으로 매장을 나섰다. 아까 그거 왜 안 샀냐고 또 물어도 웃기만 하셨다.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 들러 우동을 먹었다. 김밥도 주문하고 소주도 한잔, 은 아니고 사이다를 시켰다. 그게 전부 얼마였을까. 짜장면이 600원이었으니까 다해 봐야 3천원 정도였겠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건 자정 즈음이었다. 아버지가 퇴근 전이라 나는 안방에서 티브이(TV)를 봤다. 그러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아니, 잠들락 말락 했는데 문득 엄마가 이모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목소리는 나직했고 나도 잠결이어서 전부 또렷하게 들렸던 건 아니다. 다만 한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엄마가 왜 구두를 안 샀는지. “글쎄, 내가 상품권이랑 만원짜리 한 장 들고 나갔거든. 근데 맘에 드는 구두를 사고 나면 차비뿐이 안 남지 뭐니.(웃음) 홍민이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구두를 사면 딱 차비만 남잖아. 쯧, 그래서 안 샀어. 담에 사지 뭐. 그래, 고마워. 형부는 아직 안 들어왔지. 별일 없으면 내일 밥이나 먹으러 와라 얘.” 한데 참 이상하지. 그날 잠결에 들었을 때는 그 말에 전혀 감흥이 없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서 언젠가 명절에 그 일이 생각나더라. 실은 형제들이 돈을 모아 그달에 엄마 환갑기념 해외여행을 보내드렸거든. 그 돈 마련하느라 이번달에 적자라며 엄살을 떠니까 엄마가 농담처럼 그렇다면 내 생일에는 키높이 신발을 사준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랑 손을 잡고 구두를 사러 간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던 거다. 환한 조명을 받으며 진열된 갖가지 색깔의 구두들과, 포장마차에서 먹은 가락국수의 얼큰한 냄새와, 나직하게 웃으며 통화하는 엄마의 목소리와, 무엇보다 당신이 한참 동안 들고 쳐다본 구두, 그런 것들이 말이다. 상품권에 적힌 금액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단돈 3천원이 ‘모자라’ 사지 못한 구두를 엄마는 나중에 샀을까. 물어봐도 되지만 그런 걸 물어본다는 생각만으로도 어쩐지 낯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서 관뒀다. 그냥 올해 엄마 생일에는 구두를, 아니지, 구두상품권을 사드리자고 마음먹었다. 이번엔 예쁘고 비싼 걸로 사, 엄마.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80년대 ‘책받침 스타들’ 화보 우릴 설레게 했던…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화보 사람 잡는 키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