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28 19:44
수정 : 2016.09.29 12:02
[매거진 esc] 마포 김사장의 찌질한 사생활
나를 찜한 이웃 ‘어느 여자분 어머니’께 드리는 글
 |
|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한 장면. 쇼박스 제공
|
북스피어 출판사가 망원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건 지금으로부터 육 년쯤 전의 일이다. 2009년에는 학동역에 있었다. 고작 한 해를 겪었을 뿐이지만 강남은 역시 나 같은 인간이 살기엔 불편하다는 걸 적잖이 체감했다. 당구비며 밥값이며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당시에 나는 마티즈를 몰았는데 주차장은 어디든 외제차 일색이어서 차를 댈 때마다 송구한 기분이 들었을 정도다. 무엇보다 머리가 아팠던 건 임대료였다. 처음 몇 달은 어찌어찌 버텼지만 일이 공교롭게 되려고 그랬는지 여름내 책은 잘 안 팔렸고, 연말이 되자 임대료까지 밀리는 지경이 됐다. 더는 곤란하다 여기고 이사하기로 마음먹은 건 이듬해 봄이었다.
이왕이면 겨울마다 발이 시린 사무실 말고 오피스텔이 어떨까 싶어서 마포 쪽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보았다. 신촌까지 발품을 팔았지만 보증금은 그럭저럭해도 월세가 비쌌다. 파티션 쳐진 사무실을 얻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려던 차에 내가 사 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이사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시차가 보름 정도였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다.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은 이 아파트에서 내가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괜찮을까. 직원들이 반대하면 포기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다들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일단 마포구청역에서 내리면 구보로 이십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농담이 아니다. 방금 재봤다. 버스 정류장은 더 가까웠다. 내부순환로와 자유로가 코앞이어서 거래처에 갈 때도 용이했다. ‘삼 보 이상 승차’를 지향하는 본사 직원들의 입맛에 딱 맞았다고 생각한다. 밤에는 주거지로 바뀌니까 야근은, 뭐 종용하지도 않겠지만,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직원들이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으면 힘들 텐데” 하고 나를 걱정해 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임대료를 아끼는 대신 그게 걸리긴 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문제 없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어 지내보니 출퇴근 시간을 아껴 수영장에 다닐 수 있어 좋았다. 애당초 티브이(TV) 시청 말고는 생활이랄 것도 없어서 육 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대충 잘 살고 있다.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건 침실에서 건넌방으로 출근하니까 복식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옷이라곤 남방과 후드티 몇 장이 전부여서 출근할 때마다 꽤 힘들었는데 추리닝 입고 업무를 보니 능률이 쑥쑥 올랐다. 없던 아이디어도 생겼다고까지 하면 과장이지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이런 보헤미안적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긴 건 관리소장이 바뀌고 나서였다. 이 아파트는 단지가 하나뿐이라 들고 나는 사람이 쉽게 눈에 띄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파트 밖으로 나갈 때마다 관리소장과 자주 마주친 것이 시발이었다. 멀쩡하게 생긴 놈이 매일 거지 같은 복장으로 바나나우유를 쪽쪽 빨고 다니니까 궁금하기도 했으리라. “출근 안 하시나?” 반말도, 그렇다고 존대도 아닌 투로 그가 물었을 때 나는 못된 성격대로 논다고 대답할 뻔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예의 바른 얼굴로 이러쿵저러쿵 설명해 주었다. “아하, 여기가 사무실?”, “출판사를?” 하며 추임새를 넣던 소장은 그제야 미스터리가 풀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처자들은 직원이구먼.” 아침에 아파트에 왔다가 저녁만 되면 돌아가는 직원들도 눈여겨봤던 모양이다. 대화는 사생활로 이어졌다. “근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누.” 뭐, 어쩌다 보니. “쯧쯧, 그럼 안 되지. 이 아파트에 능력 있는 젊은 처자들 많은데 내가 중신 한번 서줘?” 네, 아뇨아뇨, 다음에요, 지금은 제가 좀.
그 정도에서 목가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좋았으련만. 두 달쯤 지났나, 아파트 출입키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고 해서 관리소장실에 갔을 때 “젊은 사장, 마침 잘 왔네” 하며 그가 내민 것은 웬 자매님의 자기소개서였다.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면접이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엉망이라 봐달라는 청이었다. 나도 사촌동생들 자기소개서깨나 고쳐줘 봤지만 이런 건 첨 봤다. 당황한 와중에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앉은자리에서 슥슥 문장을 다듬어 주었다.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던 소장이 불현듯 “이제 장가가야지” 하고 말을 걸어왔다. 아아 또 시작인가. 다만 이번에는 객쩍은 농담 대신 진지한 제안이 이어졌다. 무슨 외국계 은행에 다니는 자매님이라고 했다. 나이도 나보다 네 살 어리니까 마침맞다면서.
아뇨, 저는 아직. 한 번은 생각해 보겠다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멀리서 소장의 모습이 보이면 빙 둘러 가기도 했다. 담배도 참으며 아파트 밖 출입을 자제했다. 두문불출이라 해도 좋을 정도였다. 하지만 말했다시피 이곳은 단지가 하나다. 온종일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며 마주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 생각은 해보셨고?”라는 물음표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느낌표로 바뀌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답답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쉰 그는 마침내 이렇게까지 만남을 종용하는 이유에 대해 털어놓았다. 사연인즉 이 아파트에 사는 어느 여자분의 어머님이 어찌어찌하다가 나를 좋게 봤고 그 과정에서 소장이 자처하여 주선을 장담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자 면이 안 선다는 이야기였다.
비싼 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회사로도 쓰게 된 내 집
대충 입어도 되는 편한 나날에
‘훼방꾼’이 나타났다
어디까지나 호의에서 비롯됐겠지만 ‘너 따위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거절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속마음이 언뜻언뜻 비쳤다.
이쯤 되니 나도 약간 부아가 치밀었다. 어째서 남의 사생활을 두고 멋대로 장담을 했는지, 나야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좋은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 얘기는 그만하시죠.” 나는 굳은 표정으로 딱 부러지게 말하고 소장실을 나왔다. 그 뒤로는 마주쳐도 실없이 웃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상대도 말을 붙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이제야말로 나는 전처럼 편하게 아파트를 출입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의 심리가 묘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할까.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한데 잘 보이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건 또 무슨 조홧속인지. 나는 요즘 사무실 밖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추리닝을 벗고 제대로 갖춰 입는다. 심지어 그사이에 관리소장이 또 바뀌어서 ‘어느 여자분의 어머님’이 누군지는 알 길이 없는데도 말이다. 아니, 대관절 왜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러 갈 때조차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건지 이 아파트에 사는 어느 여자분의 어머님께 따져 묻고 싶다. 저한테 왜 그러셨나요, 어머님!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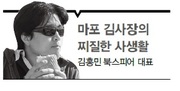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