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마포 김사장의 찌질한 사생활
날이 갈수록 감퇴해가는 기억력을 어찌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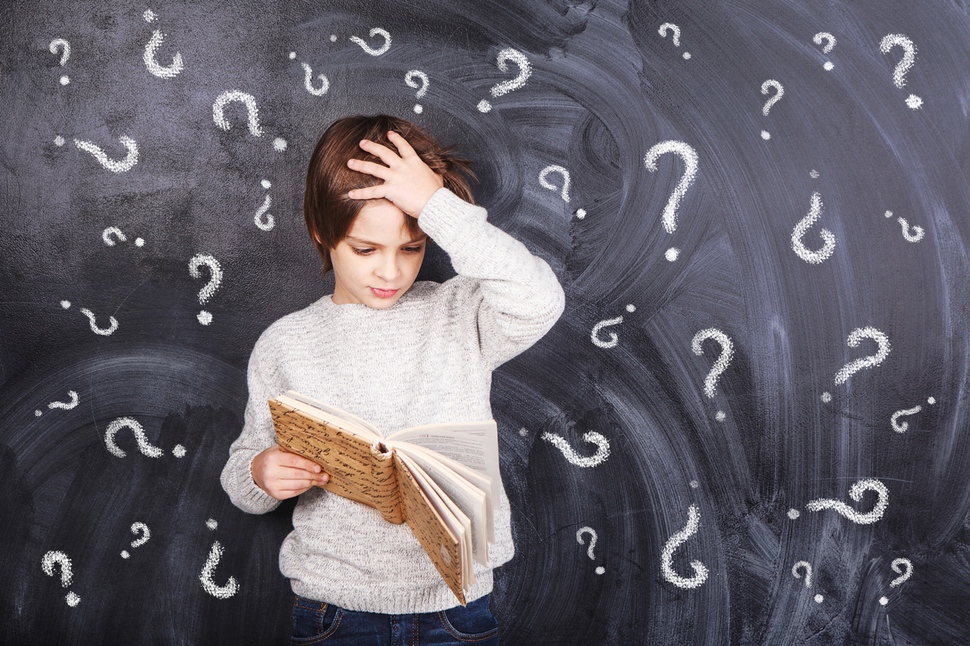 |
|
게티이미지뱅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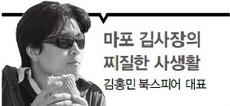 |
들뜬 마음으로 인터뷰한 날
두 시간 넘는 대화를 녹음했다
그런데 녹음기에서 나온 소리는… 나는 즉시 팀을 꾸렸다. 통역은 본사의 미야베 미유키 전담 번역자인 김소연 선생이, 촬영은 <딴지일보> 편집장이었던 최내현씨가 맡았다. 그동안 저작권을 중계한 에이전트도 동행했다. 질문지를 만드는 내내 나는 들떠 있었다. 묻고 싶은 게 산처럼 많았다. 이것이 첫번째 화근이었으리라. 두번째 화근은 작가의 사무실인 ‘오사와 오피스’를 못 찾아서 헤맸다는 거다. 약속시간은 오후 4시. 우리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마자 정신없이 달려서 겨우 1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모두 흠뻑 젖은 채로 작가와 만나야 했다. 늦을까 긴장하는 바람에 미리 체크해야 할 일도 간과하고 말았다. 다행히 미야베 미유키 작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친절했다. 약속된 두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다. 덕분에 인터뷰는 잘 마무리됐다. 문제를 발견한 건 예약한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난 후였다. 혹시나 싶어 녹음기를 재생했는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거다. 녹음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순간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혼이 달아났다’는 건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둔 말이리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와중에도 퍼뜩 짚이는 게 있었다. 녹음기의 마이크를, 마이크 꽂는 자리(mic)가 아니라 이어폰 꽂는 자리(ear)에 꽂은 채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거다. 나는 일행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다들 얼마간 아무런 말이 없었다. 호텔 창밖으로 어둑어둑해진 하늘이 보였다.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들뜨지 않았더라면.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탔더라면. 여유있게 도착해서 녹음기를 점검했더라면. 내 머릿속에서는 만약의 게임이 이어졌다. 그때 최내현씨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하고 입을 열었다. 아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자기도 <딴지일보>에서 일할 때 정치인 인터뷰 녹음파일을 몇 번인가 날렸는데 이게 효과가 있더란다. 우리는 아까와 같은 방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통역자는 작가 바로 옆자리에, 나는 작가와 마주보는 자리에, 에이전트는 내 뒷자리에, 임무가 사라진 촬영자가 이번에는 작가가 되었다. 그러고는 순서대로 질문을 시작했다. 나만 빼고 모두 일본어에 능해서 머리를 맞대고 기억을 더듬으니 답변이 슬금슬금 떠올랐다. 틈틈이 해두었던 메모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 네 시간여를 고투한 끝에 우리는 가까스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까지 다 끼워 맞출 수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었다. 두 시간 넘게 했던 대화를 녹음기 없이도 재생할 수 있다니. 전부 복원한 결과물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믿기지 않았다. 이를 기억력의 승리라 하지 않으면 뭐라 할 수 있으랴. 인간의 기억력이란 우리가 막연히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 그날 내가 얻은 교훈이다. 물론 ‘어디까지 재생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당사자가 얼마나 주의 집중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러니 청와대 비서실장님도, 전 민정수석님도, 대기업 회장님도 조금쯤 노력해 보시길. 한 사람 이름 정도는 의외로 쉽게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