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마포 김사장의 찌질한 사생활
밀가루 음식을 싫어하는 아버지가 끓여준 라면
 |
|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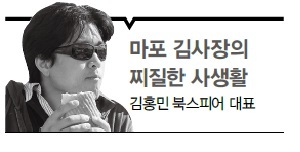 |
마주치기 어색해 독서실행
새벽 두시 귀가한 날 그가 물었다
“출출하면, 라면 끓여줄까?” 우리 집안의 권력관계가 역전된 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아버지의 실직이 이유였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아버지와 마주칠 일이 없었다.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나 돌아오셨으니까. 환한 대낮에 집에 있는 아버지는 낯설었다.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아버지는 더 낯설었다. 조만간 중동으로 가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쿠웨이트인지 자리가 나면 곧장 출국할 예정이라고 했다. 싫은 건 아니지만 마주치기가 어색했던 나는 학교를 마치면 곧장 독서실에 갔다. 거기서 시시한 소설책을 읽다가 자정을 넘겨 집으로 돌아갔다. 한동안 그런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뜻밖의 광경을 마주한 건 중간고사가 시작된 어느 날의 일이다. 성적은 신통치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공부를 한답시고 독서실에 앉아 있던 나는 그날따라 귀가가 늦었다. 새벽 두시가 넘어 현관에 들어서려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틀 사람이 없는데. 심지어 따라 부르고 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안을 엿보았다. 마루에 커다란 나무 판때기가 보였다. 아버지는 그 위에서 밀가루를 반죽하시느라 분주했다. 조그만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뽕짝 메들리의 가사를, 도무지 웃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음정과 그에 뒤지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박자로 조그맣게 읊조리면서. 흥얼흥얼과 드르륵드르륵은 내가 들어서자 잠시 멈췄다. “어, 왔냐.” 겸연쩍은 얼굴로 아버지는 웃었다. 자초지종은 간단했다. 기계로 뽑은 면을 한사코 마다하던 엄마가 인건비 때문에 고민하자 아버지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며 나선 거다. 참고로 우리 집은 방이 두 개뿐이었다. 부모님 방과 우리 형제가 자는 방. 책상은 마루에 있었다. 나는 책상에 앉았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마저 보다가 잘 요량으로 아까 읽던 책을 펼쳤다. “시끄러우면, 끌까?” 아버지가 물었을 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어차피 시시한 소설이나 읽을 거니까. 한석봉 모자도 아닌 마당에 이 무슨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란 말인가. 당신은 또 이런 것도 물었다. “출출하면, 라면 끓여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라면을 먹었다. 계란이랑 파를 왕창 넣어서. 후루룩거리는 소리 외에 이렇다 할 대화는 없었다. 어색한 와중에도 카세트테이프는 신나게 돌았다. 아버지의 밤샘 아르바이트는 이후로도 몇 달간 이어졌다. 부엌에 밀가루 포대가 쌓이는 만큼 밀대를 미는 속도도 빨라졌다. 엄마는 부쩍 손님이 늘었다며 기뻐했다. 기계로는 낼 수 없는 손맛 덕분이라고 아버지를 추켜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수다스럽게 느껴진 건 내 기분 탓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박장대소 분위기는 오래가진 않았다. 가게가 잘되자 임대를 주던 주인이 그만 비워달라고 했단다. 애당초 계약서 따위를 썼을 리 만무하다. 나는 잠결에 두 분이 말다툼하는 줄 알았다.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시장으로 뛰어가서 가게를 때려 부수겠다며 망치를 찾는 아버지를 엄마가 말리는 소리였다. 하긴, 나라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 돌이켜보면 넉넉하진 않아도 단란했던 시절이다.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란했던 것 같기도 하다. 조금 덜 벌고 덜 썼지만 매일매일이 뽕짝 메들리 같았다. 그래서 <아빠의 전쟁>을 마주했을 때 반사적으로 ‘하얀 가루를 펄펄 날리며 밀가루를 반죽하느라 분주했던 아빠’를 떠올린 것이다. “시끄러우면, 끌까?” 하고 물어보는 사려 깊은 아빠와 “출출하면, 라면 끓여줄까?” 하고 물어보는 다정한 아빠도. 스웨덴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정비가 난망한 지금, ‘아빠의 전쟁’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런 다정함과 사려 깊음 같은 게 아닐까. 한편으로 생각한다. 나는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러려면 일단 결혼부터 하는 게 순서겠다. 갈 길이 멀구나.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