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15 20:10
수정 : 2017.03.15 20:35
[ESC] 마포 김사장의 찌질한 사생활
중국 여행에서 만난 자매님이 알려준 역지사지
 |
|
중국 ‘강남의 6대 수향마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우전의 밤 풍경. 김홍민 제공
|
영화 <미션 임파서블3>에서 톰 크루즈가 ‘토끼발’이라 불리는 화학무기를 가까스로 획득한 후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곳을 기억하시는지. 그때 깨어나자마자, 인질로 잡힌 아내 줄리아를 구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장면을 보며 두 가지가 궁금했었다. ‘대관절 토끼발이란 무엇인가’와 ‘톰이 줄리아와 함께 나쁜 놈들을 몽땅 때려잡은 중국의 저 마을은 어디인가’. 이번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곳은 ‘시탕’이라는 수향마을이다. 중국 양자강 이남에는 예부터 못이나 하천이 아름다운 여섯 개의 마을이 있는데 이를 ‘강남의 6대 수향마을’이라고 한단다. 내가 얼마 전에 간 곳은 여섯 군데 수향마을 중에서 시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우전으로 6000명가량의 주민이 살고 있는 시골이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지난 2월 지상파 여행 프로그램에서 ‘동양의 베니스(베네치아)’니 뭐니 하며 연예인들과 함께 조명했으니 곧 한국 사람들로 들끓지 않을까 싶다. 이미 내가 갔을 때 중국말과 한국말이 같은 비율로 들렸다. 척 보기에도 한국에서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아웃도어 옷차림의 떼거리 여행객이 많았다. 근처에 산악지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평상복을 입어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거야 내 생각일 뿐이고 아웃도어 복장은 그 나름의 편의성이 있을지도 모르니 함부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실례인 듯도 하다. 입을 만하니까 입었겠지.
우전은 간선수로를 따라 동책과 서책으로 나뉜다. 동책에는 소설 <영웅문>에 등장하는 구처기가 강남칠괴와 대판 싸우다가 별안간 사람 키만한 항아리의 밑바닥을 쌍장이산의 초식(손바닥 두 개로 산을 옮기는 기술)으로 들어 올려 막걸리를 꿀꺽꿀꺽 마시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객잔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이채롭다. 청나라 말기의 모습을 재현한 각종 박물관과 기념관은 번다한 민속촌을 연상시킨다. 반면에 서책은 상대적으로 물길이 넓고 그 물길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지 동책보다 정겨운 느낌이었다. 고즈넉한 물줄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늘어선 촌락과 상점에 불이 켜지면 그야말로 굉장한 장면이 펼쳐진다. 그동안 중국 여행을 숱하게 했지만 ‘다시 한번 꼭 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처음이다.
야경 따라 흐르는 작은 배 안
유일한 중국 여성을 두고
외모 평가부터 억지로 말걸기까지
한국 남성 5명이 떠들기 시작했다
두 시간가량의 서책 일주를 끝내자 날이 어둑해졌다. 마지막 여정으로 배를 탔다. 이 배에 관해 설명하자면 뒤쪽에서 사공이 노를 저어야 하는 나룻배 형태로 객실은 지붕이 막혀 격자무늬 창을 통해서만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대략 여섯 명에서 여덟 명이 양쪽으로 마주보며 앉는 구조다. 뱃삯은 어른 한 명당 60위안, 우리 돈으로 만 원이 약간 넘을까 말까. 내가 탄 배에는 한국인 남성 다섯 명과 조선족 청년, 묘령의 중국인 자매님까지 일곱 명이 함께했다. 서책 끝에서 초입까지 일직선으로 30분가량 운행하는데 처음 얼마간은 다들 창밖 경치를 구경하며 탄성을 지르기 바빴다. 한데 좀 전에 얘기했듯 객실의 구조가 답답해서인지 중반쯤 지나자 자매님에게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
|
중국 ‘강남의 6대 수향마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우전의 밤 풍경. 김홍민 제공
|
누군가의 “저 아가씨는 혼자 여행 온 모양이네(웃음)”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젊은 사람이 대범하다”느니 “가까이서 보니 미인”이라는 논평이 여기저기서 왁자하게 들려왔다. 문제는 자매님의 맞은편에 내가 앉아 있었다는 거다. 몇 살이라도 젊어 보이는 네가 말문을 트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잠시 고민해 보았다. 말을 거는 게 온당한가. 나도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왜 혼자 이곳에 왔는지. 하지만 ‘다수의 한국인 중년 남성들①’과 ‘소수의 중국인 젊은 여성②’이 본의 아니게 한 공간에 갇히게 된 미묘한 상황에서 질문의 방향이 ②→①이라면 몰라도, 내가 경험한 바 ①→②의 경우에는 상대의 쓸데없는 오지랖에 귀찮아하거나 불쾌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싸잡아 비난하자는 건 아니지만 의아하다는 형제님들은 ‘택시 기사의 오지랖’으로 포털이나 트위터를 검색해 보면 이해가 빠르겠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도 막막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왜 혼자 이곳에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다. 고작해야 “Where are you from?”(어디서 왔어요?) 정도가 최선일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게다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을 걸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말을 걸면 그게 여자든 남자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겁이 나거나 귀찮다. 당연히 남도 겁나거나 귀찮겠구나 생각하면 도무지 말을 걸 수가 없다. 이런 증상은 “도나 기에 관심 있으세요”가 횡행할 무렵부터 점차 심해졌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예전에는 종로나 광화문 일대에서 활보하던 세력들이 언젠가부터 동네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오는 바람에 이만저만 귀찮은 게 아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근절되지 않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가 파헤쳐주면 좋겠다.
자기 얘기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매님은 시종일관 창밖만 바라보며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여론은 “쯧쯧, 말 한번 못 붙이다니 한심하군”으로 바뀌어 있었다. “젊은 친구가 저렇게 소심해서야”, “그럴 거면 나랑 자리를 바꾸든가” 같은 말도 이어졌다. 그냥 내가 소심한 걸로 귀결돼도 상관없었으련만 나도 모르게 “저기, 혼자 오신 모양인데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드릴까요?”라며 찰칵찰칵 시늉을 한 건 내가 정말로 소심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조선족 청년이 통역해주었다. 결과는 호쾌한 거절. 그러자 이번에는 조선족 청년에게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왔는지”를 중국말로 물어봐 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청년은 망설이다가 “그건 좀 실례인 것 같은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나는 지금껏 중국인은 시끄러우며 때때로 무례하기까지 하다는 식으로 틈날 때마다 험담을 해왔다. 어쩌면 그날 이후 중국인 자매님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갖게 됐을 수도 있다. 한국인은 시끄럽고 때때로 무례하기까지 하다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지사지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싫은 기색 하지 않고 이것저것 친절하게 거절해준 자매님께, 제대로 전달될 리 만무하지만 이렇게나마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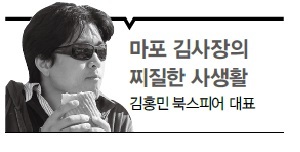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