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29 20:11
수정 : 2017.03.29 20:20
 |
|
영화 ‘이레이저 헤드’. <한겨레> 자료사진
|
[ESC] 마포 김사장의 찌질한 사생활
비디오대여점 ‘알바’ 6개월차의 ‘안티 고객’ 양산기
 |
|
영화 ‘이레이저 헤드’. <한겨레> 자료사진
|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디오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동네마다 우후죽순으로 대여점이 생기는 바람에 마음만 먹으면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시급은 3000원이었지만 퇴근하면서 <베르사이유의 장미> 같은 명작 시리즈를 왕창 가져다 볼 수 있으니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저수지의 개들>로 데뷔하여 <트루 로맨스>의 각본을 쓰고 <펄프 픽션>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입봉’하기 전까지 비디오대여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영화를 공부했다는 기사를 읽고 자극을 받기도 한 터였다. 나도 이것저것 열심히 보면 나중에 시나리오를 쓰든 소설을 쓰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펄프 픽션>은 비디오테이프가 해지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던 기억이 난다. 특히 존 트라볼타와 우마 서먼이 묘한 스타일의 머리를 찰랑거리며 척 베리의 ‘유 네버 캔 텔’(You never can tell) 리듬에 맞춰 디스코 비슷한 걸 추던 대목은 마주할 때마다 감탄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you never can tell pulp fiction’으로 검색해 보셔도 좋겠다. 정말 신나는 장면이다.
대여점에는 매일 신프로가 한두 개씩 들어왔다. 그러면 사장은 프로당 스무 개에서 서른 개 정도를 대량 구입한다. 이 신프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당일 매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 하겠다. 신프로를 빌리러 온 고객은 이쪽 대여점에 없으면 미련 없이 저쪽 대여점으로 가기 때문에 초반 회전율이 중요하다. 고로 철저하게 브이아이피 고객에게만 빌려줬다. 그렇다면 대관절 브이아이피 고객이란 누구인가. 퇴근길에 빌려가서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철석같이 테이프를 반납함에 넣고 가는 고객을 말한다. 이들은 매일, 사채업자가 일수 도장 찍듯 대여점에 들른다. 그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묻는다. “아저씨, 오늘 뭐 재미난 거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책상 밑에 쟁여둔 테이프를 척 하고 꺼내며 “그렇지 않아도 형제(자매)님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빼놨죠(웃음)”라는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비디오대여점 점원이었던 나는 지금과 달리 붙임성이 좋고 사근사근했다.
반대로 신프로를 빌려가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반납하지 않는 고객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그랬다. 이런 조그만 비디오대여점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용했다. 훗날 박근혜 정부가 그런 걸 만들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서른 개나 되는 신프로가 설령 당일에 대여되지 못하더라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에게는 절대로 빌려주지 않는다. 정권에 비우호적인 문화예술인에게 하듯 노골적으로 탄압을 한 건 아니고, 이미 다른 손님들이 다 빌려가서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이지만. 물론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마련해 두었다. 가령 스티븐 시걸이 주연으로 출연한 <파이널 디씨전>이 출시됐을 때는 이를 빌리러 오는 블랙리스트 고객에게 “저는 이 영화 별로더라고요. 심지어 스티븐 시걸이 비행기에 올라타기는커녕 시작하고 십 분 만에 죽는다니까요”라고 설득해서 “하이재킹 영화라면 단연 <패신져 57>이 낫죠. 웨슬리 스나입스가 최고의 연기를 펼칩니다. 보시고 재미없으면 대여료 돌려드릴게요”라는 식으로 신프로에 버금가는 구프로를 빌리도록 유도했다. 진지하게 권하면 십중팔구는 “그, 그런가요” 하고 받아들였다.
처음 온 손님이 달라는
‘초대박 프로’ <이레이저>
빌려주면 경을 칠 것 같았다
대신 <이레이저헤드>를 건넸다
 |
|
영화 ‘이레이저’. <한겨레> 자료사진
|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다. 한창 주가를 올리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이레이저>가 매장에 입고됐다. 이른바 ‘초대박 프로’였기 때문에 사장은 마흔 개나 구입해 놓고 브이아이피 고객에게만 빌려줘야 한다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다. 비디오대여점 알바로 일한 지 어언 6개월, 그 정도는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거든요. 게다가 빼어난 안목으로 추천해 준 구프로 덕분에 블랙리스트 고객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정 무렵, 그러니까 내가 퇴근하기 직전에 기어코 사건이 벌어졌다. 오늘은 어떤 시리즈를 집에 가져가서 밤새 젊음을 불사를지 궁리하는데 나랑 비슷한 또래의 자매님이 가게 문을 열고 스윽 들어왔다. 그러고는 매장을 훑어보더니 벽에 붙은 포스터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거 있어요?” 연방경찰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증인이 위험에 처할 시 그를 보호하는 동시에 증인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주인공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신무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찍은 <이레이저> 홍보물이었다. 마침 딱 한 개가 남아 있었는데 처음 보는 자매님이라 불안했다. 괜히 빌려줬다가 잠수 타면 나만 사장한테 경을 칠 게 뻔하다.
나는 테이프를 찾는 척하며 슬쩍 말을 걸어 보았다. 듣자하니 자매님이 대여점에 들른 사연인즉, 엄마 아빠의 여행으로 오늘 집이 무주공산이라 친구들을 불러서 술 마시고 놀기로 했는데 새벽에 심심할까봐 대충 빌리러 온 거란다.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누군지도 모르더라니까. 마음 같아선 소파에 앉힌 뒤에 차라도 대접하면서 그렇다면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고 지금껏 감명 깊게 본 작품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여 마침맞은 영화를 권해주고 싶었지만 캔맥주가 가득 담긴 비닐봉지가 무거워 보였던데다가 나도 퇴근이 바빠서 그만두었다. 영화야 뭐가 됐든 관심 없고 얼른 친구들이랑 마시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레이저> 말고 <이레이저> 비슷한 걸로 빌려줘도 무방하겠구나 싶었다. 나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레이저헤드>를 꺼냈다. “손님, 찾으시는 게 없는데 이건 어떠세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작품성은 이쪽이 낫거든요.” <이레이저헤드>가 늘 컬트적, 전위적, 그로테스크 같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데뷔작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차피 저 술을 전부 마시면 기절할 텐데 영화 볼 정신이 있겠나. 보다가 잠들기로는 이 영화가 최고지, 라고 생각했다. 자매님은 시큰둥한 목소리로 “그러세요”라며 주소와 전화번호를 불러주곤 표표히 대여점을 나갔다.
다음날 나는 출근하자마자 반납함을 확인했다. 얌전히 들어 있었다, <이레이저헤드>가. 테이프는 3분의 1가량 재생된 시점에서 멈춰 있었다. 30분쯤 관람하다가 때려치운 모양이다. “야, 이×아, 이거 무슨 거지 같은 영화를 빌려왔어?”라는 비난과 “짜증나, 아까 그 호빵맨처럼 생긴 아저씨가 재밌다 그랬단 말이야!”라는 고함이 지금도 어디선가 들리는 듯하다. 하긴, 욕을 먹어도 싸지.
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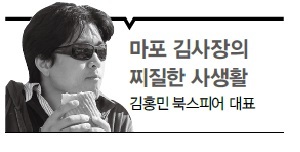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