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13 21:24
수정 : 2016.07.13 2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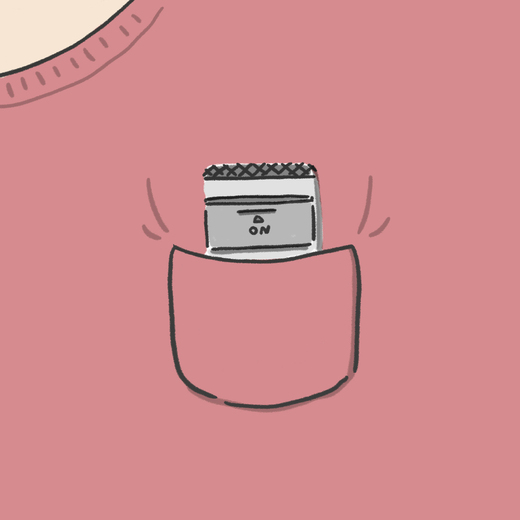 |
|
김보통 제공
|
[매거진 esc] 김보통의 노잼, 노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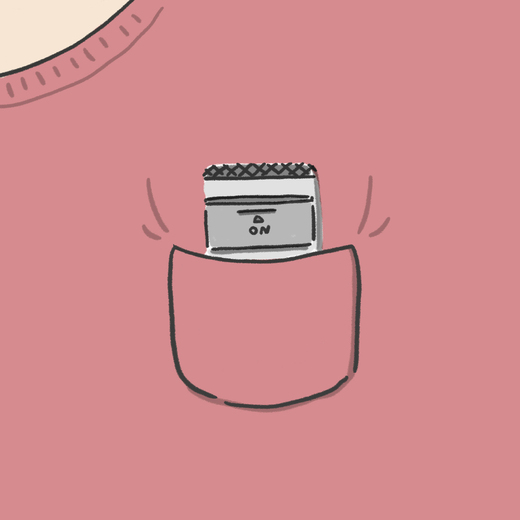 |
|
김보통 제공
|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 집은 가난이 무릎 정도 차오른 상태였다. 나와 동생도 진작에 알고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까지 가난이 들어찼기에,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저냥 살 수는 있었다. 외식은 못 하지만 굶지는 않고, 메이커 옷은 없지만 발가벗고 다니진 않는 그런 가난이었다.
그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나를 복도로 불러내셨다. “얘. 너 컴퓨터 할 줄 안다고 했지?”
당시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갓 상용화되던 해로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 드물었다.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 역시 흔치 않은 시절이었다.
“네. 조금.”
이런 대답에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너 도서관 근로장학생 해라. 학교 도서관에서 타자 좀 치면 되는 건데, 학비 면제해줘.”
당시 고등학교 한 학기 학비는 30만원. 내려면 내지 못할 것까진 없는 수준인데,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그 일을 주셨다. 학기 초 개인면담 때 집안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때문인지, 그렇게 나는 근로장학생이 되었다.
어렵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서둘러 밥을 먹고, 학생들이 책을 빌리러 오기 전 도서관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다 책을 대여해주고, 반납을 받으면 그만이었다. 바코드 리더기는 없었고, 대신 책 뒤커버에 달린 자그마한 봉투 속 도서대여카드에 수기로 대여자의 이름을 적어넣어야 했는데, 그 목록을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정리할 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했다. 능력이라 할 만한 것도 아니지만, 당시는 국민 대다수가 독수리 타법으로 키보드를 치던 시절. ‘다음 사람이 기다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히 키보드를 치는 것'이 일종의 재주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갔다. 부모님은 학비를 버는 나를 내심 대견해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근로장학생 일을 한 것은 단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게 아니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될 즈음 둘러앉아 밥을 먹던 자리에서 난 말했다. “나. 등록금 번 걸로 일본에 가면 안 될까.”
아버지가 물었다. “30만원으로 일본을 어떻게 가?” 나는 대답했다. “부산에 가서 배를 타면 5만원에 갈 수 있대.”
한참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 “그래, 가라.” 허락했다.
그렇게 내 생애 첫 해외여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간 돈은 일반적인 여행객의 비상금 수준이었다. 꼬박 12시간, 그 길고 긴 항해 끝에 도착한 일본.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 어느 것도 맘대로 할 수 없었다. 너무 더워, 큰마음을 먹고 콜라 하나 사먹고 싶어도 참고, 또 참았다. 당시 한국에서 250원이면 사먹을 수 있던 콜라가 110엔(1100원 정도). 여행 내내 그렇게 망설이다, 정말 딱 한번 콜라를 사먹었을 정도다. 지금 생각해보니 일종의 난민 체험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은, 고되기만 한 시간이었다.
기념품도 딱 하나 샀다. 우리 가족 가운데 최초, 가장보다 먼저 해외여행 간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아버지에게 드릴 휴대용 면도기만 달랑 사왔다. 1000엔짜리였다. 크기도, 소리도 작은 게 분명히 싸구려였을 그 면도기를 받아든 아버지는 실망스런 표정으로 전원을 켜 성의없이 수염을 몇번 깎으시더니 입고 있던 옷의 가슴 주머니에 넣으셨다. 그 뒤로도 아버지가 그 면도기를 사용하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몇년 지나 책꽂이 어딘가에서 발견된 면도기는 먼지만 풀풀 뒤집어쓰고 있었다. 오랜 세월, 버림받았다.
김보통 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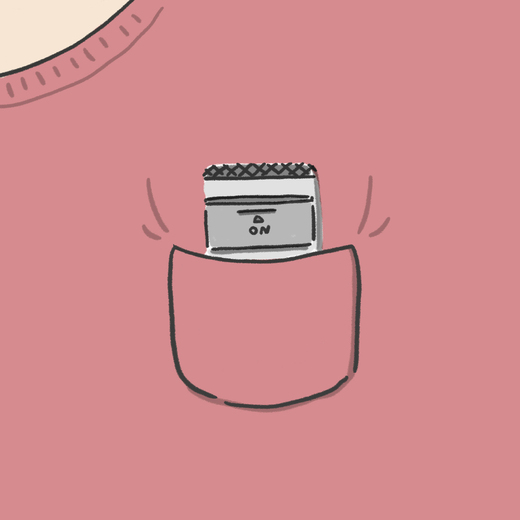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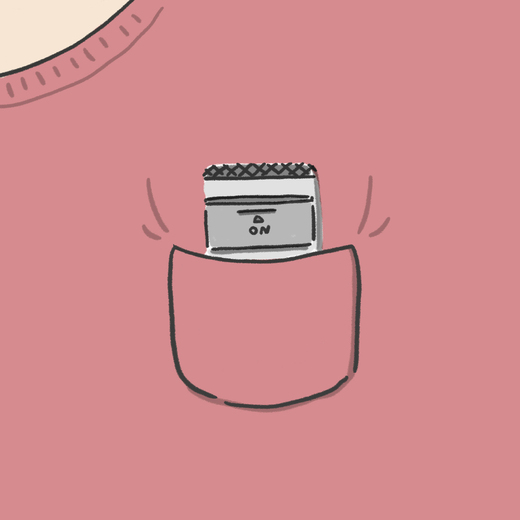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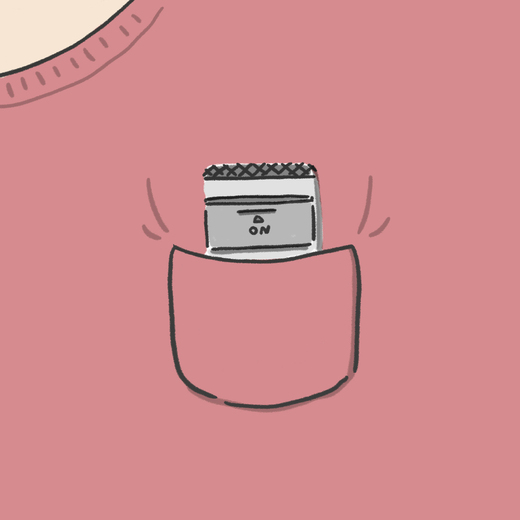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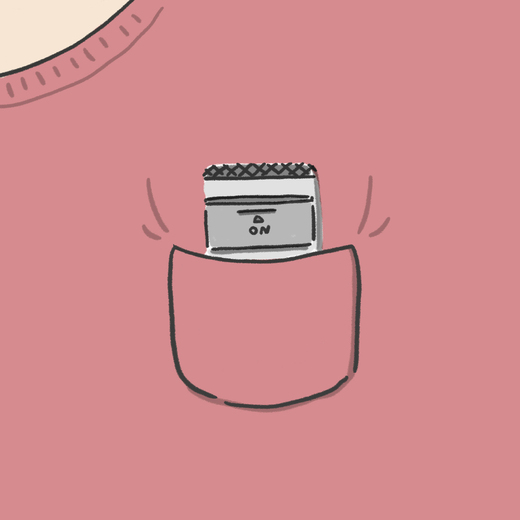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