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8.10 19:33
수정 : 2016.08.10 19:57
[매거진 esc] 김보통의 노잼, 노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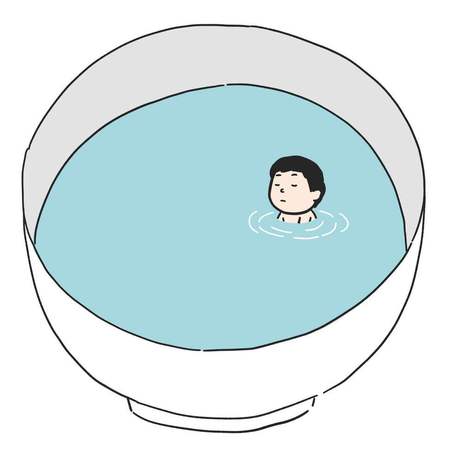 |
|
김보통
|
아버지는 냉면 전문가였다. 어디까지나 우리 가족 한정이긴 하지만, 그랬다.
어린 시절 가족 외식 메뉴는 종종 냉면이었다. 두세 달에 한번꼴로 차를 타고 10분 정도를 가면 도착하는 소갈비집에서 우리는 냉면을 먹고 돌아오곤 했다. 당시 우리 가족이 타던 차는 아버지가 어디선가 폐차하려던 승합차를 얻어온 것이다. 엔진 매연 같은 것이 그대로 자동차 안으로 들어와 1시간 정도 타고 코를 풀면 시커먼 먼지가 섞여 나오곤 했다. 당연히 여름엔 더웠고, 겨울엔 추웠다. 그 차를 타고 우리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냉면을 먹으러, 그 소갈비집에 가곤 했다.
아버지 말에 따르면 ‘진짜 냉면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오로지 비빔냉면을, 가위로 자르지 않고 먹는다’고 했다. 우리에게 냉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만들어 찔깃찔깃한 함흥냉면이다. 당시 나는 평양냉면은 존재 자체를 몰랐다. 이름은 얼핏 들어 알고 있었지만, 곰발바닥이나 샥스핀 같은 상상 속의 음식일 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냉면을 먹던 기억 속엔 질긴 면을 자르지도 않고 삼키려다 기어코 목구멍에 걸려 헛구역질을 해대던 순간들이 많다.
우리가 냉면을 먹으러 가던 그 집은 (당연히) 냉면집 이전에 고깃집이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곳에서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냉면이 더 유명해 이름만 고깃집이고 다들 냉면을 먹는 그런 유의 가게’도 아니다. 인근에서 유명한 식당이라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 고기를 먹지 않고 냉면만을 시켜 먹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엔 없었다. 어린 시절에도 그게 의아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우리는 냉면만 먹어?”라고 물으면, 아버지는 혀를 차며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은 냉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래.”
당시의 나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고, 지구는(북한을 제외하곤) 평화로우며, 내가 어른이 될 쯤엔 통일이 되어 군대를 가지 않을 거란 생각을 진지하게 하던 어리석은 아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바삐 고기를 굽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 냉면 그릇 속으로 고개를 숙인 채 끊기지 않는 면발을 질겅질겅 씹으며, ‘이 맛도 모르고 고기나 먹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이전에 소갈비는 먹어본 적도 없었다. 먹어본 건 동네 ‘태능갈비’에서 팔던 양념 돼지갈비뿐이었다.
내가 평양냉면을 처음 먹어본 것은 서른이 되기 한 해 전이다. 충무로 어딘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유명하다는 곳에서였다. 맑은 국물에 고춧가루가 뿌려진 그 냉면을 처음 먹고 생각했다. ‘이것은 냉면 맛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나 먹는 것이다.’ 면은 뚝뚝 끊기고, 국물 맛은 닝닝해서 연신 마음속으로 ‘속았다. 나는 속았다’고 중얼거렸을 정도다. 지금이야 뭐, 이것도 저것도 잘 먹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다. 이래서 가정 교육이, 조기 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
소갈비집을 십수년을 오가며 소갈비 한번 먹어본 적 없이 냉면만 먹었던 것이, 그만큼의 돈밖에 없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 것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였다. 진위 여부를 어머니에게 여쭤보니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물을 수도 없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참으로 그 소갈비집의 냉면을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김보통 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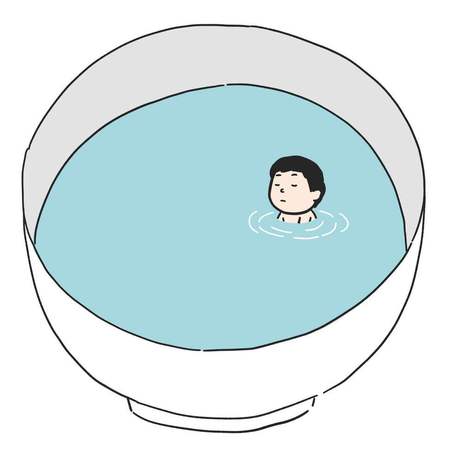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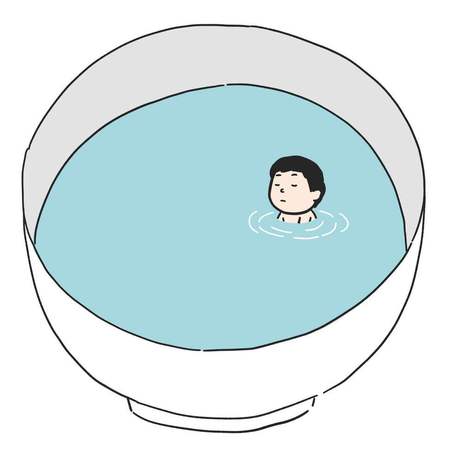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