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12.21 19:56
수정 : 2016.12.21 20:05
[ESC] 김보통의 노잼, 노스트레스
 |
|
김보통
|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아채는 평균적 시기는 언제일까. 조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여섯살은 아닐 것이다.
크리스마스이브였다. 그날 저녁 나와 엄마, 그리고 유치원 친구들과 부모들은 동네의 랜드마크였던 독일제과 앞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온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독일제과 앞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귀신같이 알아보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착한 아이였는지 아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선행을 했다거나, 효자였기 때문은 아니고, 그저 ‘내가 행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번인가 동생에게 크레파스를 먹이고, 몇백 번인가 때려 울렸지만, 그런 사사로운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나뿐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자신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인형의 집을 받을 거야.” “조종할 수 있는 탱크를 주실 거야.” 나 역시 흘러나오는 콧물을 들이마시며 “난 5단 변신 합체 로봇”이라고 말했다.
당시는 2평도 되지 않는 골방에 나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다닥다닥 붙어 살던 때였다. 제대로 된 장난감 같은 것은 없어서, 똥파리를 잡아 날개를 떼어 물을 담은 바가지에 띄워놓고 수영을 시키거나, 흙을 헤집어 지렁이를 찾아내 뾰족한 돌로 자르며 놀곤 했었다. 그렇기에 5단 변신 합체 로봇은 꿈의 장난감이었다.
그때 누군가 말했다. “산타 할아버지다!”
우리는 하던 대화를 멈춘 뒤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나는 보았다. 매우 반짝이는 코를 가진 루돌프 대신 전조등을 밝힌 채 다가오는 유치원 통원버스를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선물만 있다면 루돌프가 버스가 되어도 상관없던 것이다.
이윽고 늘 보던 버스가 우리 앞에 멈춰서더니, 문이 열리며 역시 늘 보던 운전기사 아저씨가 산타 할아버지 복장을 한 채로 내렸다. 손을 흔들거나, ‘호호호’ 하고 웃지는 않았다. 아이들은 ‘아저씨다’, ‘아저씨’ 하며 웅성댔고, 몇은 무섭다며 부모의 팔에 매달렸다. 아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좌석칸에 올라 쌓여 있는 선물 보따리들 중 하나를 찾아들고는 내려왔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와아~’ 하며 달려나갔다.
기사 아저씨, 아니 산타 할아버지는 한 손엔 선물 보따리, 다른 한 손엔 아이들의 이름표를 들고 서더니 한 명씩 호명했다. 쭈뼛거리며 아이가 나서면, 딱히 칭찬을 하는 것도 없이 선물 바구니를 뒤적이며 “영식이, 영식이” 하고 아이의 이름이 적힌 선물을 찾아 전해주었다.
크기나 모양은 제각각이었다. 딱 보기에 인형을 받은 아이도 있었고, 상자가 큼직하고 무거워 보이는 게 로봇이 틀림없을 아이도 있었다. 아이들은 선물의 포장지를 만지작거리며 흥분해 코를 벌름거렸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다. 아저씨는 “보통이, 보통이” 하며 선물 보따리 속을 뒤적이더니 내게도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다. 크기는 딱 빼빼로만 했으며, 무게도 딱 그만큼 가벼웠다.
용무를 마친 버스는 어둠을 헤치며 다음 코스로 향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가자, 춥다”고 하더니 손을 잡아끌었다. 다른 아이들도 선물 보따리 내지는 꾸러미를 들고는 집으로 향했다. 돌아가는 내내 나는 ‘동생에게 크레파스를 먹인 게 그렇게 큰 죄였나?’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선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선물은 500원짜리 조립식 장난감이었다. 다 조립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아서 울상을 짓고 있다 아빠에게 “빨리 자!”라고 한 소리 들었다.
그 선물이 사실 부모님들이 준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다. 당연히 부모님은 500원짜리 장난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김보통 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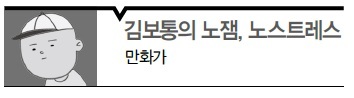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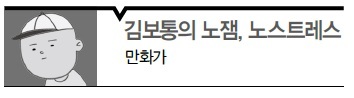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