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04 19:41
수정 : 2017.01.04 20:27
 |
|
김보통
|
[ESC] 김보통의 노잼, 노스트레스
 |
|
김보통
|
‘올해의 목표’를 정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살빼기’, ‘성공하기’ 같은 허황된 것이었는데, 대부분은 이룰 수 없었다. 이루기는커녕 봄이 지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되다니 늦어버렸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 어쩔 수 없지’ 하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내년을 기약했다. 매년 그러다 보니 ‘올해의 목표’를 정하고 신속히 포기하는 것이 일종의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그만뒀다. 대신 ‘올해가 지나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것들’의 리스트를 정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지만 다르다. 예를 들자면 ‘올해엔 마라톤을 한번 뛰어봐야지’ 하는 것이 전자라면, ‘내년엔 고관절이 노화되어 마라톤을 할 수 없을 테니, 반드시 올해 해야지’ 하는 것이 후자다. 예를 들어 봤자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지만 다르다.
마라톤을 뛰게 된 것도 이런 이유다. 스물일곱이 되는 겨울이었다. 고작 그 나이에 고관절을 걱정하는 건 엄살이 아닌가 싶지만, 나는 진지했고 그래서 당장 가장 가까운 시일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다. 풀코스를 뛸 엄두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10㎞짜리 코스를 선택했다.
준비 같은 것은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마라톤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뛸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만 있었다. 대회 당일인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평소 입던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대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다.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고, 매우 추웠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다. 난생처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한겨울 새벽부터 달리려고 제 발로 왔는가’ 싶어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살폈다.
가장 많이 보이는 무리는 배불뚝이 아저씨를 둘러싼 젊은 사람들이었다. 배불뚝이 아저씨가 뭔가 시답잖은 농담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전혀 즐겁지 않은 얼굴을 한 채 큰 소리로 억지웃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회사 단체 참가자들이다. 그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문적인 복장을 한 채 몸을 풀고 있는 동호회 사람들이었다. 커플 단위 참가자도 많았는데 꽃놀이라도 나온 듯 끌어안은 채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부러웠다.
고독한 러너들도 많았다. 혼자 왔기 때문인지 즐거워 보이는 사람은 없다. 별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표정을 한 채 비장하게 초코바 같은 것을 꺼내 우물우물 씹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염불 같은 것을 중얼거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땠냐면, 생각 없이 가져온 두껍기만 한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뛰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난감해하고 있었다. 지갑엔 뛰다가 힘들면 택시 타고 올 목적의 돈이 오천원 들어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돈만 가져오는 건데!’라고 생각했지만 늘 그렇듯 뒤늦은 후회였다.
탕! 어디선가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슬슬 움직였다. 그 모습은 출근시간 사당역 2·4호선 환승 장면과 비슷했다. 상상했던 것처럼 우르르 달려나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들 많이 여유로워 보였다. 사실 별로 뛰고 싶지 않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라톤은 고통스러웠다. 고작 10㎞였지만 운동화 끈이 두 번 풀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와중에 쪼그려 앉아 묶어야 했고, 두 번 다 일어났을 때 현기증을 느껴 ‘그만 택시 타자’ 싶었다. 하지만 수염을 허리까지 기른 대머리 할아버지 마라토너와,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삿갓을 쓴 채 ‘강화도 홍삼’이라고 적힌 도포를 휘날리며 ‘쌩’하고 나를 스쳐가는 김삿갓 마라토너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했다. 결국 쓰지도 못한 돈을 넣은 지갑을 주머니에 덜렁거리며 한 시간에 걸쳐 완주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앓아누웠다.
좋았던 것이 있다면 기념품으로 준 모자였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의 대회에서 다양한 기념품을 주고 있었다. 그 기념품에 눈이 먼 나는 그해에만 스물 몇 개의 대회에 참여했고, 대부분 완주했다. 풀코스도 뛰었다. 견물생심이란 무서운 것이다. 올해엔 어떤 기념품을 줄까? 궁금하다.
김보통 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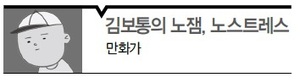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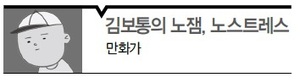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