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18 19:40
수정 : 2017.01.18 19:59
 |
|
김보통
|
[ESC] 김보통의 노잼, 노스트레스
 |
|
김보통
|
행복이란 바나나와 같다. 내겐 그렇다. 너무 달지 않고, 시지 않으며, 껍질은 까기 쉽고, 씨도 없다. 부드러워 먹기 편하며, 양도 적당하다. 과일의 왕이다. 바나나를 먹으면 자연히 행복해진다. 바나나가 너무 좋아 바나나에 대한 시를 썼을 정도다.
대학생이 된 어느 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바나나가 너무 좋아. 무인도에 떨어지더라도 바나나나무만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래서 넌 바보야”라고 했다. 살아계실 적 아버지는 내가 그 어떤 것을 좋다고 하든 ‘그래서 너는 바보다’라는 말을 했다. 그림이 좋아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글이 좋아 관련 학과로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보다’라는 말을 들었다. 머릿속에 ‘아들이 무슨 말을 한다→그래서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프로그램이 입력된 것 같았다. 그날도 그랬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는데 겨우 바나나가 제일 좋다니. 한심한 녀석. 두리안도 먹어보고, 애플망고도 먹어보고, 패션프루트도 먹어보고 한 다음에야 어떤 게 제일 맛있는가를 결정해야지, 먹어본 것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 흔한 과일을 최고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엔 그래도 바나나가 제일인데”라고 했지만, “그럼 너는 그냥 평생 바나나만 먹고 살게 되겠지”라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과일을 먹어보았다. 쉽지는 않았다. 지금이야 마트에 가면 쉽게 이국의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사과, 귤,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뿐인 세상이었으니까. 그래도 노력했다. 샐러드바에 가면 과일 코너의 모든 과일을 먹어봤다.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으로 오가며 보이는 과일가게에서 새로운 과일을 발견하면 사곤 했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과일은 한계가 있었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는 아니지만, 제대 후 유럽을 가게 되었다. 부모님께는 “열흘 정도만 다녀온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은 애초부터 없었다. 귀국하는 항공편을 서너달 뒤로 잡아놓은 상태였다. 그 사실을 원래 귀국하기로 얘기해놓은 날, 헝가리 어느 게스트하우스에서 메신저로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아버지는 “이 바보새끼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물론 잡으러 오진 못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 터키까지 전 유럽을 떠돌며 한국에서는 먹을 수 없던 다양한 과일을 먹었다. 돈은 다른 관광객들이 먹고 버린 와인병을 모아 고물상에 팔거나, 지리에 익숙지 않은 한국 관광객들의 술심부름을 하고 난 뒤 잔돈을 받거나, 설거지와 호객 행위 등을 하면서 벌었다. 그렇게 몇 달 뒤, 긴 시간에 걸친 과일 순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이제는 ‘어떤 과일이 최고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의 과일은 한번씩 다 먹어본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최고의 과일을 결정했다.
그것은, 바나나!
내게 그 이상의 과일은 없었다. 물론 아직도 못 먹어본 과일이 많고, 어딘가에선 과일계의 권위자들이 모여 ‘올해의 과일’ 같은 것을 선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내 알 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최고의 과일이라는 사실뿐.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그것보다 훌륭한 것이 많은데 고작 그런 것에 만족하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만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 방심하고 있었는데, 세상엔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이 알려주며 어떻게든 내 손의 바나나를 시시해 보이게 만들려는 사람들. 하지만 더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 먹어볼 만큼 먹어봤어도 내겐 바나나가 제일이었으니까!
김보통 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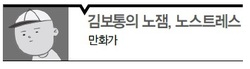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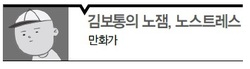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