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4.05 20:16
수정 : 2017.04.05 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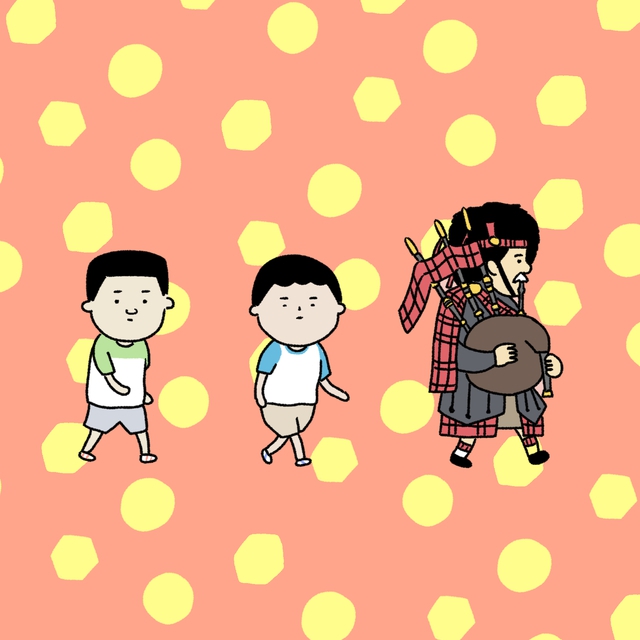 |
|
김보통
|
[ESC] 김보통의 노잼, 노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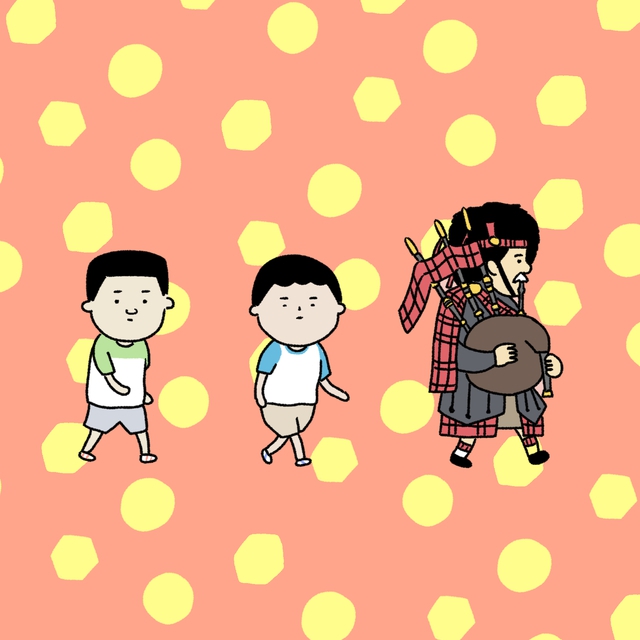 |
|
김보통
|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담임 선생님이 내게 돈을 주며 말했다. “‘학교 앞 수퍼’에서 계피맛 사탕 한 봉지 좀 사와라.” ‘학교 앞 수퍼’는 학교 앞에 있던 실제 가게 이름이다. 정문에서 약 7미터(10미터라기엔 좀 짧았던 기억이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커다란 대형마트가 없던 당시 동네의 랜드마크였다.
“‘학교 앞 수퍼’ 어딘지 알지?” 하고 선생님은 확인했다. “네” 하고 나는 답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미덥지 못했던지 다른 친구를 한 명 동행시켰다. 당시 나는 소변을 완벽히는 못 가려 분기별로 수업 중에 오줌을 싸던 아이였다. 못 믿을 만했다. 그럴 거면 애당초 심부름을 시키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수업에도 도통 집중을 못하던 아이라 심부름이라도 시키려던 것 같다. 잘은 모른다.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삼십년 전 얘기라 선생님도 기억 못할 것이다. 살아는 계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수업 시간 중에 다른 친구와 함께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사탕을 사러 갔었다. 학교를 나와 바로 앞 슈퍼에서 사탕을 사서 돌아오는 간단한 심부름. 10분이면 끝날 심부름이었다.
“대부님. 계피맛 사탕 있나요?” 그렇다. ‘학교 앞 수퍼’는 나의 성당 대부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계피맛 사탕? 없는데.” 대부님이 말했다. 친구는 “어떡하지?” 하고 물었고, 나는 “다른 곳에 가보자”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곳이란 ‘학교 앞 수퍼’에서 5미터 떨어진 ‘난우 수퍼마켓’이었다. “계피맛 사탕은 없네….” ‘난우 수퍼마켓’ 주인아저씨가 말했다. 친구는 내게 “어쩔 수 없다. 돌아가자”고 했다. “안 돼. 선생님이 사오라는 사탕을 못 샀잖아.”
물론 거짓말이었다. 애당초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내가 먹지도 못하고 더럽게 맛도 없는) 계피맛 사탕 따위 내 알 바 아니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 이 일시적 모험을 길게 즐기고 싶었다.
“다른 슈퍼에 가보자.” 내가 말했다. 이번엔 약 200미터는 떨어진 곳에 있는 슈퍼가 목적지였다. 다행히 그곳에도 계피맛 사탕은 없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다음엔 또 200~300미터 떨어진 슈퍼까지 걸어갔다. 그곳에도 없었다. 시간은 어느새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물론, 내 알 바 아니었다. 아니, 바라던 바였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낯선 동네의 낯선 거리를 걷고 있었다. 처음엔 “이제 가야 하는 거 아냐?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냐?” 하며 별 관심도 없는 얘길 자꾸 하던 친구는 말이 없었다. 포기한 것이라기보단, 어느새 모험을 즐기게 된 것 같았다. 운 좋게도 들르는 슈퍼마다 계피맛 사탕은 없었다. 낯선 슈퍼의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간이 지나 있었다. 슬슬 돌아갈 때였다. 혼나는 것이 두렵기보단 다리가 아팠다.
“이제 갈까?” 내가 말하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슬픈 듯 기쁜 표정이었다.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사탕 진열대에서 스카치캔디를 한 봉 집어 “이거 주세요”라고 말했다. 낯선 주인아저씨는 “이건 계피 사탕이 아닌데?”라고 물었다. “상관없어요.” 나는 답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스카치캔디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
“계피맛 사탕은 없다고 해서요.” 거진 두 시간 만에 나타나 스카치캔디 봉지를 내미는 나를 선생님은 가만히 바라만 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유괴되거나 미아가 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은 스카치캔디 봉지를 뜯어 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었다. 아마도 선생님은 좋아하지 않는 맛이었던 것 같다. 참고로 나는 스카치캔디 중 바나나맛을 좋아한다. 버터맛이 가장 별로다.
김보통 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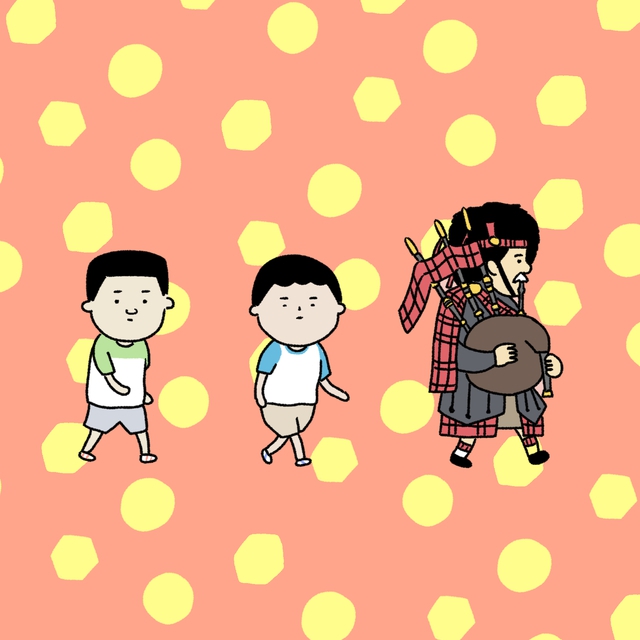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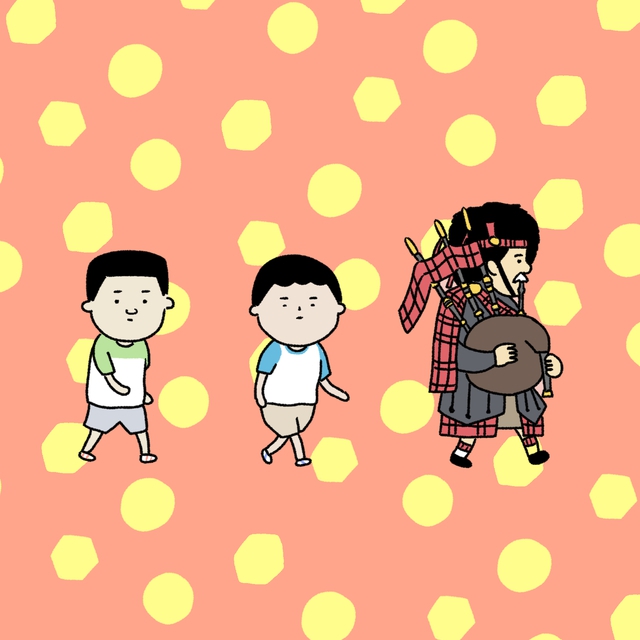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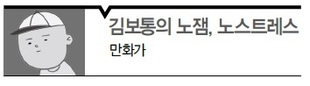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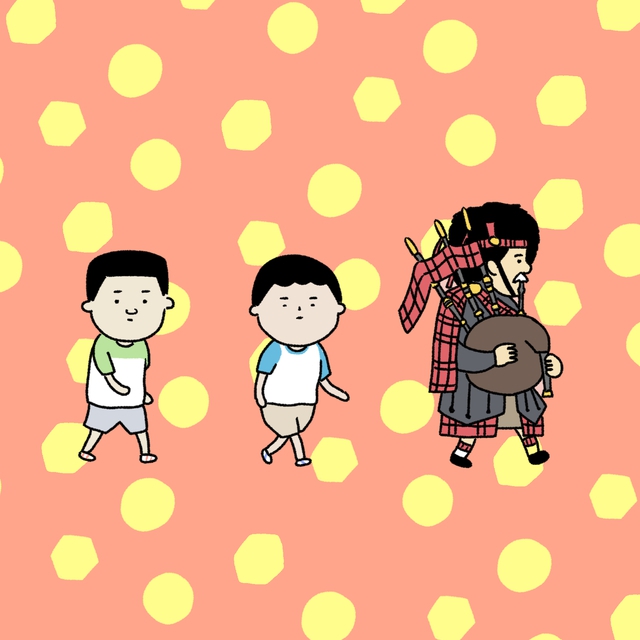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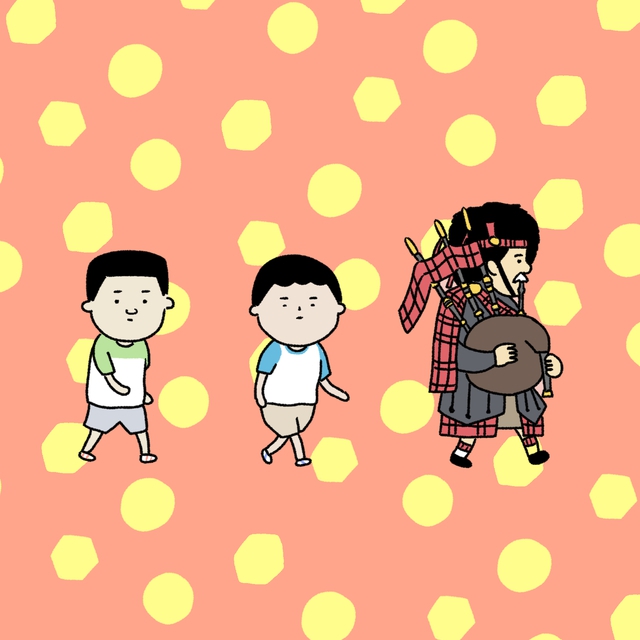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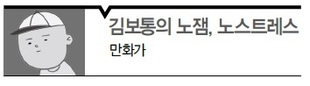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