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01 09:17
수정 : 2016.07.15 14:48
이송희일의 자니?
부엌은 생애 최초의 미스터리였다. 납득할 수 없는 삶의 비밀들이 웅성거렸다. 어린 내가 부엌에 들어갈라치면 할머니는 부뚜막 고양이 잡들이듯 고추 떨어진다며 냉큼 내쫓아버렸다. 또 여자들은 부엌에서 남은 반찬을 양푼에 넣고 비벼 먹었다. 제대로 차려진 밥상은 안방 남자들 차지였다. 겸상을 한 건 훨씬 나중이었다. 이따금 남자들은 상을 뒤엎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곤 했다. 부엌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세계였다.
어렴풋이 부엌이 성 역할이 분리되는 시원적 장소임을 감지했지만, 머리통이 굵어지고선 그 구분이라는 게 더 의뭉스러워졌다. 실상 시골 여자들이 일을 더 했기 때문이다. 아침 댓바람부터 일하고 저녘에 돌아와 밥 짓는 엄마를 보며, 부엌이야말로 성 역할을 핑계로 여성에 대한 이중 착취가 버젓이 횡행하는 곳임을 깨달았다. 그곳은 위선의 장소였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13대 증손 외아들이란 허울을 비웃으며, 집안 남자들에게 반기를 든 채 부엌에 스며들어 아궁이 불을 지피며 최초의 저항을 벌였던 게. 뒷등에 떨어지던 남자 어른들의 잔소리와 협박은 가소로운 것이었다. 아직까지 내 고추는 건재하다.
시간이 얼어붙은 건가. 이곳은 세월의 무덤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기껏 ‘14분’ 늘었다. 맞벌이 경우에도 아내가 5배 더 가사노동을 한다. 남편이 40분, 아내는 무려 194분. 역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찌다. 한편으론 ‘맞벌이'로 성 역할의 경계를 슬쩍 지워놓고, 다른 한편으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이중의 노동착취가 이뤄지는 시대. 대놓고 가부장제였던 내 유년 시절보다 오히려 더 교활해졌다. 수렵시대라면 힘의 위계에 따른 역할 구분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알파고의 시대가 아닌가. 노동을 기계가 점차 대체하는 시대이지 않은가. 노동의 성 역할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에, 부엌만큼은 여성을 결박하는 장소로 남기고픈 이 시대착오적인 가부장제야말로 어쩌면 ‘여성혐오'라는 이데올로기를 지탱하는 가장 오래되고 끈질긴 버팀목일지도 모르겠다.
발터 베냐민은 “밥은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평등해지고 연결된다”고 환대의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부엌에서의 노동을 생략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다. “밥은 함께 해야 한다. 음식을 함께 함으로써 사람들은 서로 평등해지고 연결된다.”
이른바 부엌의 페미니즘. 처음으로 성 역할이 분리된 장소이자 아직도 가부장제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연명하고 있는 곳, 부엌. 이곳에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고 즐겁게 음식 만드는 장면을 상상하는 일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노동정치의 의제이기도 하다.
문득, 여성혐오라는 시대의 화두 앞에서 어설피 반성문을 쓰거나 당위의 말풍선들을 두서없이 띄우는 한국 남성들이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미 체내 세포에까지 각인된 저 시원의 가부장제를 정화하는 일. 먹거리를 요리하는 그 원초의 시간 속에 손을 담가 성 역할이라는 탁한 수면을 휘젓는 일. 손수 밥을 지어본 사람은 상대의 미소가 삶의 생기를 두 배로 증진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영화감독
영화 만드는 사람. 1998년 <언제나 일요일 같이>로 데뷔했다. <슈가힐>(2000) <굿 로맨스>(2001) <후회하지 않아>(2006) <탈주>(2009> <불안>(2010) <지난 여름, 갑자기>(2011) <백야>(2012) <남쪽으로 간다>(2012) <야간비행>(2014) 등의 작품을 만들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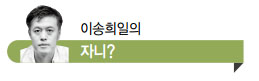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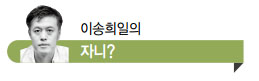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