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여울의 내마음속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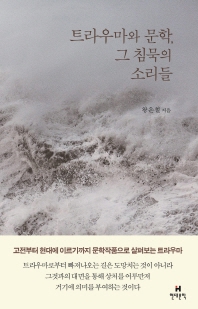 |
왕은철 지음/현대문학(2017) 과연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저절로 나을까. 몸의 상처와 달리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고통 받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안간힘 쓰기도 한다. 누군가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 죽거나 다치거나 미쳐버렸는데, ‘나만 괜찮아져서는 안 된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심지어 상처 입은 마음에는 불가해한 중독성이 있다. 어떤 환자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인 편안함을 느끼며 그 아픈 상처 속에 차라리 안주하려 한다.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므로 그 편안한 소속감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일수록 치유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을 괴롭혀온 문제였다. 왜 어떤 사람들은 치유 자체에 한사코 저항하는 것일까. 어쩌면 바로 이 치유에 대한 저항이야말로 트라우마의 강력한 본질이 아닐까. 이 책은 치유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사랑도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일 수 있듯이, 치유도 때로는 치유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일 수 있다.” 치유 자체를 거부하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상처를 무조건 제거하려는 욕망 또한 또 하나의 폭력임을 이해할 수 있다. 스스로의 상처에 귀 기울이고, 그 상처를 ‘언어’를 통해 조금씩 풀어가는 겸허한 태도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된다. 상처에 대해 아예 함구하는 것은 상처로 하여금 ‘네가 나를 영원히 지배해도 좋다’고 허락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꼭꼭 동여맨 상처는 조금씩 언어로 풀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참고 참았던 깊은 숨을 내뱉기 시작한다.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상처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치유되지 못한 모든 상처는 결국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고통’이기 때문이다. “트라우마의 치유는 의미의 상처를 어루만져 의미를 회생시키는 일”인 것이다. 이 책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부터 <헨젤과 그레텔>, <바이센테니얼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인간의 트라우마를 비춰본다. 저자는 트라우마는 단지 피해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가해자도 트라우마의 주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언 매큐언의 <속죄>에서처럼, 자신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친언니와 그 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겨버린 한 소녀가 먼 훗날 훌륭한 작가가 되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도 가해자 또한 트라우마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슬픔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슬픔이야말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소중한 치유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쩌면 마음껏 슬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억압된 트라우마가 우리 자신을 더욱 숨 막히게 하지 않는가. 우리의 상처에게 마음껏 아파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무감으로서의 치유’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시작이다. 내가 상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를 소유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가 단순한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영혼의 반려’임을 깨달을 수 있다. 정여울 문학평론가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