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6.22 17:52
수정 : 2017.06.22 20:55
조은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감독
<신음악의 다잉메세지>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채널이 최근 팟캐스트에 등장했다.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20세기 이후 작곡된 현대음악을 힘주어 소개하는데, 대개 난해하고 생경해서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외면당하기 쉬운 음악들이다. 방송을 진행하는 두 음악가는 음대를 갓 졸업한 듯 젊고 재기발랄하다.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신음악의 다잉 메시지를 통해 현대음악의 매력과 사람들의 관심을 일깨운다.
그래서 코너 이름도 절박하다. ‘제발 한번만 들어봐 주세요’. ‘현대음악의 미친 아름다움’을 왜 몰라주느냐 한탄하는가 하면, 조회 수가 378회나 되었다고 기뻐하기도 한다. 다른 팟캐스트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지만, 이 장르의 어느 음악가가 한 음악을 378회나 연주할 수 있겠냐며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는다. 방송은 유익한 동시에 유쾌하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상념을 자극받았는데, 이 시대가 젊은 음악가들에게 새롭게 요구하는 역량, 혹은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젊은 음악가들의 몸부림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이제껏 없던 길을 당차게 개척하는 모습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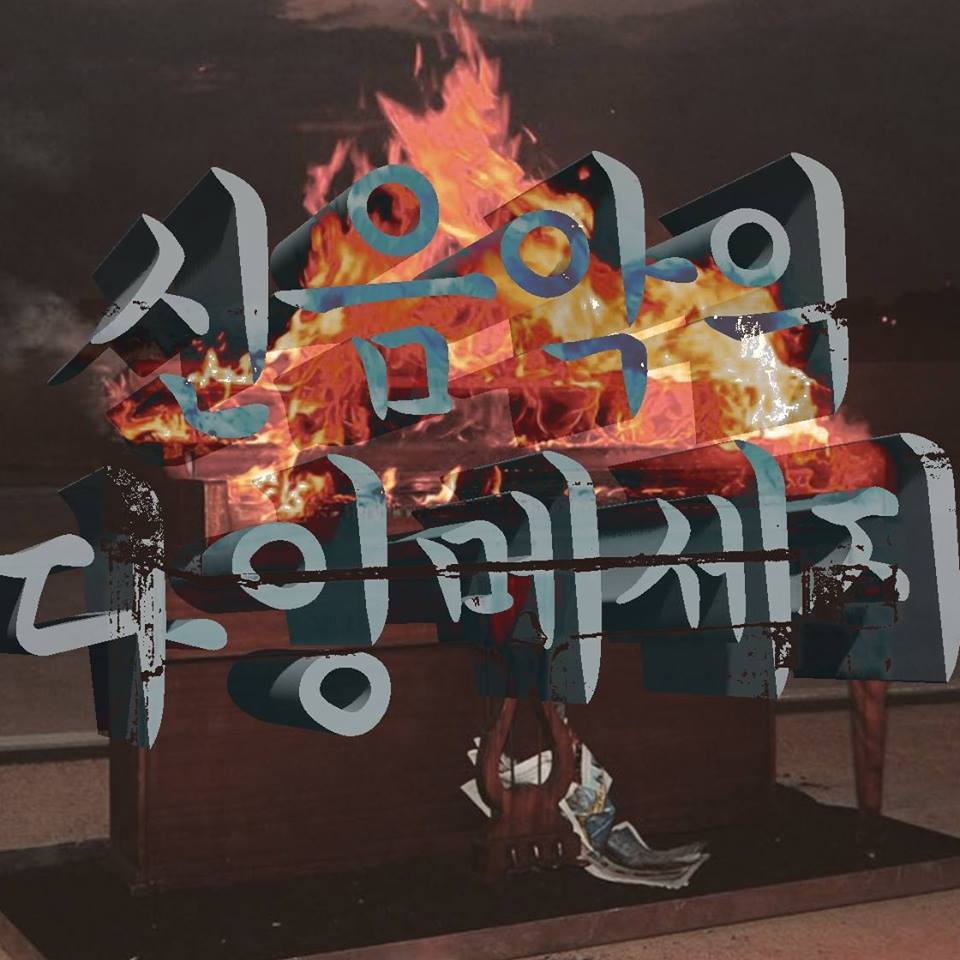 |
|
‘신음악의 다잉 메세지' 페이스북 갈무리
|
그로부터 며칠 후, ‘21세기 문화지각변동과 음악대학의 교육’을 주제로 한 좌담에 참여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일간지의 음악담당 기자, 주요 공연장의 실무자, 음악방송 피디(PD), 예술경영 등 공연예술분야 전반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함께한 자리였다. 이야기는 뼈아픈 성토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격동기를 맞이했는데도 음악대학은 여전히 19~20세기 서양 클래식음악의 교육시스템을 답습하고 있지 않으냐는 반성이었다. 문화예술 플랫폼은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데, 음대 학생들은 과연 자신의 꿈과 직업을 연결할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가. 실상은 퍽 비관적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악대학의 교육과정은 과목의 얼개와 학점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말이다. 현장과 학교의 괴리, 그러므로 ‘음대 교육의 다잉 메시지’라 진단해야 할지 몰랐다.
이 좌담에서 내가 받았던 질문은 특히 ‘피아노과 졸업생’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자면 훌륭한 솔리스트 양성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과정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었다. 음악대학에서 매 학기 치르는 실기시험 곡은 18~19세기 레퍼토리에 편중되어 있다. 시간의 풍화를 이겨내고 대중의 호불호를 극복한 이 작품목록은 일평생을 다 바쳐도 모자랄 방대한 분량이다. 학생들은 악기와 홀로 대면하고 치열하게 수행하는 것이 음악가의 절대적 소명이라 훈련받는다. 그러므로 이 커리큘럼의 지상목표는 훌륭한 솔리스트로 성장해 예술적 완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음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누구나 조성진처럼 ‘전업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 입단하는 기회조차 없는 피아노과 졸업생의 경우, 연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말 선택된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 중요한 소득원은 결국 개인레슨과 출강에 집중되고 만다.
이처럼 대학이 공급하는 연주자의 양상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음악가의 수요와 한참 어긋나 있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과정 탓에 음대를 졸업한 학생은 돌연 무주공산에 고립되기 일쑤다. 이번 좌담에선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연주력의 증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세계를 온전히 드러낼 기회를 다방면으로 개척할 줄 알며, 시대정신과 사회상에 열려 있는 인재가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반면 그런 인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는 선명한 방책을 구하기 어려웠다. 비판과 각성이 오가는 사이, 나의 상념은 ‘음악대학 교육의 다잉 메시지’로 이어졌다. 다잉 메시지로 조난신호를 보내며 음악을 살리려는 시도들, 그런 인재를 키워야 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인지 몰랐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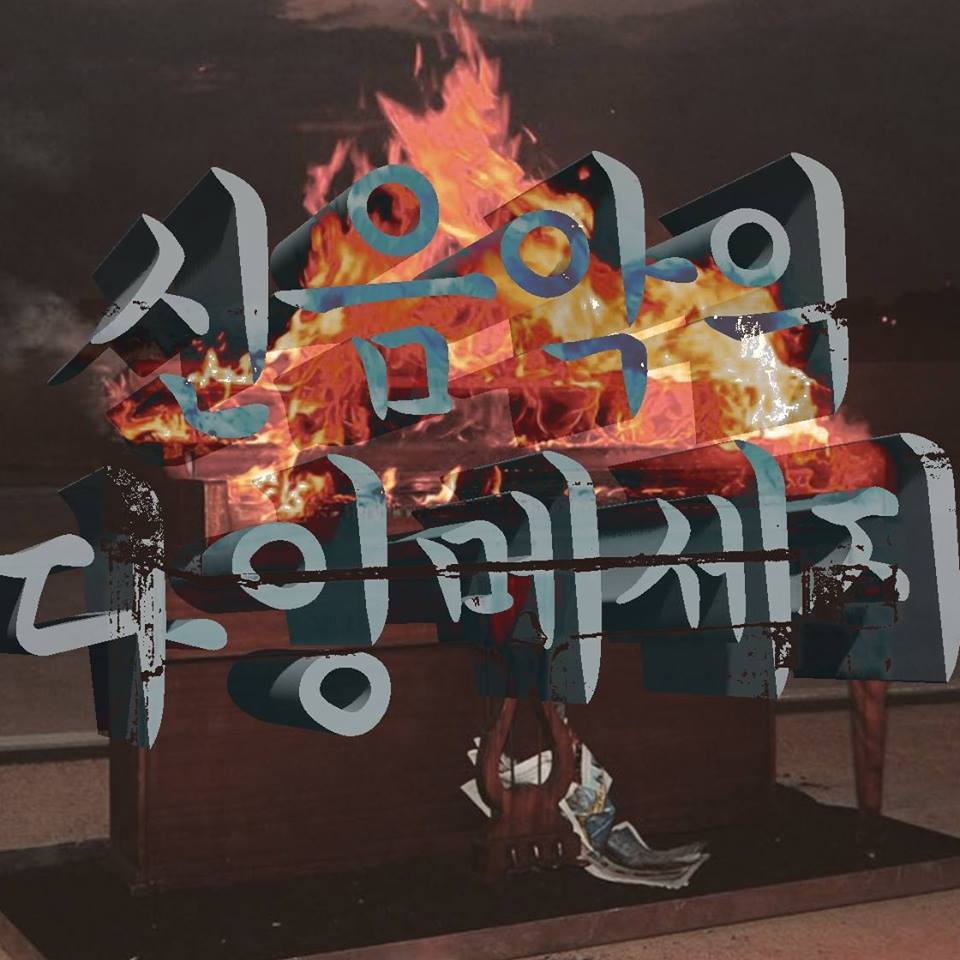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