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14 18:18
수정 : 2017.09.14 20:18
조은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예술감독
지난 6월2일, 이 지면에서 소개한 흥미로운 음악적 사건이 있었다. 필자는 당시 ‘한국적 피아니즘의 치열한 최전선인 동시에 작곡가와 연주자의 실제적 소통을 체험한 뜻깊은 현장’이라 기록했었다. 그 결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다. 스튜디오2021의 창작 플랫폼에서 기획한 ‘새로운 에튀드’가 음반 제작과 악보 출판, 세계 초연을 동시에 이뤄낸 것이다. 우리 작곡가와 우리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 고유의 자체 제작 브랜드여서 무엇보다 감회가 깊다. ‘우리’란 수식어를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언제까지 외국 작품에 의지해 연주하는 데에만 그칠 것인가’란 회의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늘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다는 핑계로 비판에 쉽게 위축되었고, 새로운 장르를 시도함에 있어 소극적이었던 음악계 실상을 일신하는 뜻깊은 계기이기도 했다.
12곡의 ‘새로운 에튀드’는 현대음악 시리즈 스튜디오2021의 자체 제작 프로젝트 ‘에튀드의 모든 것’의 일환으로 작곡된 작품들이다. 에튀드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음악적 오늘을 담은 새로운 연습곡을 개척하자는 의기투합 아래 작곡가와 피아니스트의 협력으로 출발했다. 2016년 9월, 각각 12명의 작곡가와 피아니스트가 선정되었고, 이후 2017년 1월 프리 워크숍, 5월 예술중·고등학교 순회연주 및 토크 콘서트를 통해 작품이 완성되었다. 치열한 녹음 작업을 거쳐 지난 9월13일에는 세계 초연 무대가 일신홀에서 펼쳐졌다. 12곡의 에튀드 중에는 스튜디오2021의 위촉으로 작곡된 독립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작곡가 최우정과 김현민의 곡처럼 작곡 중이었거나 이미 출판된 에튀드, 혹은 새로운 작품번호로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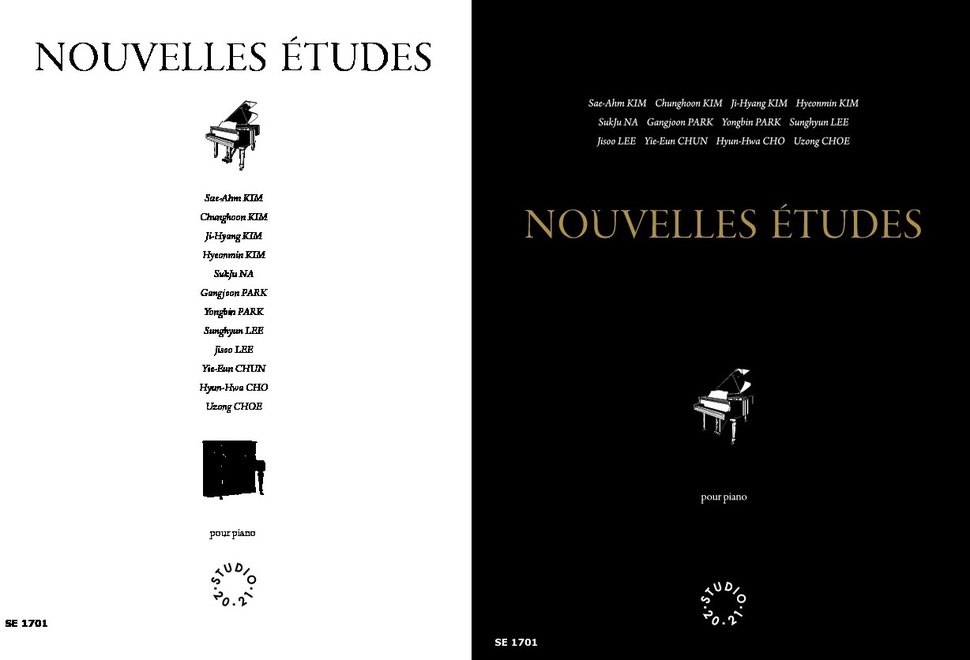 |
|
'스튜디오2021' 제공
|
에튀드는 악기를 다루는 기술적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습곡을 일컫는다. 영문으론 ‘Study’(스터디)라 불릴 만치, 본래 무대에 오르기 전 스스로를 오롯이 대면하며 기계적 훈련에 경주하는 장르이다. 연주자는 에튀드를 통해 팔·손목·손가락 근육의 유기적 연결을 다스리고, 휘몰아치는 빠른 속도에 도달하며, 완벽한 테크닉을 꿈꾼다. 그러므로 여타 장르보다 훨씬 피지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연주자의 육체와 악기의 몸체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격전장이라 할 수 있다. 아농(Hanon)과 같은 기계적 음형의 연습곡은 점차 연주회용 연습곡으로 진화했다. 덕분에 연습곡의 공간적 영역도 개인적 수련에 몰두하던 연습실에서 타인 앞에서 연주하는 공적인 무대까지 확장되었다.
스튜디오2021의 이번 프로젝트는 ‘현대적 에튀드의 새로운 발견’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반적인 이해 범주의 비르투오시티(뛰어난 연주기교)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존 연습곡의 양상과는 전혀 새로운,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법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피아니스틱한 사고를 벗어난 피아노 에튀드는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악기의 울림을 통한 음향의 생성과 소멸, 찰나에 뒤바뀌는 소리, 쉼표의 침묵까지 연습곡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니 말이다.
12명의 모든 작곡가는 손가락의 근육질 기교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를테면 김정훈과 김지향은 에튀드를 통해 연주자의 정신과 내적 세계까지 연마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고, 경기도 길군악칠채 장단에서 리듬의 영감을 얻었다는 박강준의 곡은 매끄러운 음악기법 너머의 원초적 에너지를 뿜어냈다. 모호함 속에서 명확함을 추구하는 역설적 의지는 이지수의 곡에서 생생하게 전달되었는데, 음색의 밸런스에 대한 즉각적 감응을 명상적으로 풀어낸 전반부를 지나 악보로 정밀히 표기되었으되 모호한 영역을 넘나드는 후반부가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우리 작곡가와 우리 연주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우리 고유의 자체 제작 브랜드가 생소한 난해함을 넘어 미래의 연주곡으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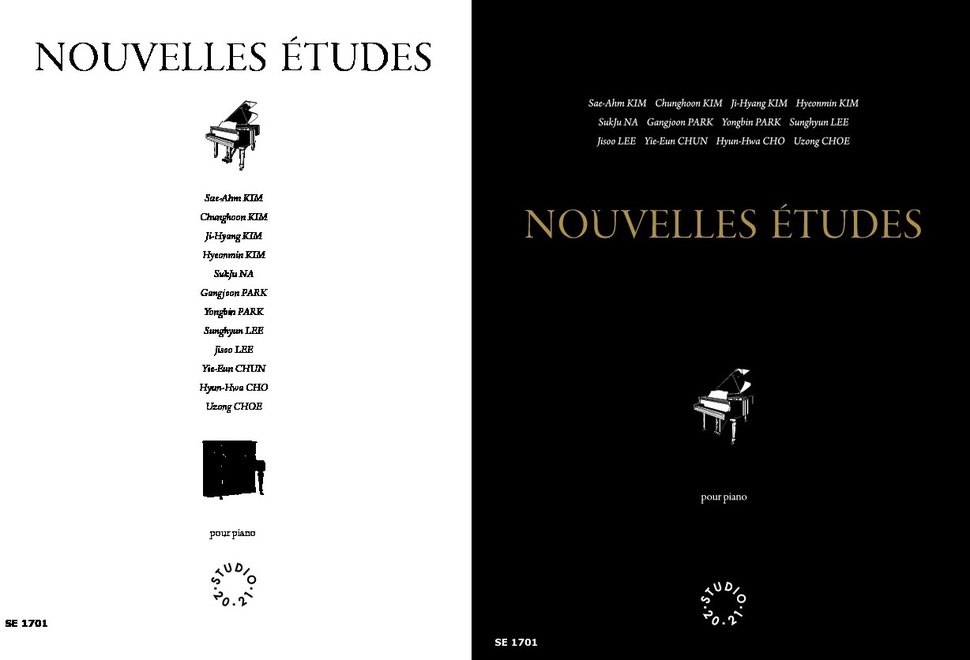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