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08 19:31
수정 : 2016.12.19 18:50
별똥별 예보가 내린 얼마 전, 밤하늘을 관찰하기 좋을 듯한 여느 곳들이 그렇듯 지리산 정령치(해발 1172m)에도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달려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천체망원경까지 챙겨 들고 우리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지인은 주차할 데를 도무지 찾을 수 없어 집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두어 시간 후면 자정이 될 늦은 밤, 여름이지만 온몸으로 느껴지는 고지대의 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자정이 넘도록 목을 빼고 밤하늘에 시선을 묶어 두었다.
인류가 밤하늘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에서 그 장구한 역사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진지하고도 도발적으로, 동시에 위트 넘치게 풀어준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되게 등장하는 밤하늘의 주인공은 단연 은하수다.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쿵족’(!은 혀끝으로 입천장을 차면서 내는 소리와 비슷하다)은 은하수를 인간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대한 짐승의 등뼈라고 생각해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은하수는 영생을 주는 힘을 가진 헤라 신의 젖가슴에서 나와 흩뿌려진 젖이다. 오래전 한반도에 살던 이들은 은하수가 벌을 받아 헤어진 한 쌍의 연인이 일년에 딱 한 번 건너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다리라고 상상했다.
물론, 별들과 관련한 인류의 생각들 중에서 그전까지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놓았던 ‘위험한’ 인류사적 사건도 있었다. 바로 ‘지동설’이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천동설)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다. 기원전 3~4세기, 아리스타르코스가 처음 주장했던 이 우주관은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입증하기까지 180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지구 중심적 우주관과 태양 중심적 우주관의 대결이 절정에 다다랐던 16세기 말과 17세기 초, 그 시대의 절대 규범이었던 기독교적 가치체계에 도전한 우주관, 즉 지동설을 주장한 이들에게는 굴욕, 세금, 추방, 고문, 죽음 등과 같은 처벌이 가해졌다.
가부장제는 천동설과 같다. 하나는 사회적인 것이고 하나는 천문적인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면 다를까.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적 세계관과 이에 근간을 둔 사회문화적 체제가 문제적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그러나 지구가 은하의 중심핵으로부터 약 3만 광년이나 떨어진 우주의 후미진 변방에 위치해 있는 별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작은 행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해가 뜬다”, “해가 진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며 초점이며 지렛대이기를 바라는’ 이들처럼, 차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제의 폐해를 눈감아 외면하면서 여태껏 멋모르고 부렸던 특권의식을 내려놓지 못한 채 불안에 떨며, 그 불안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나 떨쳐내려는 못난이들이 있다. 벨 훅스의 지적처럼 가부장제 이후의 세상이 어떨지를 상상할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이 문제 많은 체제에 기생하는 길이 오히려 낫겠다는 어설픈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리스타르코스 이후 수천년 동안 이어진 숱한 핍박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천동설은 지동설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틀렸기 때문이다. 차별주의 또한 평등주의에, 그것도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주의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차별주의는 특정 계층에만 특권을 안기는 문제 많은 관점이기 때문이다. 한때 엄연한 질서라고 여겨진 신분제와 노예제는 이미 그 길을 걸었다.
우주에 태양과 같은 별이 지구 위 모든 모래알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너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함께 이 생을 여행하는 동료 우주인들일 뿐인 것이다. 이 얼마나 애틋한가. 우리는 서로 애틋한 존재들일 뿐이다.
박이은실 <여/성이론> 편집주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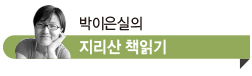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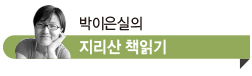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