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02 19:27
수정 : 2017.03.02 20:42
박이은실의 지리산 책읽기
나는 뚜벅이 예찬론자였다. 지리산 자락으로 이주해 올 때도 차를 마련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나 이동 거리가 길어 도시보다 대중교통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만 도시와는 비교 못할 만큼 불편한 대중교통망에 질려 나는 이주 6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이러려고 도시를 떠나왔나 싶은 자괴감도 들었다. 푸른 하늘, 맑고 깨끗한 공기, 집 밖만 나가면 나오는 산과 들, 나무와 꽃, 이른 아침의 휘파람새 소리…. 이런 곳에 한 명의 차 구매자와 매연을 보태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나 싶어졌다. 그러나 서울 가는 버스를 놓쳐서 강의에 늦게 생긴 날, 어지간하면 오르지 않는 고속도로로 차를 몰아 올렸을 때 그런 자괴감은 잠시 내려뒀다.
운전자라면 다들 알겠지만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재빨리 속도를 올리는 것이다. 민첩하게 이 일을 수행해야만 나도 안전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도 지켜줄 수가 있다. 일단 고속도로에 오르게 되면 당분간 빠져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다른 차들이 달리는 속도를 맞춰서 달려야 한다. 최저시속 50㎞, 최고시속 100㎞라 적힌 표지판은 무용지물이다. 즉, 고속도로는 나의 의지가 관철되는 곳이 아니다. 속도도, 방향도, 내릴 곳도, 탈 곳도 모두 정해진 대로, 그 안의 룰대로 따라야만 한다. 고속도로를 운전해 달리며 방향, 속도, 규칙 등 여러 면에서 고속도로는 근대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시스템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곳곳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틀과 사회질서를 구축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은다. 그러나 경제성장, 국민총생산 늘리기, 일자리 만들기, 소득창출, 노동 등의 분야에서 제시된 안들을 가만히 보면 기존의 언어와 사유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 있지 않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저만치 톨게이트가 보이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여전히 달리던 길만을 고집하는 차들을 보는 듯하다. 고속도로 밖의 다른 길은 상상되지 않는다.
생태주의 사상가인 앙드레 고르는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에서 노동중심주의적 세계관이 가진 자본주의와의 공모를 통렬히 비판했다. 일찍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분석한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 모든 생산력을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할 능력을 가진 노동계급, 즉, 프롤레타리아가 등장할 것이며 이로써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들어설 것이라고 보았다. 고르는 마르크스의 이러한 전망이 현실을 간과한 철학적 이론에 근거해 있다고 비판한다. 고르의 분석에서 현실 속 자본주의의 생산력은 자본의 필요와 논리에 따라서만 발전한다. 따라서 이 발전은 노동자집단, 즉, 프롤레타리아가 생산력을 집단적으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 안에서 이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계급조차도 자본의 논리 안에서 기능하며 따라서 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체제 안의 노동자는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노동자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 체제 안에서 기능하는 프롤레타리아는 기존 체제가 아닌 다른 현실을 상상하기 어렵다.
다른 현실을 상상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절일지 모른다.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절 말이다. 어쩌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고속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이미 정치적 난국이라는 톨비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속도로를 타야 한다고 말하지 말자. 이참에 다른 길을 상상할 자유, 다른 길을 만들 자유를 논하자.
박이은실 <여/성이론> 편집주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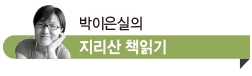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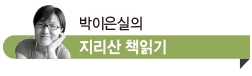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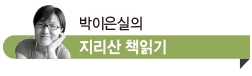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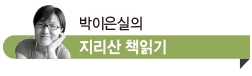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