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05 19:39
수정 : 2018.07.05 20:05
[책과 생각] 편집자가 고른 스테디셀러
비트겐슈타인 평전
레이 몽크 지음, 남기창 옮김/필로소픽(2012)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생애와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그는 188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가장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저녁엔 브람스나 말러가 방문하고, 식구가 클림트의 그림에 등장하는 그런 집이었다. 실업 학교를 졸업하고 공학을 공부하러 영국 맨체스터에 갔다가 수리 논리학 책을 읽었다. 케임브리지의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갔다. 러셀은 천재를 알아보았고, 제자와 선생의 위치가 바뀌는 과정을 경험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지원병으로 입대했다. 최전방을 자원했고 무공으로 훈장도 받았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았다. 전선에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끼고 다녔다. <카라마조프 씨네 형제들>의 조시마 장로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외울 정도였다. 유산을 예술가들에게 나눠주는 데 썼다. 비상한 관대함에 놀란 누군가가 그를 방문했다가 “미시킨(도스토옙스키 소설 <백치>의 주인공)을 본 것 같았다”라고 썼다. <논리철학논고>가 완성되었다. 철학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거기서 더 할 일은 없었다.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 경험은 좋지 않게 끝난다.
1970년대 전파과학사에서 출간한 나카이 히사오의 짧은 에세이(1972)는 비트겐슈타인의 생애를 문학적으로 접하게 해주는, 한동안 거의 유일한 글이었다. 읽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이두와 김영사에서 출간한 존 히튼의 만화책(1992)은 그의 생애와 사상을 요령 있게 알려주는 좋은 책이다. 아쉽게도 이 역시 절판되었다. 레이 몽크의 두툼한 <비트겐슈타인 평전>(1990)은 관련 지인의 증언이 수집 가능한 마지막 시점에 나온 책으로, 결정적인 전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실은 히튼의 만화책보다 읽기가 수월하다. 만화에 불가피한 압축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분리되어 설명되는 생애와 사상이 이 평전에서는 맞물려 등장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이 발발했다. 이런 때 대학에서 지내는 것보다 그에게 우스꽝스러운 일은 없었다. 무어의 주선으로 병원의 약품 운반부가 되었다. 툭하면 포탄이 떨어지는 곳이었다. 병원은 새 일꾼의 정체를 알았지만 모른 척해 주었다. 제자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 왔다. 원하는 보직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내용이었다. “네 편지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그는 꾸짖었다. “너는 최전선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거기서 너는 최소한 인생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 나는 오랜 투쟁 끝에 용기를 끌어내어 무언가를 실행한 후에는 언제나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느꼈다. 너는 기는 것을 그만두고 걷기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책임질 일을 찾아서 그것을 수행하려고 노력해라. 내가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할 말은 그것이 전부다.” 고맙게도 몽크는 어려움에 처한 보통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편지를 길게 인용해 준다. 곤경이 시작되면 철학은 멈춘다는 세간의 격언이 있지만 비트겐슈타인과는 무관한 얘기였다.
“그의 삶과 철학을 ‘한 이야기’ 안에서 서술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게 보통 가능한 일인지는 알 수 없다. 왠지 비트겐슈타인 전기에서라면 가능할 것 같지 않은가. 그는 모든 고투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치 내면이 따로 없을 것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게 우리가 받는 매혹의 원천이다. 유언으로 자신이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 달라고 했는데, ‘멋진’(wonderful)의 통상적인 의미를 수정해서라도 우리는 그 말을 믿게 된다.
김영준 열린책들 문학 주간
※ 이번주부터 김영준 열린책들 문학 주간이 집필합니다. 4주 간격으로 세 권의 책을 소개하며, 그중 한 권은 자사 책을 씁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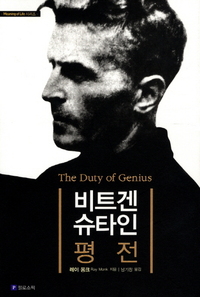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