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_김지야
|
Weconomy | 김재수의 갑을경제학
 |
|
그래픽_김지야
|
정부 고위공직자의 셋 중 한 명은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전체 299명 중 64명이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모든 경제학 교과서는 첫장에서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초구에서만 12채, 총 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서 눈쌀을 찌푸립니다. 반면 재산 형성과 주택 구매 과정에서 법적 문제만 없다면, 이용주 의원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잘 아는 이들일수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을 예금 또는 주식 형태로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호 문제입니다. 예금과 주식이라면 비난하지 않을 것을, 주택이라고 해서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하나는 선호(preferences)를 비난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에 얼마의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고,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왜 이용주 의원의 강남 아파트 소유를 비난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과 타자에 대한 선호
이에 대해서 조금 결이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선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경제학이 이용주 의원의 이기심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현대경제학의 가장 큰 업적 하나는 ‘타자에 대한 선호’(other-regarding preferences)를 굳건하게 발견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심이라는 자신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이타심, 상호성, 공평성과 같은 타자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학이 이기심을 비난하거나 계몽시키려 들지 않는 것처럼, 불공평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계몽시키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는 이기심을 존중하고, 다른 방식의 선호를 계몽이 필요한 비합리성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한 문장을 빼놓치 않고 배웁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동력인 이기심을 찬양하고, 이기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처럼 취급합니다. 경제학이 갑의 편에 서기 쉬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정책 결정자의 아파트 보유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쳐주지만, 대중의 분노에 대해서는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 연구의 진보로 인해 더 이상 그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30년에 걸친 실험 연구는 경제적 인간이 지닌 선호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습니다. 최후통첩게임, 독재자 게임과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삼자 개입, 처벌이 따르는 신뢰 게임과 공공재 게임 등은 경제적 인간이 이기심과 더불어 공평성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의 연구는 이기심과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어떤 식의 내생성을 통해 진화하는지, 정책과 제도는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
관련연구①)
자본주의와 공평성
흔히 자본주의는 사람들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공평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연구자들은 자본주의에 노출이 비교적 적은, 그러나 서로 다른 정도의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부족들에 대해서 최후통첩게임 실험을 하였습니다.
최후통첩게임은 제안자와 응답자로 나뉘어, 두 사람이 펼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제안자는 주어진 돈의 얼마를 응답자에게 제안합니다. 응답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제안자와 응답자 모두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기심만 가진 응답자라면 아무리 작은 돈을 제시받아도 수락하고, 이를 예상하는 제안자는 최소한의 돈만 줄 것입니다. 반면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있다면, 불공평하게 제시된 돈을 포기하고 제안자를 처벌하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안자는 응답자에게 공평한 제안을 할 인센티브를 갖습니다.
자본주의에 더 노출되어 있는 부족일수록 공평성에 대한 선호는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노출이 가장 적었던 탄자니아와 아마존 부족은 주어진 돈의 1/4에서 1/3 정도를 상대방에게 제안했습니다. 반면 시장경제에 노출이 가장 많았던 인도네시아 부족은 평균 절반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혈연 및 가부장 중심의 사회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의 공평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
관련연구②) 이런 맥락에서, 천민자본주의라고도 불리는 한국의 시장경제에서 공평성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공평성에 대한 선호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불공평에 대한 분노와 처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최후통첩게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갑과 을이 서로를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두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면, 갑은 을에게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고, 을은 울며 겨자먹듯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관계라면, 신뢰에 바탕을 둔 투자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을이 불공평함을 거절하고 갑을 처벌할 수 있기에, 갑과 을은 공평한 투자와 거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공평성 선호와 경제학자
우리 사회의 공평성에 대한 선호는 최근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의 발언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도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있는데, 30억 원 부동산 가진 사람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한 장의 카드뉴스로 만들어졌는데,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크게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경알못’ (경제학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선동 문구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합니다. 카드뉴스를 공유하는 대중을 ‘개돼지’로 비유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말을 두고 대중과 전문가 그룹이 보이는 간극은 하늘과 땅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선호를 이해하는 경제학 연구의 진보만큼 경제학자들의 태도도 진보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의 차이라면 경제학자는 설명해야할 책임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호응이 공평성에 대한 ‘선호’라면, 경제학자는 과연 대중을 비웃을 수 있는 걸까요?
미국 인디애나 퍼듀대 교수
관련연구
① Samuel Bowles, “The moral economy: Why good incentives are no substitute for good citizens”, Yale University Press (2016)
② Henrich, J., Boyd, R., Bowles, S., Camerer, C., Fehr, E., Gintis, H., McElreath, R., et al., "Economic ma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Behavioral experiments in 15 small-scale societi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005), 28 (6), 795-855.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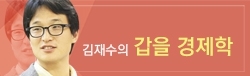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