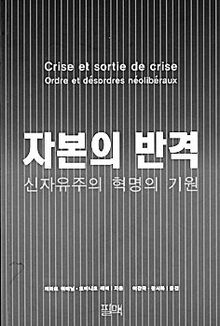 |
|
자본의 반격
제라르 뒤메닐·도미니크 레비 지음. 이강국·장시복 옮김. 필맥 펴냄. 1만5000원 |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위기 맞자
금융권력, 금리 급격한 인상 케인스주의 반격
노동시장 유연화·민영화 통해 이윤 극대화
새이윤 창출 않고 다른 계급 몫을 착취
제라르 뒤메닐 프랑스 파리10대학 경제학 교수와 도미니크 레비 파리 주르당 고등사범학교 경제학 교수가 함께 쓴 <자본의 반격>(필맥 펴냄)은 “자본가 계급의 권력과 소득을 회복시킨 계급투쟁의 결과”인 신자유주의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게 됐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본 책이다.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이란 부제가 붙었다.
신자유주의 혁명이 무엇인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계급질서의 최상층부에 앉은 금융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의 제도와 정책들을 자기계급의 이익에 맞게 뒤바꾼 것이라고 저자들은 정리한다. 그들은 이를 ‘1979넌 쿠데타’라고 불렀는데, 그때 미국 금융지배자들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통해 케인스주의 정책 시행 이래 억압당해온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케인스주의 정책은 금융 헤게모니를 제한하면서 거시적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조절한다. 노동자와의 계급타협을 통해 일자리 보장, 노동조건 보호, 구매력 증가와 사회보장 강화도 추진한다. “따라서 장기실업이나 위장된 형태의 장기실업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성장의 열매는 분배돼야 하며 따라서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사고가 자리잡았다. 국가는 교육, 연구, 산업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특정 경제부문을 직접 떠맡기까지 했다. 또한 건강, 가족, 퇴직, 실업과 관련된 사회보호 시스템이 확대됐다.”
이런 케인스주의적 국가개입이 이뤄진 게 20세기 초 이후 1950년대까지, 대공황이 닥치고 뉴딜정책이 도입됐던 시기다. 저자들은 자본주의 발전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는 두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1979년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번째 신자유주의 시기가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케인스주의적으로 타협한) 사회질서를 파괴했고, 가장 냉혹한 자본주의의 규칙을 복원”시킨 시기다. 첫번째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바탕으로 경영혁명과 관리혁명, 그리고 현대적 금융이 출현한 때로 잡는다.
노동조건 보호한 케인스주의
 |
|
천문학적인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속에서도 막강한 군사력과 기축통화인 달러발행을 배경으로 세계의 돈을 끌어들여 흥청거려온 미국 금융권력의 신자유주의 패권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미 금융자본의 메카 뉴욕증권거래소의 매장 모습. 뉴욕/AP 연합
|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은 저자들이 ‘어느 케인스주의자의 주장’이라며 인용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실감있게 다가온다. “1990년대 초반,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자유화했다. 이것은 저축률이 이미 30%가 넘었던 그들에게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미 재무부의 압력을 포함해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미국과 IMF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우리든 또는 그들 자신이든 그와 같은 정책들이 동아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엇던가, 아니면 그 정책들이 미국과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금융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던가?” 국제적 빈익빈 부익부 심화 계층·계급간 극단화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자본의 무제한 이동과 함께 국제적으로 국가간에도 그대로 관철됐다. 저자들에 따르면 금융자본은 비금융부문 투자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주식시장은 자본가들의 투기장일 뿐이다. 빈국들의 외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빈자와 부자들간 빈국과 부국들간 부의 불평등은 60년 1대 30, 90년 1대 60, 97년 1대 74로 폭증했다.(97년 유엔 <인간개발 보고서>) 이 모두 특권적 소수 금융권력의 이기적 범죄행위라고 저자들은 못박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내용도 이 이윤율에 관한 것이다. 이윤율은 자본주의 생산의 동력이지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이윤율은 하락한다. 이윤율이 낮거나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경제 전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자본가들은 ‘신자유주의 혁명’을 통해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면서 이윤을 최대화했다. 뒤메닐과 레비는 이 이윤율 저하경향을 적용해 1970년대에 나타난 이윤율 하락경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70년대 이후의 구조적 위기는 60년대 이후 주로 기술진보의 둔화로 인해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며 임금상승의 둔화도 그 때문임을 자세히 밝혔다. 이는 구조적 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마르크스의 분석이 19세기뿐만 아니라 21세기 자본주의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역자인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장시복 서울대 강사는 그런 점에서 이 책을 1백여년 넘게 벌어진 마르크스주의 (자본주의) 위기이론 논쟁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저자들은 “사실은 1930년대식의 공황이 벌써 시작됐다”고 썼다. 5부 2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그런 토대 위에서 ‘경제위기와 사회질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구조적 위기’ ‘기술진보는 가속화되고 있는가 정체되고 있는가’ ‘위기는 끝났는가’ ‘금융화, 신화인가 현실인가’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는 사람들’ 등 각 장을 독립된 하나의 강의처럼 진행하면서 전체를 묶어간다. 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