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29 21:19
수정 : 2006.06.30 16:55
나도 비정규직 학술노동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는 한계
‘모든 노동하는 이의 권리 보장’ 새로운 노동권 개념 필요하다
인터뷰/<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쓴 장귀연씨
책의 첫 인상은 사실 좀 답답하다.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책세상·4900원)이라니, 제목 한번 단순하다. 하다 못해 <비정규직,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처럼 아주 조금의 기교라도 부릴 수 있진 않았을까? 가뜩이나 ‘칙칙한’ 주제가 갑갑한 제목과 겹쳐 첫 눈에 책읽기의 유혹도는 어는점 아래다.
그래도 한편으로 기특하긴 하다. 요즘 세상에 비정규직을 붙들다니, 그래서 171쪽 짜리 책으로 펴내다니. 그게 돈이 되고, 화제거리나 될까? 부박한 세태를 거슬러 올라가는 오기 같은 게 느껴지는 듯도 하다. 자, 그래서 일단 책을 펼쳐보면? 곧 첫 인상과는 다른 범상찮은 경지를 만나게 될 터이다.
펼쳐지는 논의는 간혹 보게되는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류의 정책보고서와는 틀거리가 다르다. 비정규직 양산의 뿌리가 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있음이 조목조목 설명된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확산이 노동자 권리의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한 해체와 동일한 것임을 조곤조곤 짚는다. 하긴 이론만으로 펼쳐간다면 어려울 것도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보’와 ‘노동’의 공적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이 책이 기꺼운 건 자료와 근거가 우리 비정규직의 구체적 현실과 생생한 입말 증언에서 대거 채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대안은 게바라가 말한 불가능한 ‘꿈’에 닿아 있다. 파토스는 격렬하되, 에토스는 차분하다.
이런 특성은 사회학 박사과정 수료자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운동단체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은이 장귀연(35)씨의 이력에서 비롯된 게 아무래도 크겠다. 노동 연구의 대가 끊길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요즘, 그는 노동 전공에 비정규직 노동운동까지 한데 하고 있다. 그도 처음 대학원에 들어가면서는 여성이나 문화 등 새로운 담론 영역에 끌렸다. “그런데 주위에선 당연히 제가 노동을 전공하는 줄로 알더라고요.” 1990년 대학 입학 이래 노학연대의 세례 속에 뜨거운 학창시절을 보낸 그의 경험을 다들 잊지 않고 있었던 때문이다.
노동을 전공하면서는 비정규직이 가장 큰 화두일 수 밖에 없었다. 잠시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 두고 대학원에 들어간 97년이 분기점이었다. 한국 노동계는 정규직의 축소와 비정규직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격변에 내몰린다. “사회 전체의 부는 증가하는데도 다수 노동자의 삶은 왜 갈수록 고단하고 피폐해지는지 따져봐야겠다 싶어지더군요.”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등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저작을 쌓았다. 이번 책은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미를 지닌다. 노동권 개념의 수정 또는 확장이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만들어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할 때 져야 하는 책임과 비용을 없애려 합니다. 따라서 노조 결성 같은 정규직 위주의 기존 노동권 개념만으론 거기서 원천적으로 배제된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나아가 자영노동자이든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노동권 개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분명한 상은 스스로도 아직은 모호하다. 사회복지의 확대일 수도, 자본의 전횡에 대한 규제일 수도 있다. 어쩌면 자본주의 철폐라는 급진적 대안의 귀환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집단적 상상력의 복원”이라고 했다. “한때는 다섯살 꼬마의 탄광 노동이 상식이었죠. 상식에 대한 의문과 저항이 지금 상식처럼 된 노동권을 형성해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틀 안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제한된 방안에만 매달리지 말고 더 너른 대안을 찾아나서자는 것이다. 불가능한 꿈을 꾸고 실현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스스로의 주체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사회학자이자 제 자신 비정규직 학술노동자인만큼 그 꿈의 근거와 미래를 포착해 대중적으로 알려나가는 게 제 할 일이 되겠지요.”
글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사진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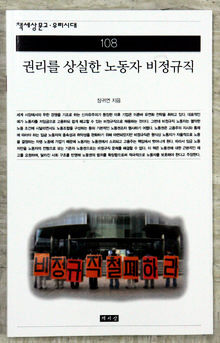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